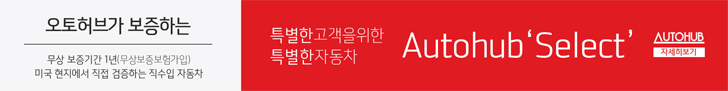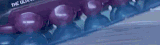글 수 147

다시 상하이다. 근래 들어 중국 출장이 잦아지고 있다. 필자뿐 아닐 것이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중국에는 지금 돈이 있다. 천만장자(17억에서 170억의 재산 소유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그다지 놀랍게 들리지 않는다. 더 주목을 끄는 것은 그들 천만장자의 평균 나이가 39세라는 점이다. 중국은 지금 요동치고 있다. 과연 한국인들은 중국을 얼마나 알고 접근하고 있을까.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중국을 지탱하는 것은 세 가지 제도다. 첫 번째는 공산당 1당 지배제도다. 공산당이라고는 하지만 독재는 아니다.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 권력자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끊임 없이 교체된다. 중국의 1당 지배제도에 대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 차이나]에서 수직적 민주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3억 인구의 미국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1년이 걸리는데 13억이 넘는 중국이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 공유제다. 오늘날 중국은 ‘팡누(집의 노예)’. ‘팡둥(다주택 부자)’ 등 부동산으로 때 돈을 벌고 있다. 묻지마 투자로 집 한 채에 100억이 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그들이 매매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인 셈이다. 이 부동산 버블이 앞으로 중국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금융학 박사 랑센핑 교수는 그의 저서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에서 경고하고 있다.
세 번째는 후커우(戶口)제도다. 중국은 ‘민증’이 두 가지가 있다. ‘농촌 후커우’와 ‘비농촌 후커우’가 그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 있다. 부모가 농촌 출생이면 자식도 농촌후커우가 될 수밖에 없다. 농촌 후커우는 비농촌 후커우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농촌 후커우는 7만 위안, 비농촌 후커우는 47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 후커우가 비농촌 후커우로, 또는 그 반대로 전출입할 수가 없다.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들어 온 사람들에게는 거주증이 주어진다. 이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많은 뉴스는 쏟아 내면서 정작 중국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피상적인 외형으로 판단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의 저자 전병서 교수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몇 년 전 중국 주식 붐이 일었을 때 한국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이 막무가내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천만장자 이야기는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홍색귀족들의 창궐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들의 후손들이 그 배경을 이용해 사업을 벌여 일확천금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지금 세계 명품시장을 싹쓸이 할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전 세계 명품의 40% 가량을 소비했었으나 최근 통계는 아마 중국에 역전되었을 지도 모른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중국의 특징은 1가구 1자녀 제도다.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채택한 산아제한 제도다. 한족은 1자녀 소수민족은 2자녀까지 둘 수 있다. 한족도 농촌 후커우의 경우 첫 째 딸일 경우 둘 째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1가구제도로 태어난 세대는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위기 속에 자라나 버릇이 없다. 그들을 중국에서는 ‘샤오황띠(小皇帝)’라고 한다.
경제 발전과 함께 영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축구, 골프),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의료산업 등이 급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황색 낭자라고 부르는 윤락녀의 수가 약 4,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풍속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45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인구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마약과 도박이 창궐하고 있고 사회 모든 분야에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의식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국에서 투명한 것은 화장실밖에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5천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 특파원 생활 15년을 지낸 영국의 제임스 킹은 그의 저서 [중국이 뒤흔드는 세계]에서 중국에는 등록되지 않은 인구가 2억에서 3억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있다. 그것이 사회문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중국 정부 뒷 발목을 잡고 있다.
어쨌거나 많은 인구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낳게 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가 168개에 이른다. 도시는 소비의 블랙홀이다. 충칭시는 4,800만명에 달한다. 이 도시화의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하게 하기도 하지만 환경과 교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15억의 시장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은 존재하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 중국은 대국이기는 하지만 강국은 아니다.’라는 중국과 해외 전문가들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