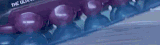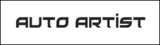Street Battle





V12가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트윈터보가 실리면 한정된 상황에서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똑같은 모양에 2.8리터(S280)부터 6.0트윈터보(S65AMG)까지 실리지만 98%의 대중에게 S클래스의 존재는 이처럼 구분되어 있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시간을 Super Saloon으로서 쇼퍼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S클래스에게 필요이상의 힘과 배기량은 점점 동경이나 칭찬보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크고 강한 엔진들은 점점 그 본연의 본능을 숨겨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V12에 트윈터보가 실리는 순간 기함급에서 동급에서 가장, 아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토크는 폭스바겐 아우디의 W12나 BMW의 NA 12기통 엔진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결코 폭력적이어서는 안되는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는 여러모로 초강력의 토크도 절제의 테두리내에서 제한적으로 밖에 분출할 수 없다.
이게 이 운명의 V12 Bi Turbo의 끝인가?
ECU튜닝로 600마력으로 끌어올리고 토크는 3자리 숫자가 되었으며, 계기판의 끝 숫자인 260은 조깅하는 맘으로 제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이 비운의 V12를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 것인가?
특수부대 출신으로 살인면허급 무술실력에 왠만한 성인을 한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근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힘의 상징을 양복을 입힌체 노인들 마트갈 때 따라가 쇼핑카트를 미는 용도로만 활용한다면 비유가 적당할까?
한번 현실과 허구를 넘나들어보자.
이 인간 혹은 기계 이상의 사이보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나섰다.
0시를 경계로 좋은 코스를 찾아 아스팔트와 컨티넨탈 타이어와의 뜨거운 미팅을 주선했다.
반면 힘이 있는데 빈번한 변속이 필요치 않고 한단으로 커버하는 속도의 영역이 넓다는 것은 항상 바쁜 다단변속기를 천박하게 보이게도 한다.
회전력의 의미는 없다. 1500rpm부터 100kg에 가까운 힘이 쏟아져 타이어의 트레드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전에 트레드가 뜯겨져 나갈 판이다.
이 잔인무도한 과정이 너무나 소리소문없이 너무나 고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사이보그의 장기이다.
적을 제거하는 과정에 눈빛, 손의 떨림이나 과도한 동작없이 한방에 제압하는 전사의 움직임은 그져 쉬워보이고 적들이 한없이 작아보이게 하는 원리와 같다.
토크가 100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너무 고요해 잠든 노신사를 깨우지 않을 자신이 있을 정도다.
다만 이러한 고요함은 안에 있을 때의 감각이고, 밖으로 비춰지는 움직임은 순간이동에 가까워 거대한 검정 물체가 전방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UFO가 되기에 충분하다.
400마력쯤 가진 모빌들이 두어차례 도전해 보지만 뒷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사라질 때의 멀어지는 속도를 직접 눈으로 보면 그 다음 전투력은 아예 사라져버린다.
원샷 원킬... 두번 때릴 필요없이 한방에 한명씩 제압하는... 이러한 상황의 시작과 종료가 그저 몇초내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라.
사이보그가 웃옷을 근육의 힘으로 찢어버릴 정도로 충분히 흥분되었을 때 맞이하는 장애물과 같은 긴 코너에서 마치 스피드 스케이터들의 허벅지를 과시할 정도의 롤 강성으로 고속코너를 KTX레일처럼 돌아나간다.
2.2톤의 무게와 고속코너에서 실제 마크하는 2XX의 속도는 아스팔트가 옆으로 밀릴 정도이며, 타이어에게는 또다른 고통의 시간이다.
완전한 상태의 ABC에서 생성되는 190바 이상의 힘은 이 거구를 스카이콩콩에 태울 정도로 강력한 하체근력으로 작용한다.
직선에 들어서 초인적인 힘으로 최대추진력을 발휘할 때는 마치 앞에 있는 물체들이 내게 날아드는 느낌이다.
역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장애물들을 피해나가지만 좌우로 꺽는 움직임없이 직선으로 돌진할 때와 미세한 꺽임으로 턴할 때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다.
계기판에 나와있지도 않은 숫자를 추구하며, 굳이 어디까지 올라갔나를 궁금해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
빨라도 너무 빠르고 계기판에 적힌 숫자들과 작별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온다는 점은 이 사이보그
V12TT가 인간이외의 생명체에게도 말못할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을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주인 몰래 야밤을 틈타 본인의 본능을 확인해고 존재감을 일깨워준 것의 의미는 본인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자극적인지일 것이다.
도로에 존재하는 질서가 이 한 물체에 의해 이렇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과 무게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손길의 3박자가 보여준 존재감은 그저 차한대와 한명의 인간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것을 분출하고 다시 주인의 곁으로 다가가는 이 사이보그의 운명도 가끔 나와 같은 손길이 있기에 그리 비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더이상 같은 형식으로는 후손이 없다고 하니 더욱 더 오래도록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지의 세계를 알려야하는 의무가 생기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외지에서 평생에 가장 강렬한 주행을 한 이날의 기억을 V블럭 사이에 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길...
SKN Tuning W220 S600과 어느 가을밤 강렬했던 주행을 추억하며...
-testkwon-

특유의 바글바글거리는 배기음은 v8인 500의 외삽 쯤으로 600을 짐작하던 저에겐 ''확실히 다른''차라는걸 느낄수 있었고.
컴포트 타이어가 들어가있던 차였는데. 대략 3단 1200rpm에서 발끝에 힘을 살짝만 줘도 차는 제자리에서있고 바퀴만 열심히 구르더라구요. 확실히 500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차는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