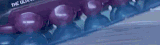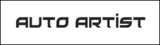Boards

이런 사람이 세상 어딘가엔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으로 한번 끄적여봅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중 어느 날, 07:30. 자택 냉장고 앞>
"바르릉~보로로로로로로"
출근 전 냉장고에서 전날 우려둔 냉차를 꺼내던 중 익숙한 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슬쩍 내다보니 역시나 항상 보던 검정 제네시스의 원격 시동 소리다. 얼굴도 모르는 이웃이건만 단정하게 꾸며진 그의 애마를 본 지도 수십 번, 이젠 반갑기까지 하다.
"6기통 소리 좋네... 흠, 내 차도 저정도 소리가 나려나? 역시 지하에 주차하길 잘 했어."
괜한 부러움에 애꿎은 냉차만 한 모금 마시며 마저 짐을 챙긴다. 협탁 위에 올려둔 시계를 왼 손목에 걸고 디버클을 찰칵, 간밤에 충전해둔 이어셋을 오른 귀에 걸고 스위치를 또각. 그리고 서랍을 열어 가지런히 정리해둔 차 키들을 짤그락.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스투트가르드의 조랑말을 집었을 테지만 오늘따라 괜히 삼각별을 만지작거려본다.
"아냐, 일요일 얼마 안 남았잖아, 차분하게 가자..."
왼 손에 서류가방, 오른 손에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다 헛웃음을 지으며 가방과 키를 바꿔든다. 내구레이스 시절 몇 초 남짓의 시간을 벌기 위해 왼쪽에 위치시켰다는 열쇠구멍은 SUV에 와서는 그저 헤리티지를 강조하려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닌가! 아니, 어쩌면 인생은 모두 레이스라는 포르쉐의 가르침일지도 모른다. 이 쯤 되면 차가 나에게 빨리 일하라고 채찍질하는 셈이다.
"키리ㄹ 그왕! 그르르르르르"
다섯 개의 원형 속 숫자들에 주황빛 불이 켜지고, 매끄러운 기계음을 비집고 나오는 배기음이 몇 초 전의 정적을 부드럽게 다그친다. 4리터 반의 8기통이 잠에서 깨어나 숨을 고르는 동안이면 플래너를 확인하고 동선을 짜기에는 충분하다. 브레이크를 밟고, 묵직한 기어노브의 방아쇠를 당기며 투두둑, 브레이크를 떼고. 2톤을 넘는 육중한 범고래Orca의 고삐를 잡는다.
"가보자.... 일해야지. 사람이 일을 해야지 쓰는 것이여..."
<같은 날, 15:30, 순환도로>
"......"
"아닙니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일단 현장에 해당사항 전달 부탁드립니다"
"......"
"네 일단 제 선에서 어떻게 해 볼게요. 부자재들 미리 챙겨둬서 다행이네요. 가는 중입니다. 이따 연락 드릴게요"
어쩐지 묘하게 한가한 오전이더라니, 어쩐지 별 말이 없더라니.
이어셋을 눌러 통화를 종료하고 나지막히 쌍시옷 섞인 한숨을 내쉬며 오른발에 무게를 싣는다. 좀처럼 킥다운을 하지 않던 카이엔도 내 마음을 아는 듯 바늘을 튕긴다. 80...90...100... 배기량 치고 짧은 기어비는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속으로 궁시렁댔지만, 계기판 왼쪽의 바늘이 3을 지나면서부터 생기는 이 토크감, 입천장과 혀 사이에서 부드럽게 굴러가는 연어알같은 이 중독적인 질감과 함께 솟아오르는 mph를 겪고 나서부터는 더이상 불만이 생길 수 없다.
전화를 받기 전 내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던 국산 대형 SUV가 눈에 들어올때쯤 터널이 끝나고, 앞유리창 위로 물방울들이 달라붙고, 뭉치고, 지붕으로 도망치듯 모습을 감춘다. 오른편 가드레일 옆 '급커브' 표지판과 앞 차의 브레이크등이 동시에 눈에 들어온다.
"아냐... 지금 브레이크 밟을거면 아까 가속을 말았어야지. 연비 좋은 차 타면서 왜 써먹지를 못해?"
공연히 앞 차를 탓하며 오른발에 더 힘을 주고, 왼손 두 손가락을 앞으로 뻗어 레버를 튕긴다. 네 가장자리에 달린 265mm 폭의 피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젖은 노면을 할퀴며 인-아웃-인의 말도 안 되는 라인을 묵묵히 따른다. 와이퍼 사이로 보이던 선행 차량이 사이드미러 안에 가둬지고, 곧 백미러 안의 두 불빛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미처 시트로 걸러지지 않는 범프를 지나칠 때마다 느껴지는 차체의 단단함은 이 정도 속도에서는 불쾌함이 아닌 든든함으로 바뀌고, 400m 앞 출구라는 표지판을 지나칠 때에는 이미 고양이만한 6피스톤 캘리퍼가 노면으로 차체를 짓눌러버려 다시금 유순해진 뒤였다. 이어셋 버튼을 길게 눌러 통화를 연결한다.
"네 부장님.. 들어가는 중입니다. 다행이네요.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가 덜 막히네요. 빗길 조심하시구요...."
<같은 날, 22:30, 도심 대로>
퍼붓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보슬비로 바뀌어 가장자리 차선에 간신히 작은 웅덩이만을 만들어둔 채이고, 퇴근시간이라면 그렇게 막히는 도로도 이 시간이면 한산하기 마련이다. 이 시간대에 8차선 도로를 달리는 인종은 다양하지 않다. 공공교통이거나, 배달러이거나, 나같은 '늦퇴' 부류이거나.
21도로 공조기 온도를 맞추고 푹신한 시트에 비 맞은 곰인형마냥 무거운 몸을 얹어놓는다. 10년이 훌쩍 지난 차에 달려있는 보즈 오디오는 지금도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주며 'Oldies but goodies' 라는 표현을 다시금 실천한다. 이따금씩 맨홀을 밟을 때 느껴지는 둔탁한 충격이 거슬리지만 몇 시간 전의 투포환같은 성능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내할만 하다. 건조한 비트를 날리며 차체를 앞으로 던지던 엔진은 2000rpm 아래에서는 유순하지만 확실하게 차체를 도로 흐름에 맞춰준다.
오늘의 누적 연비는 약 5km/l. 연비가 그따위라서 어떻게 타겠냐는 주변인들의 말에 그래서 평소엔 자전거를 탄다는 농으로 받아치지만, 사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다른 "실용적인" 차를 타며 도로 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귀여운 얼굴에 든든한 성능을 위해 기꺼이 유류비는 지출하겠다고.
지하주차장을 접어들며 새삼 생각한다. 이번 건만 끝나면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자체 휴가를 가지리라고, 그리고 천천히 손세차를 하며 함께 고생하던 내 오르카도 챙겨주리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래 주말편(CL63) 도 몰아 적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 일단 이정도로 마무리해둡니다.
2편은 회원님들 반응 따라서... ^^
긴 상상의 나래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에 읽기에 편하고 좋은 글입니다.
일기형식의 글을 보면서 저의 일상도 한번 뒤돌아보게 되게 되었네요.
2편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