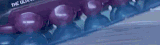Boards
글 수 27,340
먼저 Elan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위 제목에 쓰인 정통 스포츠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라고 하면 근육을 격렬하게 움직여 열량을 소모시키면서 숨이 가빠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 행위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골프는 어떨까? 골프는 연습할 때라도 땀이 좀 나니까 스포츠라고 불러준다고 하면 가벼운 산책은 어떨까? 차를 타고 교외로 나가 걷기 좋은 들길을 한가로이 걷는 건 스포츠에 속할까? 원래 스포츠라는 컨셉은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이라는 사회가 엄격한 신분사회로서 상류층으로 갈수록 생활방식이나 매너, 하다 못해 의상과 소품 하나에까지 격식을 따지는 까다로운 전통을 지니고 있는 지라,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격식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기준은 있되 편안한 복장으로 기분전환이 된 상태에서 여유를 갖고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부유한 상류층은 대도시 교외에 별장들을 만들어 놓고 휴일에 친지들을 불러 모아 신선한 공기와 밝은 햇살 속에서 함께 여우사냥이나 피크닉, Boating, Dart 등과 같은 가벼운 놀이를 즐기곤 했다. 별장을 소유할 정도의 부자가 아니더라도 숲 속이나 강가에 회원제 Club House를 지어 놓고 수시로 회원들이 모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유하였으며, 골프를 칠 때도 골프장의 Club House를 중심으로 그 주변 상류층의 Social Activity가 행해졌다. 이렇게 그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이라는 뜻에서 골프장을 Country Club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골프장 내 Club House에서는 지금도 예의상 쟈켓을 꼭 입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자연 속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의 원래 의미이고 그런 생활이 Sporty Life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면 격렬한 운동이나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우고 살을 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Power와 Physical Attractiveness를 강조하는 미국 문화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Sporty Life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 상류층은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승용마차를 이용하였을 것이고,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는 역시 같은 취향의 자동차를 타고 승용마차가 지나간 길을 달리게 되었다(高級車와 高價車 I 참조). 여기서 우리는 Convertible이라는 차의 컨셉을 이해하게 된다. 즉 햇빛 귀한 나라에서 지붕없이 다니던 승용마차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스포츠카의 의미도 오늘날 우리가 각종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스포츠카들의 컨셉과는 달랐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새는 대개의 경우 누구라도 스포츠카라고 하면 몇 리터 엔진에 최고 마력이 얼마고 발진가속(0 100km/h)의 시간과 최고속도 등을 따지게 된다. 국내에서도 수시로 열리고 있는 Drag Race(출발지점에서 400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겨루는 경기)도 기록단축을 위해 차의 다른 면들을 모두 희생하여 개조한 튜닝카들이 나와 겨루는 경기로 힘과 스피드를 숭상하는 요사이 스포츠카의 컨셉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한 세기 동안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도로조건의 향상에 의해 자동차의 최대속도 허용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수치로 측정되어 계량화 되는 산업사회의 기준에 의해 자동차를 달리는 기계로 인식, 그 기계적 특성들의 수치적 기록 경쟁을 추구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스포츠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 Ferrari, Lamborghini 같은 Super Sports Car가 위용을 자랑하고 BMW, Benz, Audi 등에서 고성능 Sports Sedan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사실 그러한 차들은 굴곡이 적은 독일 Autobahn이나 한적한 미국의 시골 고속도로에서 달리기에 알맞은 컨셉의 스포츠카다. 한마디로 힘과 스피드를 우열기준으로 삼아 Driving Machine으로서의 한계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차들인 것이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시골길을 달려 가는데 대형 차체에 초강력 스피드가 필요할까? 오히려 차체를 작게 하고 적당한 배기량의 엔진에 달아 마치 말을 탄 것처럼 차와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高級車와 高價車 III 참조). Winding Road를 즐기면서도 옆에서 뭐가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르니 Handling과 Braking이 중시되고, 옆에 앉은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야 하니 각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은 살리되 각종 계기나 스위치들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도록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설계된다. 특히 Convertible의 경우 지붕을 여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오디오에 대한 요구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안전도와 함께 머리 위로 스쳐 가는 바람의 상큼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앞 유리창의 높이와 시트의 높이를 적절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운전 기술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로의 상태에 의해 차가 처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자신의 기술로 Control해 나가는 운전의 묘미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Air Bag같은 수동적 안전장치는 선호하되 각종 능동적 안전장치(ABS, TCS 등)는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 능동적 안전장치라는 것이 축적된 실험데이터를 기준으로 Average Driver에 맞추어 개발하는지라, 운전이 능숙한 사람에게는 운전의 맛이 없어지고 때로는 운전자의 운전기술에 차가 따라주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도 한다.
이렇듯 원래 스포츠카의 의미는 앞서 얘기한 영국 상류층의 Sporty Life를 위한 차인 것이다. 이러한 차들은 최고 속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영국이 햇볕도 귀하다 보니 대개 Convertible이 많다. 필자가 正統 스포츠카라고 할 때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교외로 나가 지붕을 열고 바람과 햇빛 속에 천천히 Cruising하면서 자연과 차와 내가 하나가 됨을 느끼는 三位一體의 희열은 한 번 경험한 사람에게는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된다. Elan을 모방하여 Toyota MR2를 개발한 아리마 가쯔토시氏의 스포츠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는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스포츠카는 기분을 전환하고 운전 그 자체를 즐기는 차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일에서 自我가 해방되고, 무념의 상태에서 본질의 자신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즉 마음의 휴식이 가능해야 한다.” 물론 스피드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해서 기본적인 운동성능이 떨어져서는 스포츠카라고 할 수 없다. 아리마 가쯔토시氏는 스포츠카의 운동성능에 대해서도 명쾌한 정의를 내렸다. “스포츠카는 경주용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경주로(Circuit)를 달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주용차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눈치 빠른 사람 중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특정 운전자에게 맞추어 서스펜션 튜닝이 되어 있지만, 스포츠카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불특정 다수의 보통 사람이라도 경주로를 안심하고 매끄럽게 달릴 수 있어야 하며, 전문운전자는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도 97년 초 독일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시장조사의 목적으로 와 있던 Elan을 타고 Bremen에서 Frankfurt까지 최고 시속 240km로 호쾌하게 달려본 적이 있다. 가속 페달에 여유가 남아 분명히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은 것은 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의 Proving Ground의 최고 허용속도가 시속 240km였기 때문이었다(개발할 때 Test Driver들이 그 이상의 속도로는 달려보지를 않았을 것이 아닌가?). 고속주행 내내 1.8L 최고 135마력의 엔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동력성능과 Body Control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Elan은 정통 스포츠카이면서도 오늘날의 통상적인 스포츠카에 못지 않은 운동성능을 지녔기에 같은 영국産 2인승 Roadster이면서 달리는 맛보다는 멋에 치중한 쌍용자동차의 칼리스타와 확연히 구분된다(칼리스타는 쌍용자동차가 영국 팬더社를 인수한 후 국내에서 92년 초 생산하였으나, 당시 국내 자동차시장과 컨셉이 맞지 않아 50여대 정도 만들어진 후 94년 6월에 단종되고 말았다).
그러면 불어로 ‘열정’이라는 의미의 Elan은 과연 어떤 차인가? 앞에서 설명한 正統 스포츠카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ackyard Builder라는 컨셉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Backyard Builder는 말 그대로 자기 집 뒤뜰에서 뚝딱거리고 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약 백년 전 Ford에 의해 Conveyor System이 생산현장에 도입되기 이전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조그마한 공장에서 Hand-made로 소량의 자동차들을 만들어냈다(자동차와 문화 III-I 미국편 참조). 그 후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Conveyor System을 도입하여 대량생산에 나섰으나, 획일화된 자동차의 양산에 반대하여 자기만의 철학이 들어간 독특한 자동차를 소량이라도 계속 만들어 내고자 했던 고집스러운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Backyard Builder라고 부르게 되었다. Elan을 만든 영국의 Lotus가 대표적인 Backyard Builder이며, Alpina, Brabus, Ruf같은 튜닝업체들도 넓게 보아 이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이런 Backyard Builder에 의해 만들어진 차의 성격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차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같은 차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과 기대수준은 대량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것들과는 달라야 한다. 독자분들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필자가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상황에서 그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반응하기는 기존의 습관이나 관성에 의해 상당히 어렵다.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입양되어 만들어진 Elan의 불운도 결국 이 같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70년대에 출시된 제 1세대에 이어 87년경 출시된 제 2세대 Elan은 역대 2인승 Roadster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Rover의 MGF, Toyota의 MR2, Mazda의 Miata(MX-5) 같은 수 많은 추종 모델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Elan은 2인승 Roadster의 명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아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正統 스포츠카의 대표주자인 Elan을 만들게 되었을까? 90년 초 현대자동차가 당시 엑셀을 베이스로 Sports Coupe인 스쿠프를 만들어 인기를 끌자, 기아자동차도 세피아를 베이스로 SLC(Sports Looking Car)의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개발여력과 생산능력의 부족 및 컨셉의 문제로 포기하게 되었다. 여기서 컨셉이라 함은 당시 기아자동차 최고 경영진이 스포츠카에 대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을 의미하는데, 이는 스포티지를 만들 때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고집스러운 엔지니어의 장인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현대자동차가 과거 다른 자동차업체들이 흔히 해 왔듯이 저렴하게 스포츠카의 기분을 비슷하게나마 느껴보라고 대량 생산하는 Sports Coupe을 만들었으니, 기아자동차는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실력도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는 상당히 강력했다 (어차피 판매대수로는 스쿠프를 누를 수 없으니 질적인 면에서 현대자동차를 앞서고 싶다는 기아자동차 최고 경영진의 경쟁의식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수 많은 산업분야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그 나라 산업수준의 척도이고 스포츠카는 그 나라 자동차 기술의 상징이라 그 동안 우리나라도 물량기준으로는 세계 7위권 이내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스포츠카 한 대쯤은 있어야 한다고 당시 김선홍 사장은 필자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였다.
물론 전편에서도 밝혔듯이 천신만고 끝에 겨우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당시 기아자동차의 기술수준으로는 독자적인 스포츠카의 개발은 불가능했고, 천상 외국에서 좋은 모델을 들여 와 국산화하여 기술을 축적한 뒤 그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Mazda의 Miata를 타진하였으나 여지없이 거절 당한 기아자동차는 당시 세피아의 개발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Lotus의 Elan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Elan의 국내 라이센스 생산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근 1년에 걸친 상세 검토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우선 수익성 이전에 생산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즉, Elan은 Backyard Builder의 Hand-made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기아자동차는 철저하게 Conveyor System에 의한 대량생산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시스템은 엄격한 품질과 공정 관리를 통해 하나의 차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규격과 품질수준의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반면, Hand-made 방식은 수치화된 공정기준이나 부품의 품질수준 확보 없이 현장 작업자들의 숙련된 솜씨로 한 대 한 대 만들어내니 원칙적으로 제품마다 품질수준이 다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대량생산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전부 품질불량인 것이다. 한 마디로 전혀 해 보지도 않은 방식인데다가 숙련된 현장 작업자들도 갖지 못한 현장의 평가는 단연 ‘No’였다.
다음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다. 그 당시 Elan의 영국 내 판매가격은 £27,000였고 미국 내 판매가격은 U$40,000이었다. 이렇게 비싼 차를 들여 와 국내에서 아무리 국산화한다고 해도(실제 Elan의 국산화율은 85%였음) 총 제조원가가 3,000만원을 넘어가는데, Elan의 국내 판매가격 목표는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2,000만원이었으니 계산상 애당초 진행될 수가 없는 프로젝트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2인승 승용차, 그것도 Convertible은 그 당시 국내 자동차문화의 수준에서 쉽게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컨셉이어서 국내 수요전망도 매우 불투명했다. 수출도 ‘Made in Korea’로, 그것도 세계 무대에서 거의 無名업체인 기아자동차의 브랜드로서는 무리였다(Elan의 국내 출시 후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자 97년에 Kia Vigato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100대 가량 거의 원가수준으로 수출하기는 했다). 따라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기아자동차 사내에서 Elan 프로젝트의 추진 불가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었다(이처럼 기아자동차는 전문경영인 체제였기에 최고경영진의 지시라도 실무진의 검토에 의해 추진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리하여 일단 중지된 Elan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게 된 데는 스포츠카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변치 않는 의지 이외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93년 파리-다카르 랠리에 첫 출전한 스포티지의 全코스 완주라는 쾌거와 영국 Lotus의 도산 위기였다. 전편에서 설명되었듯 기아자동차의 독자 기술의 상징이었던 스포티지가 비록 순위 내에는 들지 못했으나 별로 개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옥 같은 랠리코스를 완주하였다는 사실은 기아자동차 내에서 강하게 남아 있던 독자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일거에 날려 버렸고, 사내에서 Motor Sports에 대한 붐이 조성됨과 동시에 기아자동차의 엔지니어들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넘치게 되었다. 게다가 때마침 후속 모델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판매 부진에 허덕이던 Lotus가 Elan의 매각을 기아자동차에 제의해 왔다. 과거 Elan 프로젝트의 수익성 검토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플라스틱 차체의 제작을 위한 금형들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인수하게 되었으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개발 과정에서 사출방식도 다르고 상당히 노후화된 이 금형들을 가지고 품질수준을 맞추느라 담당 엔지니어들은 거의 탈진상태에 빠졌음). 또한 스포티지와 세피아라는 독자모델을 개발하면서 그 전까지 외국에서 개발 완료된 모델의 생산경험 밖에 갖지 못했던 기아자동차는 試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Elan같은 Hand-made 자동차의 생산을 통해 試作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검토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93년 말 기아자동차는 Lotus로부터 Elan을 인수하게 되었고 모든 관련도면과 금형, 설비등을 100억이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오게 된다. 비록 입양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있어 최초로 국적있는 본격 스포츠카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약 2년 뒤 기아자동차는 Lotus의 인수도 추진하여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었으나 사내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되고 Lotus는 곧 말레이시아의 Proton에게 넘어가게 된다).
기아자동차는 곧 LHT(Lotus High Tech)라는 프로젝트 이름 하에 본격적으로 Elan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96년 7월 첫 생산이 이루어지기 까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한국 실정에 맞게 부분적인 수정도 행해졌는데, 일단 엔진을 기존 Isuzu 1.6 Turbo에서 기아자동차의 독자엔진인 T8 엔진으로 바꾸었고, 地上高를 10mm 올렸으며, Handling 보다는 승차감 위주로 차량특성을 세팅해 갔다. 차체 길이도 좀 늘리고 Rear Lamp도 새로 디자인하였다. 스포츠카=수퍼카라는 사회인식에 맞추기 위해 발진가속(0 100km/h) 7.8초, 최고 속도 210km/h를 목표로 동력성능을 육성하였고, 연비도 공식연비 11.8km/L로 스포츠카 치고는 꽤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다. LHT 프로젝트(개발 착수 이후 한국을 방문한 Lotus의 회장이 LHT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기에 안내하던 필자가 Left-Handed Tiger라고 농담을 해 다들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를 추진하면서 기아자동차가 겪은 시행착오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생산System의 차이에 기인한 기본인식의 차이였다.
스포츠카의 개발기술은 한마디로 ‘Tuning과 Matching’의 기술이다. 특히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과 대중적 어필에 주력하는 양산형 Sports Coupe와는 달리, 여기 저기서 끌어 모은 제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특색있는 소량의 차를 만들어내는 Backyard Builder의 正統 스포츠카는 더욱 그러하다. 그 당시 개발주역이었던 최윤수 과장(지금은 Denso Korea의 부장임)의 말을 들어 보면, 소량 생산방식의 Lotus부품과 대량 생산방식의 국내 부품의 Matching은 설계허용오차의 범위부터 다르니 처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고, 각기 분화된 Specialist들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기아자동차의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Total Engineer, 즉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던 Elan을 다루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예견하여 일단 생산 자체는 금형전문 계열사였던 안산의 西海工業에서 Backyard Builder 방식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나, 개발은 여전히 기아자동차 연구소가 맡았고 Total Engineer의 부재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생산개시 직전까지도 품질불량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면서 악전고투했던 담당 엔지니어들의 고초가 어떠했을 지는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
또한 개발기간 내내 LHT 프로젝트팀을 괴롭힌 것은 수익성 문제였다. 기존 금형들을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대폭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총 제조원가는 2,400 ~2,500만원을 오르내렸고, 연간 1,0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연 40~50억원에 달했다. 차라는 건 반드시 돈만 보고 만드는 건 아니라며 사내 기획과 자금 부문의 반발을 무마해 가면서 한국 최초의 정통 스포츠카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Elan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Elan을 만들어내면서 기술습득이나 사내 분위기 향상, 홍보효과 같은 무형의 소득은 분명 있었으나, 이렇듯 수익성보다 정책적 의지나 사명감을 우선했던 기아자동차 최고경영진의 자세는 회사가 작았을 때면 모를까, 국내 7위의 거대기업군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반드시 옳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그 당시 기아자동차의 매출규모에 비하면 Elan으로 인한 적자규모는 충분히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는 하지만, 제품에 집착하는 경영진의 자세가 점차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97년 기아자동차의 부도사태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아자동차 같은 회사가 있었기에 Elan같은 차가 무리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750만원의 판매가격으로 생산 개시된 Elan은 또다시 판매부문에서 상이한 시스템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다. 원래 Elan같은 소량생산의 명품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매니아나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기호품의 성격을 지닌다(高級車와 高價車 I 참조). 따라서 현재의 고급 수입차 판매처럼 잘 꾸며진 몇 개의 전문 Showroom에서 소수의 잘 훈련된 영업사원들이 역시 소수의 손님들을 맞이하여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 팔아야 제격이다. 동호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 하나의 Inner Circle을 형성해야 하고, 남다르다는 독특한 Elan만의 제품이미지를 시장에서 형성하는 것이 성공의 요체인 것이다. 일단 정착이 되면 또래집단 내 WOM(Word of Mouth), 즉 口傳效果에 자연스레 판매가 이어지게 된다. 물론 판매 개시 전 사내에서 이러한 의견도 강하게 개진되었으나, 그 때까지 그렇게 팔아 본 적이 없었던 기아자동차의 사내 인식의 부족과 적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어려움, 그리고 어차피 기아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다른 차종들을 팔기 위한 集客效果를 노려야 한다는 논리까지 가세되어 결국 일반 Showroom에서 같이 판매하게 되었고 동호회 활동도 회사 차원에서 전개하지 못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Elan의 판매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Elan을 탈만한 소수의 소비자층은 분위기 형성이 안되어 Elan을 외면했고, 일반 대중들은 신기해 하면서도 ‘차가 모양이 이상하다, 작다’ 등의 이유로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차로 여기게 되었다. 게다가 Elan 출시 몇 개월 전 현대자동차에서 티뷰론이 출시되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서로 경쟁하는 동급의 차종들인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는 바람에, 2인승에 차도 작고 출력도 떨어지는 게 값만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말았다(이처럼 그 당시 자동차 전문기자들도 Elan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어떠했겠는가?). 게다가 독특한 개성과 멋을 자랑하지만 품질이나 끝마무리가 매끈하지 못한 Backyard Builder 차량의 특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양산차의 품질과 동일 수준에서 비교됨에 의해 품질까지 나쁜 차로 매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마케팅의 실패였다. 중저가 차량의 양산메이커였던 기아자동차가 다루기에 Elan은 너무 버거운 명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으로 입양되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격에 맞는 대우도 받지 못하고 험한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Elan은 1,200대 가량 생산된 후 99년 가을 3년여에 걸친 고단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요사이 고가의 2인승 Roadster들이 많이 수입되어 거리에서 부러운 눈길을 모으는 걸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약간 앞선 선구자는 당대에 각광 받고 너무 앞선 선구자는 사후에 인정 받는다고 했던가. 자생적 동호회인 Club Elan의 회원 수가 현재 3,000명을 넘고 Elan의 중고차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보면, Elan은 우리나라 최초의 Classic Car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 같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오너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애완동물같이 살아 있는 생물처럼 깊은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Elan은 그만큼 독특하면서도 멋진 차였다. 기아자동차가 고생 끝에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 명물 하나는 남겨놓은 셈이다.
출처: http://www.autojoins.com/ 오토조인스닷컴
이렇게 Sporty Life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 상류층은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승용마차를 이용하였을 것이고,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는 역시 같은 취향의 자동차를 타고 승용마차가 지나간 길을 달리게 되었다(高級車와 高價車 I 참조). 여기서 우리는 Convertible이라는 차의 컨셉을 이해하게 된다. 즉 햇빛 귀한 나라에서 지붕없이 다니던 승용마차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스포츠카의 의미도 오늘날 우리가 각종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스포츠카들의 컨셉과는 달랐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새는 대개의 경우 누구라도 스포츠카라고 하면 몇 리터 엔진에 최고 마력이 얼마고 발진가속(0 100km/h)의 시간과 최고속도 등을 따지게 된다. 국내에서도 수시로 열리고 있는 Drag Race(출발지점에서 400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겨루는 경기)도 기록단축을 위해 차의 다른 면들을 모두 희생하여 개조한 튜닝카들이 나와 겨루는 경기로 힘과 스피드를 숭상하는 요사이 스포츠카의 컨셉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한 세기 동안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도로조건의 향상에 의해 자동차의 최대속도 허용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수치로 측정되어 계량화 되는 산업사회의 기준에 의해 자동차를 달리는 기계로 인식, 그 기계적 특성들의 수치적 기록 경쟁을 추구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스포츠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 Ferrari, Lamborghini 같은 Super Sports Car가 위용을 자랑하고 BMW, Benz, Audi 등에서 고성능 Sports Sedan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사실 그러한 차들은 굴곡이 적은 독일 Autobahn이나 한적한 미국의 시골 고속도로에서 달리기에 알맞은 컨셉의 스포츠카다. 한마디로 힘과 스피드를 우열기준으로 삼아 Driving Machine으로서의 한계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차들인 것이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시골길을 달려 가는데 대형 차체에 초강력 스피드가 필요할까? 오히려 차체를 작게 하고 적당한 배기량의 엔진에 달아 마치 말을 탄 것처럼 차와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高級車와 高價車 III 참조). Winding Road를 즐기면서도 옆에서 뭐가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르니 Handling과 Braking이 중시되고, 옆에 앉은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야 하니 각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은 살리되 각종 계기나 스위치들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도록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설계된다. 특히 Convertible의 경우 지붕을 여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오디오에 대한 요구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안전도와 함께 머리 위로 스쳐 가는 바람의 상큼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앞 유리창의 높이와 시트의 높이를 적절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운전 기술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로의 상태에 의해 차가 처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자신의 기술로 Control해 나가는 운전의 묘미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Air Bag같은 수동적 안전장치는 선호하되 각종 능동적 안전장치(ABS, TCS 등)는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 능동적 안전장치라는 것이 축적된 실험데이터를 기준으로 Average Driver에 맞추어 개발하는지라, 운전이 능숙한 사람에게는 운전의 맛이 없어지고 때로는 운전자의 운전기술에 차가 따라주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도 한다.
이렇듯 원래 스포츠카의 의미는 앞서 얘기한 영국 상류층의 Sporty Life를 위한 차인 것이다. 이러한 차들은 최고 속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영국이 햇볕도 귀하다 보니 대개 Convertible이 많다. 필자가 正統 스포츠카라고 할 때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교외로 나가 지붕을 열고 바람과 햇빛 속에 천천히 Cruising하면서 자연과 차와 내가 하나가 됨을 느끼는 三位一體의 희열은 한 번 경험한 사람에게는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된다. Elan을 모방하여 Toyota MR2를 개발한 아리마 가쯔토시氏의 스포츠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는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스포츠카는 기분을 전환하고 운전 그 자체를 즐기는 차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일에서 自我가 해방되고, 무념의 상태에서 본질의 자신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즉 마음의 휴식이 가능해야 한다.” 물론 스피드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해서 기본적인 운동성능이 떨어져서는 스포츠카라고 할 수 없다. 아리마 가쯔토시氏는 스포츠카의 운동성능에 대해서도 명쾌한 정의를 내렸다. “스포츠카는 경주용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경주로(Circuit)를 달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주용차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눈치 빠른 사람 중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특정 운전자에게 맞추어 서스펜션 튜닝이 되어 있지만, 스포츠카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불특정 다수의 보통 사람이라도 경주로를 안심하고 매끄럽게 달릴 수 있어야 하며, 전문운전자는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도 97년 초 독일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시장조사의 목적으로 와 있던 Elan을 타고 Bremen에서 Frankfurt까지 최고 시속 240km로 호쾌하게 달려본 적이 있다. 가속 페달에 여유가 남아 분명히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은 것은 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의 Proving Ground의 최고 허용속도가 시속 240km였기 때문이었다(개발할 때 Test Driver들이 그 이상의 속도로는 달려보지를 않았을 것이 아닌가?). 고속주행 내내 1.8L 최고 135마력의 엔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동력성능과 Body Control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Elan은 정통 스포츠카이면서도 오늘날의 통상적인 스포츠카에 못지 않은 운동성능을 지녔기에 같은 영국産 2인승 Roadster이면서 달리는 맛보다는 멋에 치중한 쌍용자동차의 칼리스타와 확연히 구분된다(칼리스타는 쌍용자동차가 영국 팬더社를 인수한 후 국내에서 92년 초 생산하였으나, 당시 국내 자동차시장과 컨셉이 맞지 않아 50여대 정도 만들어진 후 94년 6월에 단종되고 말았다).
그러면 불어로 ‘열정’이라는 의미의 Elan은 과연 어떤 차인가? 앞에서 설명한 正統 스포츠카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ackyard Builder라는 컨셉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Backyard Builder는 말 그대로 자기 집 뒤뜰에서 뚝딱거리고 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약 백년 전 Ford에 의해 Conveyor System이 생산현장에 도입되기 이전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조그마한 공장에서 Hand-made로 소량의 자동차들을 만들어냈다(자동차와 문화 III-I 미국편 참조). 그 후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Conveyor System을 도입하여 대량생산에 나섰으나, 획일화된 자동차의 양산에 반대하여 자기만의 철학이 들어간 독특한 자동차를 소량이라도 계속 만들어 내고자 했던 고집스러운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Backyard Builder라고 부르게 되었다. Elan을 만든 영국의 Lotus가 대표적인 Backyard Builder이며, Alpina, Brabus, Ruf같은 튜닝업체들도 넓게 보아 이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이런 Backyard Builder에 의해 만들어진 차의 성격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차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같은 차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과 기대수준은 대량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것들과는 달라야 한다. 독자분들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필자가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상황에서 그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반응하기는 기존의 습관이나 관성에 의해 상당히 어렵다.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입양되어 만들어진 Elan의 불운도 결국 이 같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70년대에 출시된 제 1세대에 이어 87년경 출시된 제 2세대 Elan은 역대 2인승 Roadster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Rover의 MGF, Toyota의 MR2, Mazda의 Miata(MX-5) 같은 수 많은 추종 모델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Elan은 2인승 Roadster의 명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아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正統 스포츠카의 대표주자인 Elan을 만들게 되었을까? 90년 초 현대자동차가 당시 엑셀을 베이스로 Sports Coupe인 스쿠프를 만들어 인기를 끌자, 기아자동차도 세피아를 베이스로 SLC(Sports Looking Car)의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개발여력과 생산능력의 부족 및 컨셉의 문제로 포기하게 되었다. 여기서 컨셉이라 함은 당시 기아자동차 최고 경영진이 스포츠카에 대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을 의미하는데, 이는 스포티지를 만들 때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고집스러운 엔지니어의 장인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현대자동차가 과거 다른 자동차업체들이 흔히 해 왔듯이 저렴하게 스포츠카의 기분을 비슷하게나마 느껴보라고 대량 생산하는 Sports Coupe을 만들었으니, 기아자동차는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실력도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는 상당히 강력했다 (어차피 판매대수로는 스쿠프를 누를 수 없으니 질적인 면에서 현대자동차를 앞서고 싶다는 기아자동차 최고 경영진의 경쟁의식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수 많은 산업분야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그 나라 산업수준의 척도이고 스포츠카는 그 나라 자동차 기술의 상징이라 그 동안 우리나라도 물량기준으로는 세계 7위권 이내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스포츠카 한 대쯤은 있어야 한다고 당시 김선홍 사장은 필자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였다.
물론 전편에서도 밝혔듯이 천신만고 끝에 겨우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당시 기아자동차의 기술수준으로는 독자적인 스포츠카의 개발은 불가능했고, 천상 외국에서 좋은 모델을 들여 와 국산화하여 기술을 축적한 뒤 그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Mazda의 Miata를 타진하였으나 여지없이 거절 당한 기아자동차는 당시 세피아의 개발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Lotus의 Elan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Elan의 국내 라이센스 생산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근 1년에 걸친 상세 검토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우선 수익성 이전에 생산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즉, Elan은 Backyard Builder의 Hand-made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기아자동차는 철저하게 Conveyor System에 의한 대량생산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시스템은 엄격한 품질과 공정 관리를 통해 하나의 차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규격과 품질수준의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반면, Hand-made 방식은 수치화된 공정기준이나 부품의 품질수준 확보 없이 현장 작업자들의 숙련된 솜씨로 한 대 한 대 만들어내니 원칙적으로 제품마다 품질수준이 다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대량생산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전부 품질불량인 것이다. 한 마디로 전혀 해 보지도 않은 방식인데다가 숙련된 현장 작업자들도 갖지 못한 현장의 평가는 단연 ‘No’였다.
다음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다. 그 당시 Elan의 영국 내 판매가격은 £27,000였고 미국 내 판매가격은 U$40,000이었다. 이렇게 비싼 차를 들여 와 국내에서 아무리 국산화한다고 해도(실제 Elan의 국산화율은 85%였음) 총 제조원가가 3,000만원을 넘어가는데, Elan의 국내 판매가격 목표는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2,000만원이었으니 계산상 애당초 진행될 수가 없는 프로젝트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2인승 승용차, 그것도 Convertible은 그 당시 국내 자동차문화의 수준에서 쉽게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컨셉이어서 국내 수요전망도 매우 불투명했다. 수출도 ‘Made in Korea’로, 그것도 세계 무대에서 거의 無名업체인 기아자동차의 브랜드로서는 무리였다(Elan의 국내 출시 후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자 97년에 Kia Vigato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100대 가량 거의 원가수준으로 수출하기는 했다). 따라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기아자동차 사내에서 Elan 프로젝트의 추진 불가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었다(이처럼 기아자동차는 전문경영인 체제였기에 최고경영진의 지시라도 실무진의 검토에 의해 추진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리하여 일단 중지된 Elan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게 된 데는 스포츠카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변치 않는 의지 이외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93년 파리-다카르 랠리에 첫 출전한 스포티지의 全코스 완주라는 쾌거와 영국 Lotus의 도산 위기였다. 전편에서 설명되었듯 기아자동차의 독자 기술의 상징이었던 스포티지가 비록 순위 내에는 들지 못했으나 별로 개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옥 같은 랠리코스를 완주하였다는 사실은 기아자동차 내에서 강하게 남아 있던 독자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일거에 날려 버렸고, 사내에서 Motor Sports에 대한 붐이 조성됨과 동시에 기아자동차의 엔지니어들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넘치게 되었다. 게다가 때마침 후속 모델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판매 부진에 허덕이던 Lotus가 Elan의 매각을 기아자동차에 제의해 왔다. 과거 Elan 프로젝트의 수익성 검토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플라스틱 차체의 제작을 위한 금형들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인수하게 되었으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개발 과정에서 사출방식도 다르고 상당히 노후화된 이 금형들을 가지고 품질수준을 맞추느라 담당 엔지니어들은 거의 탈진상태에 빠졌음). 또한 스포티지와 세피아라는 독자모델을 개발하면서 그 전까지 외국에서 개발 완료된 모델의 생산경험 밖에 갖지 못했던 기아자동차는 試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Elan같은 Hand-made 자동차의 생산을 통해 試作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검토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93년 말 기아자동차는 Lotus로부터 Elan을 인수하게 되었고 모든 관련도면과 금형, 설비등을 100억이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오게 된다. 비록 입양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있어 최초로 국적있는 본격 스포츠카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약 2년 뒤 기아자동차는 Lotus의 인수도 추진하여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었으나 사내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되고 Lotus는 곧 말레이시아의 Proton에게 넘어가게 된다).
기아자동차는 곧 LHT(Lotus High Tech)라는 프로젝트 이름 하에 본격적으로 Elan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96년 7월 첫 생산이 이루어지기 까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한국 실정에 맞게 부분적인 수정도 행해졌는데, 일단 엔진을 기존 Isuzu 1.6 Turbo에서 기아자동차의 독자엔진인 T8 엔진으로 바꾸었고, 地上高를 10mm 올렸으며, Handling 보다는 승차감 위주로 차량특성을 세팅해 갔다. 차체 길이도 좀 늘리고 Rear Lamp도 새로 디자인하였다. 스포츠카=수퍼카라는 사회인식에 맞추기 위해 발진가속(0 100km/h) 7.8초, 최고 속도 210km/h를 목표로 동력성능을 육성하였고, 연비도 공식연비 11.8km/L로 스포츠카 치고는 꽤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다. LHT 프로젝트(개발 착수 이후 한국을 방문한 Lotus의 회장이 LHT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기에 안내하던 필자가 Left-Handed Tiger라고 농담을 해 다들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를 추진하면서 기아자동차가 겪은 시행착오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생산System의 차이에 기인한 기본인식의 차이였다.
스포츠카의 개발기술은 한마디로 ‘Tuning과 Matching’의 기술이다. 특히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과 대중적 어필에 주력하는 양산형 Sports Coupe와는 달리, 여기 저기서 끌어 모은 제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특색있는 소량의 차를 만들어내는 Backyard Builder의 正統 스포츠카는 더욱 그러하다. 그 당시 개발주역이었던 최윤수 과장(지금은 Denso Korea의 부장임)의 말을 들어 보면, 소량 생산방식의 Lotus부품과 대량 생산방식의 국내 부품의 Matching은 설계허용오차의 범위부터 다르니 처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고, 각기 분화된 Specialist들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기아자동차의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Total Engineer, 즉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던 Elan을 다루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예견하여 일단 생산 자체는 금형전문 계열사였던 안산의 西海工業에서 Backyard Builder 방식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나, 개발은 여전히 기아자동차 연구소가 맡았고 Total Engineer의 부재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생산개시 직전까지도 품질불량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면서 악전고투했던 담당 엔지니어들의 고초가 어떠했을 지는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
또한 개발기간 내내 LHT 프로젝트팀을 괴롭힌 것은 수익성 문제였다. 기존 금형들을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대폭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총 제조원가는 2,400 ~2,500만원을 오르내렸고, 연간 1,0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연 40~50억원에 달했다. 차라는 건 반드시 돈만 보고 만드는 건 아니라며 사내 기획과 자금 부문의 반발을 무마해 가면서 한국 최초의 정통 스포츠카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Elan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Elan을 만들어내면서 기술습득이나 사내 분위기 향상, 홍보효과 같은 무형의 소득은 분명 있었으나, 이렇듯 수익성보다 정책적 의지나 사명감을 우선했던 기아자동차 최고경영진의 자세는 회사가 작았을 때면 모를까, 국내 7위의 거대기업군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반드시 옳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그 당시 기아자동차의 매출규모에 비하면 Elan으로 인한 적자규모는 충분히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는 하지만, 제품에 집착하는 경영진의 자세가 점차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97년 기아자동차의 부도사태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아자동차 같은 회사가 있었기에 Elan같은 차가 무리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750만원의 판매가격으로 생산 개시된 Elan은 또다시 판매부문에서 상이한 시스템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다. 원래 Elan같은 소량생산의 명품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매니아나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기호품의 성격을 지닌다(高級車와 高價車 I 참조). 따라서 현재의 고급 수입차 판매처럼 잘 꾸며진 몇 개의 전문 Showroom에서 소수의 잘 훈련된 영업사원들이 역시 소수의 손님들을 맞이하여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 팔아야 제격이다. 동호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 하나의 Inner Circle을 형성해야 하고, 남다르다는 독특한 Elan만의 제품이미지를 시장에서 형성하는 것이 성공의 요체인 것이다. 일단 정착이 되면 또래집단 내 WOM(Word of Mouth), 즉 口傳效果에 자연스레 판매가 이어지게 된다. 물론 판매 개시 전 사내에서 이러한 의견도 강하게 개진되었으나, 그 때까지 그렇게 팔아 본 적이 없었던 기아자동차의 사내 인식의 부족과 적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어려움, 그리고 어차피 기아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다른 차종들을 팔기 위한 集客效果를 노려야 한다는 논리까지 가세되어 결국 일반 Showroom에서 같이 판매하게 되었고 동호회 활동도 회사 차원에서 전개하지 못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Elan의 판매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Elan을 탈만한 소수의 소비자층은 분위기 형성이 안되어 Elan을 외면했고, 일반 대중들은 신기해 하면서도 ‘차가 모양이 이상하다, 작다’ 등의 이유로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차로 여기게 되었다. 게다가 Elan 출시 몇 개월 전 현대자동차에서 티뷰론이 출시되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서로 경쟁하는 동급의 차종들인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는 바람에, 2인승에 차도 작고 출력도 떨어지는 게 값만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말았다(이처럼 그 당시 자동차 전문기자들도 Elan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어떠했겠는가?). 게다가 독특한 개성과 멋을 자랑하지만 품질이나 끝마무리가 매끈하지 못한 Backyard Builder 차량의 특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양산차의 품질과 동일 수준에서 비교됨에 의해 품질까지 나쁜 차로 매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마케팅의 실패였다. 중저가 차량의 양산메이커였던 기아자동차가 다루기에 Elan은 너무 버거운 명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으로 입양되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격에 맞는 대우도 받지 못하고 험한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Elan은 1,200대 가량 생산된 후 99년 가을 3년여에 걸친 고단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요사이 고가의 2인승 Roadster들이 많이 수입되어 거리에서 부러운 눈길을 모으는 걸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약간 앞선 선구자는 당대에 각광 받고 너무 앞선 선구자는 사후에 인정 받는다고 했던가. 자생적 동호회인 Club Elan의 회원 수가 현재 3,000명을 넘고 Elan의 중고차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보면, Elan은 우리나라 최초의 Classic Car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 같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오너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애완동물같이 살아 있는 생물처럼 깊은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Elan은 그만큼 독특하면서도 멋진 차였다. 기아자동차가 고생 끝에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 명물 하나는 남겨놓은 셈이다.
출처: http://www.autojoins.com/ 오토조인스닷컴
2007.09.21 18:03:23 (*.176.239.165)
엘란 이전에도 국도의 강자라 칭송받으며 국내 모터스포츠계를 휘어잡던 차가 있었죠.
영종도 시절 박정룡 선수가 몰고나와 거진 전 대회를 휩쓴 프라이드... ㅎㅎㅎ
영종도 시절 박정룡 선수가 몰고나와 거진 전 대회를 휩쓴 프라이드... ㅎㅎㅎ
2007.09.21 19:42:09 (*.253.159.20)

기아차는 항상 보면 볼수록 재미 있습니다.
엔진이나 바디 자체가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봅니다.
프라이드, 아벨라, 세피아, 크레도스 모두 동급차종치고는 상당한 바디강성과 뛰어난 핸들링, 스포츠성 짙은 엔진등.....저같은 환자들을 열광케할 뭔가가 있던거 같습니다.
역시 최고경영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거의 기계공학도이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기술위주의 프런티어 정신이었다는것은 마치 혼다를 보는듯 하여 흥미진진 했었구요^^
기아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우리 환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차를 만들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엔진이나 바디 자체가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봅니다.
프라이드, 아벨라, 세피아, 크레도스 모두 동급차종치고는 상당한 바디강성과 뛰어난 핸들링, 스포츠성 짙은 엔진등.....저같은 환자들을 열광케할 뭔가가 있던거 같습니다.
역시 최고경영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거의 기계공학도이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기술위주의 프런티어 정신이었다는것은 마치 혼다를 보는듯 하여 흥미진진 했었구요^^
기아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우리 환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차를 만들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2007.09.21 23:32:26 (*.140.72.248)

황순하님의 글이군요..^^ 그 분이 내신 '자동차 문화에 시동 걸기' 란 책에도 실려있는 내용이네요.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2007.09.22 00:38:54 (*.131.140.87)

하~ 너무나 당연한것이기에 노코멘트!
엘란개발에 주역이신 최윤수과장님은 정말 뵙고 싶습니다. 예전 과장님과 노랑이 하이버전엘란에 뽕짝틀어놓고 오픈하던 때가 그립사옵니다~
엘란개발에 주역이신 최윤수과장님은 정말 뵙고 싶습니다. 예전 과장님과 노랑이 하이버전엘란에 뽕짝틀어놓고 오픈하던 때가 그립사옵니다~
2007.09.22 01:51:43 (*.187.53.20)

그러나 당시의 기아는 직원들이 퇴근하며 빼돌린 부품으로
장사를 할수 있었을만큼 관리라는 면에서는
너무도 엉망인 회사였죠.
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정도로...
엘란...
저의 30대를 재미있게 보내게 해준 좋은 친구였고..
그 전에 나온 칼리스타는 계속 저를 즐겁게 해줄 좋은 친구지요.
윗글에 대해서 엘란보다 쌍용에서 먼저 판매된 칼리스타도
대배기량에서 나오는 충분한 힘과 단순한 하체, 가벼운 차체로
달리기 성능은 제법 괜챦은 녀석이었던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사를 할수 있었을만큼 관리라는 면에서는
너무도 엉망인 회사였죠.
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정도로...
엘란...
저의 30대를 재미있게 보내게 해준 좋은 친구였고..
그 전에 나온 칼리스타는 계속 저를 즐겁게 해줄 좋은 친구지요.
윗글에 대해서 엘란보다 쌍용에서 먼저 판매된 칼리스타도
대배기량에서 나오는 충분한 힘과 단순한 하체, 가벼운 차체로
달리기 성능은 제법 괜챦은 녀석이었던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2007.09.22 01:53:08 (*.187.53.20)

물론 기아가 시판한 덕에 싼 가격으로
재미를 주었던 차임에는 분명하고
돈도 안되는 차에 투자한 기아에
박수를 보냅니다.
재미를 주었던 차임에는 분명하고
돈도 안되는 차에 투자한 기아에
박수를 보냅니다.
2007.09.22 23:56:24 (*.39.183.166)

저는 조금만 더 타다가 번호판 말소하고 창고에 보관하렵니다..ㅋㅋ
수제작 로드스터인 엘란이 한국에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때에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등장해서 모든게 엉망진창이 되어 망하다시피 했죠. 라이벌 차종도 품질 수준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수제작 로드스터인 엘란이 한국에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때에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등장해서 모든게 엉망진창이 되어 망하다시피 했죠. 라이벌 차종도 품질 수준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