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휠 파손, 로워암 파손, 구동축 파손에 이어 핸들축 파손 사례까지 보고되었네요.
휠 파손과 로워암, 구동축 파손 모두 주행 중이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2009년 11월 출고한 투싼ix 인데
2012년 04월 15일 주차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들이 헛돌아 파란손 불렀더니 핸들축이 부러졌다고 하네요. >.<
관련 링크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19510
앞선 사례들의 경우 다행히 큰 피해(-_-)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만약 고속 주행 중 핸들축이 부러졌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
원가 절감은 현기차 그룹만의 과제는 아니겠지만,
최근 보고(제보)되는 사례들을 보면 발생 부위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으로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원가 절감은 필연적이겠지만
원가 절감을 해야 할 부분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을 듯 싶은데.
최근 사례들을 보면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하기엔 발생 부위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아 심경이 복잡해지네요.
다른 예로, 아반테MD의 바퀴가 빠지는 문제는 원가절감이 맞습니다. 무슨 와셔가 플라스틱이라던데 (제가 눈으로 보직 못해서;) 이게 부하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끊어진다더군요.
KSF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고 이에 개선품이 나와서 현재는 개선품이 장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에겐 별 의미없는 부분인데 지속적인 레이스에 문제가 드러나더군요...
현기차의 조립/생산/검사 과정을 보면 과연 '현기차'라고 부를 수 있는 차들이 몇대가 될지 가끔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립/생산/검사를 거의 2차 3차 4차 5차 협력업체로까지 내려서 출하되는 모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엠블럼만 붙었다고 현대차 기아차라고 할수 있을지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중에 그렇지 않은 제품이 오히려
적겠지만요..최근에 가구를 구하려고 알아보니 브랜드 옷장들도 문짝 조립 공정은 다 2차 3차 4차 협력 업체에서
진행하는곳이 대다수더군요.


'원가' 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투입 원재료 가격 말고도 많은 요소가 들어갑니다.....사실 현대 첨단 기계공학제품의 원가에서 원재료가격은 정말 미미하죠....
R&D 비용, 생산비용, QC비용, 유통비용, 재고비용, 기타 간접 경영비용 등등...이는 원청 및 모든 아래 하청업체에서도 동일합니다.....이런 모든 비용들의 합이 '납품원가'에 포함되어 있지요.....
6시그마 들어보셨죠....제품(또는 서비스) 불량율을 극한까지 낮추기 위한 경영학적 생산관리기법입니다.....낮은 불량율은 그에 상응한 리소스 즉 '비용'의 투입이 필수입니다......
제조업에서 원가절감과 직결되어있지 않은 제품불량은 절대 없습니다!

B-2는 프로그램에 인색하게 50조 밖에 안 써서 20년만에 4.7%가 추락한건가요? 아니면 대당 1조원을 조금 넘는 원가절감형 저가 비행기라 그런건가요?
재고비용, 금융비용, 외형 디자인 고급화 비용, 완성차의 탁송비용, 고객선호도 조사비용, 유통네트워크 유지비용, 실내 인테리어 원자재비용을 절감하면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나요?
마지막으로 완성 제품의 불량은 제조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전혀 없어도, 관리 또는 사용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을텐데요.
너무 결론이 과격합니다.

저는 '생산관리이론'의 기본을 제시한거지 제 사견을 말한게 아닙니다...
이미 자동차는 테스트베드에 올라간 최초 발명품이 아니라 수백년 역사를 가진 대량샹산제품입니다.....
그리고 제조 및 설계결함의 대다수는 결국 경영진의 비용(금전적 및 시간적)염려에 따른 서두름입니다.....
역사상 항상 인간의 기술력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참사는 우주, 항공, 자동차를 막론하고 극히 일부분입니다....즉 사법적으로 아무도 책임질수 없는 사고나 참사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기계의 이용은 종종 도전이나 탐험(우주개발 또는 최초의 대륙횡단비행 등등)의 범주에 들어가지 소비재상품은 아닙니다.....
관리 및 사용상의 문제 역시 추적해 보면 사용자의 부주의를 간과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은 제조서비스 업체에 책임 묻지요(맥도날드의 1회용 커피잔에 대한 징벌적 배상케이스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겠죠)
좀더 공부하세요....

앞선 코멘트에서도 말했지만 자동차에서 완성차 유통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실내 인테리어 자재단가를 줄이는 것은 통상 완성차의 불량률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 코멘트에 뭐라고 되어있나요? 원가절감과 직결되지 않은 제품 불량은 '절대' 없다고 되어있죠?
그리고 불량률 관리는 기본적으로 불량률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압비용보다 더 큰 원가절감 또는 판매재고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Liebeck v. McDonald's 케이스도 완전히 엉터리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시엔 위험에 대한 고지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화상 피해자의 수가 7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85도 정도로 서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 과실이 20%라고 판단한 것이고, 커피를 55도에 제공해서 설계 또는 제조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 과실은 100% 근처에서 결정이 되었을겁니다.
며칠 전에 본건데 여기선 이제야 보네요..
원가절감이 아니더라도 저런 일이 주행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면....그래도 저렇게 두둔을 해주니..

6시그마는 불량률을 낮추는 과정에 비용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불량률이 떨어져서 생기는 이익이 불량률 감소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단가 암만 낮춰도 불량 터져서 원청에 폭풍 보상비 들어가면 그동안 아껴서 벌어놓은거 다 까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소비자 과실이라서 보상 그런거 없잖아요?
법으로 이겨도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 이런거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것도 아니고...
안될꺼예요. 아마...

아무리 운나쁜 불량이라도 타 브랜드에서는 정말 보기힘든 사례들이 자꾸 이슈화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낄수밖에 없죠.... (그것도 과거의 구형모델들에서는 오히려 나타나지않았던..)
렉서스는 차량자체결함이 아닌 매트문제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만약 같은 일이 미국에서 주행중에 발생했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났겠죠.. 우리나라니까 걍 고쳐줄테니 그냥 타세요..수준이지..;;
저분은 솔직히 운이 나쁜게 아니라 정말 운이 대박좋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행중이 아니여서.. >.<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제게 저런 문제가 주행 중 발생해서 사고가 났다면 ? 다행스럽게도 목숨만은 건졌다면 ? 과연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나, 2차 충격 등으로 축이 구부러진다거나 혹은 원형이 훼손된다거나~ 머 이러면 걍 또 운전자 과실 혹은 원인 불명 머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억울해서 못살 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불량이란 없을 수 없겠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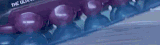





원가절감의 이유라기 보다는 재수없게 불량품이 장착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 원가절감의 이유로 내구성이 떨어졌다라고 볼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