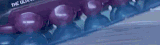Boards
글 수 27,494
스포츠 주행과 연비 주행은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속에선 두 주행법이 공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경우에 맘은 급하지만 일과시간중 고속도로의 소통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평균속도 100km/h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정속주행에만 고집하는 것이 연비에 최상이라고 알려져있지만 효율을 생각하면 주행법에 따라 높은 연비를 유지하면서도 제법 빠른 패턴의 주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차의 특성에 기반한 부분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차종과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브레이크의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과 가속을 해야하는 도로 조건 그리고 타력주행의 비율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의미는 애써서 기름을 연소시켜 높여 놓은 속도를 다시 줄임으로 줄어든 속도차 만큼의 에너지가 낭비됨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는 이 순간에 발전을 하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브레이크의 사용빈도는 연비와는 직결되며, 고속주행 뿐 아니라 시가지 주행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를 적게 밟는다는 의미는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넓음을 의미하고 미리 가속패달에서 발을 떼는 감속 동작의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가속패들에서 발을 떼는 동작 자체가 타력주행을 의미하고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이니 이 순간 감속이 작게 되는 상황 즉 내리막 같은 상황에서는 주행거리 대비 연비가 높아지는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전만 잘해도 연비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브레이크에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전륜 브레이크 디스크를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준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스포츠 성을 추가한다는 부분은 속도를 높이는 도로 상황의 선택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양차선을 가로막은 트럭을 빠져나와 가속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오르막인 경우, 평지인 경우 그리고 내리막인 경우에 차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르막에서 가속하는 것과 내리막에서 가속하는 것은 경사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속도까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2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려본 분들이라면 경사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미세한 내리막과 미세한 오르막에서 허벅지로 다가오는 부하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체험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런 추월상황에서 오르막인 경우 속도를 가속하기보다는 어느 속도에 크루징을 걸고 기다렸다가 평지나 내리막이 되었을 때 가속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아껴놓았던 연비를 까먹는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리막에선 좀 과감하게 속도를 높여도 좋은 조건은 그 높여 놓은 속도를 한동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방 시계가 좋고 그 속도로 크루징을 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차종마다 최대 효율을 보이는 속도대가 있지만 그 최대 효율을 약간 벗어나지만 크루징을 한다는 조건으로는 110km/h나 약간 더 높은 속도대가 실연비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연비계를 잘 관찰하면 해당 엔진이 어떤 속도대에서 최대효율을 살짝 벗어났지만 훨씬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연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속도를 유지하다가 감속을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깊게 밟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기 때문에 타력주행, 즉 가속패달을 미리 떼고 전방의 느려진 차량들 틈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거리 예측이 동원되어야 일정한 연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주행법은 정도에 따라 숙련도에 따라 아주 빠른 주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연비를 마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졸린 정속주행에서 벗어나 차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운전재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린 운전은 안전한 운전과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은 도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적극성을 가지로 안전한 스팟을 찾아다니는 운전입니다.
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한 스팟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입니다.
시가지에서 역시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나의 운전에 제동이 잦음을 발견하는 기준은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 40km/h이하에서만 제동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숙련된 경우 아무리 시가지에서 빨리 달려도 40km/h이상에서는 거의 제동을 하지 않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가속을 해야하는 상황과 도로의 흐름에 맞춰야하는 상황 그리고 한박자 빠른 가속페달 off는 이를 충분히 실현가능하게 해줍니다.
고속주행과 원리는 같으나 시가지 40km/h이하에서만 제동을 건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전한다면 그 과정속에서 연비는 물론 브레이크패드 그리고 타이어등의 수명연장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제동의 빈도가 작다는 의미 자체가 후방 추돌의 가능성을 줄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시가지 운전에서 브레이크 패달에 발을 올리는 포인트 목표는 30km/h입니다.
이러한 운전이 몸에 배면 그 습관을 유지하는 인지능력이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겨울로 다가가면서 노면은 점점 차가워지고 미끄러워집니다.
소개 드린 운전은 특정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 항상 최상의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운전법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testkwon-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경우에 맘은 급하지만 일과시간중 고속도로의 소통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평균속도 100km/h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정속주행에만 고집하는 것이 연비에 최상이라고 알려져있지만 효율을 생각하면 주행법에 따라 높은 연비를 유지하면서도 제법 빠른 패턴의 주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차의 특성에 기반한 부분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차종과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브레이크의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과 가속을 해야하는 도로 조건 그리고 타력주행의 비율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의미는 애써서 기름을 연소시켜 높여 놓은 속도를 다시 줄임으로 줄어든 속도차 만큼의 에너지가 낭비됨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는 이 순간에 발전을 하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브레이크의 사용빈도는 연비와는 직결되며, 고속주행 뿐 아니라 시가지 주행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를 적게 밟는다는 의미는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넓음을 의미하고 미리 가속패달에서 발을 떼는 감속 동작의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가속패들에서 발을 떼는 동작 자체가 타력주행을 의미하고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이니 이 순간 감속이 작게 되는 상황 즉 내리막 같은 상황에서는 주행거리 대비 연비가 높아지는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전만 잘해도 연비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브레이크에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전륜 브레이크 디스크를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준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스포츠 성을 추가한다는 부분은 속도를 높이는 도로 상황의 선택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양차선을 가로막은 트럭을 빠져나와 가속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오르막인 경우, 평지인 경우 그리고 내리막인 경우에 차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르막에서 가속하는 것과 내리막에서 가속하는 것은 경사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속도까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2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려본 분들이라면 경사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미세한 내리막과 미세한 오르막에서 허벅지로 다가오는 부하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체험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런 추월상황에서 오르막인 경우 속도를 가속하기보다는 어느 속도에 크루징을 걸고 기다렸다가 평지나 내리막이 되었을 때 가속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아껴놓았던 연비를 까먹는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리막에선 좀 과감하게 속도를 높여도 좋은 조건은 그 높여 놓은 속도를 한동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방 시계가 좋고 그 속도로 크루징을 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차종마다 최대 효율을 보이는 속도대가 있지만 그 최대 효율을 약간 벗어나지만 크루징을 한다는 조건으로는 110km/h나 약간 더 높은 속도대가 실연비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연비계를 잘 관찰하면 해당 엔진이 어떤 속도대에서 최대효율을 살짝 벗어났지만 훨씬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연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속도를 유지하다가 감속을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깊게 밟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기 때문에 타력주행, 즉 가속패달을 미리 떼고 전방의 느려진 차량들 틈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거리 예측이 동원되어야 일정한 연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주행법은 정도에 따라 숙련도에 따라 아주 빠른 주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연비를 마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졸린 정속주행에서 벗어나 차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운전재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린 운전은 안전한 운전과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은 도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적극성을 가지로 안전한 스팟을 찾아다니는 운전입니다.
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한 스팟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입니다.
시가지에서 역시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나의 운전에 제동이 잦음을 발견하는 기준은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 40km/h이하에서만 제동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숙련된 경우 아무리 시가지에서 빨리 달려도 40km/h이상에서는 거의 제동을 하지 않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가속을 해야하는 상황과 도로의 흐름에 맞춰야하는 상황 그리고 한박자 빠른 가속페달 off는 이를 충분히 실현가능하게 해줍니다.
고속주행과 원리는 같으나 시가지 40km/h이하에서만 제동을 건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전한다면 그 과정속에서 연비는 물론 브레이크패드 그리고 타이어등의 수명연장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제동의 빈도가 작다는 의미 자체가 후방 추돌의 가능성을 줄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시가지 운전에서 브레이크 패달에 발을 올리는 포인트 목표는 30km/h입니다.
이러한 운전이 몸에 배면 그 습관을 유지하는 인지능력이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겨울로 다가가면서 노면은 점점 차가워지고 미끄러워집니다.
소개 드린 운전은 특정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 항상 최상의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운전법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testkwon-
2020.10.14 15:58:00 (*.70.16.113)

좋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문과 같은 효율적인 브레이킹 관리를 잘하는 운전자의 차를 타면 멀미 잘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느끼십니다.
즉, 미세조절 감각에 따라 승차감도 현저히 차이가 나게되죠.
참고로 본문과 같은 효율적인 브레이킹 관리를 잘하는 운전자의 차를 타면 멀미 잘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느끼십니다.
즉, 미세조절 감각에 따라 승차감도 현저히 차이가 나게되죠.
2020.10.14 19:25:22 (*.29.93.108)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 내리막에서 가속, 오르막에서 감속(브레이크), 신호등은 충분히 멀리서 보고 감속과 가속을 결정, 그런데 이게 대도시 시내주행에서는 하기 어렵더라구요.
2020.10.14 23:00:15 (*.235.3.243)
제가 부모님 모시고 운전할때 특히 고속도로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방법으로 주행하는데 공차중량 1.9톤 가까이, 공인연비 9km/l인 차로 4인가족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시 거의 항상 13~14km/l가 나옵니다. 속도는 100~150 유지하구요. 관건은 불필요한 제동을 안하는 것이죠. 페이스가 어떻든 악셀페달만 가지고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는게 연비주행의 조건인것 동감되네요.
2020.10.15 05:22:14 (*.219.213.174)
전 스포츠주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상적인 주행 조건에서 브레이크패드를 좀 오래 쓰는 것 같습니다.
뒷쪽 패드를 차량 출고 이후 11년만에 교체했었고, 앞쪽 패드도 그간 두 번 밖에 교체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두 패드 모두 완전히 다 닳아서 핀이 로터를 긁을 수준으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많이 닳아서 교체했지요)
생각해보니 브레이크를 잘 안밟는 운전습관 때문 인 것 같았는데, 쓰신 글 보니 제 운전이 썩 틀린건 아닌듯 하네요.
주관적인 생각 입니다만, 앞차에 바짝 붙거나 안끼워주려고 용쓰는 운전만 안해도 브레이크를 밟는 빈도는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가속하다가 적당히 들어갈 곳을 찾기만 해도 제동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더군요.
아, 물론 빠르게 가려는 차 에겐 일부러 양보해줍니다. 구태여 바쁜사람의 길을 막거나 하지는 않지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뒷쪽 패드를 차량 출고 이후 11년만에 교체했었고, 앞쪽 패드도 그간 두 번 밖에 교체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두 패드 모두 완전히 다 닳아서 핀이 로터를 긁을 수준으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많이 닳아서 교체했지요)
생각해보니 브레이크를 잘 안밟는 운전습관 때문 인 것 같았는데, 쓰신 글 보니 제 운전이 썩 틀린건 아닌듯 하네요.
주관적인 생각 입니다만, 앞차에 바짝 붙거나 안끼워주려고 용쓰는 운전만 안해도 브레이크를 밟는 빈도는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가속하다가 적당히 들어갈 곳을 찾기만 해도 제동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더군요.
아, 물론 빠르게 가려는 차 에겐 일부러 양보해줍니다. 구태여 바쁜사람의 길을 막거나 하지는 않지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0.10.15 11:51:51 (*.74.209.229)
쓸데없이 브레이크 밟지않고 엑셀로 교통흐름따라 운전하면 연비도 좋게나오고, 기계적으로 차에도 좋고, 교통체증도 줄겠지요. 저는 방어운전 한다며 브레이크 자주 쓰는 운전자들 많이 보게 됩니다.
https://www.nytimes.com/2016/08/11/upshot/driving-tips-how-you-can-help-limit-traffic-jams.html
https://www.nytimes.com/2016/08/11/upshot/driving-tips-how-you-can-help-limit-traffic-jams.html
2020.10.16 17:31:42 (*.109.168.130)

연간 70,000km정도의 평균 마일리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길에서 버려지는 시간의 아까움과 마일리지에 따른 연료비 사이에 항상 갈등하는 생활입니다. 정확히 '스포츠 연비주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
저는 이전차에서 터빈 튜닝으로 인해 배기온 게이지를 달고 운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많은 부분을 깨우친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최대한 엑셀 조절, 중립기어 탄력주행과 클러치미트를 통한 퓨얼컷의 적절한 선택, 배기온이 오르지 않게 하는 언덕길 주행 전략 등이 키인것 같습니다.
10년 40만 km의 마일리지를 가진 공차중량 1.8톤, 상시사륜 국산 suv로, 항시 200kg 정도의 장비 적재, 고속화도로 평균속도 100km를 구현하며 다녀도 리터당 18km+ -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기에... 차를 못바꾸고 있습니다. ㅎㅎ
한가지 느껴지는 부분은 유럽, 특히 북유럽이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도로에는 운전을 '열심히'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도로위 본헤드 플레이어들이 넘쳐나고 도로 환경이 짜증을 유발하며 운전 후 피로감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유럽쪽에서 경험해보면 도로위 거의 모든 운전자가 운전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운전면허 일괄 동시 반납 후 재취득 과정에서 재교육해야 할까요? ㅋ
저는 이전차에서 터빈 튜닝으로 인해 배기온 게이지를 달고 운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많은 부분을 깨우친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최대한 엑셀 조절, 중립기어 탄력주행과 클러치미트를 통한 퓨얼컷의 적절한 선택, 배기온이 오르지 않게 하는 언덕길 주행 전략 등이 키인것 같습니다.
10년 40만 km의 마일리지를 가진 공차중량 1.8톤, 상시사륜 국산 suv로, 항시 200kg 정도의 장비 적재, 고속화도로 평균속도 100km를 구현하며 다녀도 리터당 18km+ -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기에... 차를 못바꾸고 있습니다. ㅎㅎ
한가지 느껴지는 부분은 유럽, 특히 북유럽이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도로에는 운전을 '열심히'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도로위 본헤드 플레이어들이 넘쳐나고 도로 환경이 짜증을 유발하며 운전 후 피로감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유럽쪽에서 경험해보면 도로위 거의 모든 운전자가 운전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운전면허 일괄 동시 반납 후 재취득 과정에서 재교육해야 할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