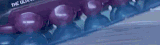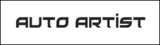Boards
글 수 27,494
뭐..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에 근무하면서 V8엔진의 SUV나
Refined 된 아메리칸 세단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결정해 하나만 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
건방진 이야기 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 "이 동희"를 기억하실 분이 얼마 없을듯 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98년 카비전이라는 자동차 전문지에 썼던 "티뷰론 일기".
티뷰론 스페셜 일반 출고 1호차를 뽑아 이런저런 튜닝을 하며 2년 동안 썼던 기사.
테드쇼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몇분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 기사 보고 저도 튜닝 좋아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군요. 고맙습니다"
사실 그 당사자인 저는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기사를 쓸 당시만 해도,
이런 세계를 알려야 겠다는, 어줍잖은 사명감이 앞서던 시기었습니다.
그에 순기능이었는지, 악기능이었는지는 '
그냥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그냥 쓰러져... ^^;;;;;;
비록 지금은 어느 한 메이커에 소속해
그 회사에서의 녹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전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4WD에 ORIENTED 된 사람입니다. ㅋㅋㅋ^^;;;)
여기, 테드에서만큼은 '자동차 자유인'이고 싶어 집니다.
오늘,
오토 갤러리의 슈투트가르트 모터스에 갔었습니다.
복스터 S 6단 매뉴얼을 타고,
사실 처음에는 마스터님이 모는 조수석에 앉아
한껏 공포감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의 쾌감을 느꼈습니다만,
(전 새디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저 채찍 싫어요. ㅡㅡ;)
그 노란색 컬러와, 노란색 안전벨트가 가슴을 눌러 몸에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를 옆 방향으로 잡아줄 때부터
등골을 따라 그나마 없어져 가고 있는 머리 카락을 세우는 그 엔진음과,
과천 서울 대공원 주차장을 끼고 도는 그 90도 커브에서의 스티어링 특성,
1,2,3단의 롱기어와 4,5,6단의 숏기어가 만드는 새로운 즐거움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껍니다.
원하던 차, 원하던 튜닝, 원하던 파워가 손에 잡혀
처음으로 공도에서 엑셀 페달을 밟던 그 때.
저는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제어력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었던 것이 좋았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복스터s가 제 드림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럼에도 삷을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자극인 그 차를 말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B로 시작해서 M으로 끝나는, (^^;;;)
인터넷 어딘가에 말했다면 지대로 왕따였을 것 같지만,
테드라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왜곡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봅니다.
자동차.
네바퀴, 혹은 두바퀴를 굴려
내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혹은 내 한계를 분명하게 말하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나의 기계.
나의 사랑.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역으로 사랑하는 만큼 알 수 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ㅋㅋ
12월이 되어서,
해 넘어가지 전에 센티멘탈한 이야기로 써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에 근무하면서 V8엔진의 SUV나
Refined 된 아메리칸 세단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결정해 하나만 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
건방진 이야기 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 "이 동희"를 기억하실 분이 얼마 없을듯 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98년 카비전이라는 자동차 전문지에 썼던 "티뷰론 일기".
티뷰론 스페셜 일반 출고 1호차를 뽑아 이런저런 튜닝을 하며 2년 동안 썼던 기사.
테드쇼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몇분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 기사 보고 저도 튜닝 좋아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군요. 고맙습니다"
사실 그 당사자인 저는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기사를 쓸 당시만 해도,
이런 세계를 알려야 겠다는, 어줍잖은 사명감이 앞서던 시기었습니다.
그에 순기능이었는지, 악기능이었는지는 '
그냥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그냥 쓰러져... ^^;;;;;;
비록 지금은 어느 한 메이커에 소속해
그 회사에서의 녹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전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4WD에 ORIENTED 된 사람입니다. ㅋㅋㅋ^^;;;)
여기, 테드에서만큼은 '자동차 자유인'이고 싶어 집니다.
오늘,
오토 갤러리의 슈투트가르트 모터스에 갔었습니다.
복스터 S 6단 매뉴얼을 타고,
사실 처음에는 마스터님이 모는 조수석에 앉아
한껏 공포감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의 쾌감을 느꼈습니다만,
(전 새디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저 채찍 싫어요. ㅡㅡ;)
그 노란색 컬러와, 노란색 안전벨트가 가슴을 눌러 몸에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를 옆 방향으로 잡아줄 때부터
등골을 따라 그나마 없어져 가고 있는 머리 카락을 세우는 그 엔진음과,
과천 서울 대공원 주차장을 끼고 도는 그 90도 커브에서의 스티어링 특성,
1,2,3단의 롱기어와 4,5,6단의 숏기어가 만드는 새로운 즐거움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껍니다.
원하던 차, 원하던 튜닝, 원하던 파워가 손에 잡혀
처음으로 공도에서 엑셀 페달을 밟던 그 때.
저는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제어력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었던 것이 좋았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복스터s가 제 드림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럼에도 삷을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자극인 그 차를 말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B로 시작해서 M으로 끝나는, (^^;;;)
인터넷 어딘가에 말했다면 지대로 왕따였을 것 같지만,
테드라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왜곡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봅니다.
자동차.
네바퀴, 혹은 두바퀴를 굴려
내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혹은 내 한계를 분명하게 말하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나의 기계.
나의 사랑.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역으로 사랑하는 만큼 알 수 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ㅋㅋ
12월이 되어서,
해 넘어가지 전에 센티멘탈한 이야기로 써봅니다.
2006.12.03 00:54:20 (*.232.184.37)

아~~^^그분이셨군요^^ 카비전한창볼때 티뷰론 스페셜 튜닝기사와 포니 그라나다 복원기사 를 가장 주의깊게봤었는데..ㅎ 반갑습니다^^
2006.12.03 02:19:51 (*.12.164.144)
그당시 한참 튜닝에 미쳐있던 때라, 카비젼 나올 때마다 그 기사는 열 번도 넘게 읽었던 거 같네요... 너무 재미있어서요....^^; 언제부턴가 박규철위원님 빠지고 이동희 기자님도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재미없어져서 안보게 되었지요.....
2006.12.03 03:41:43 (*.41.237.120)

맞아요.. 저 중학생때 제 용돈털어 매달 초가 되면 카비젼 사러 서점에 들려 설레는 맘으로 잡지를 들고 집에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동희님 글이랑 박규철 칼럼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그 티뷰론 아직도 기억나네요. ^^ 파란색 티뷰론 스페셜 .. 정말 이뻤습니다. ㅎㅎ
권규혁님 글도 재밌게 봤었지요. 지금 그 잡지 책장 한구석에 있을텐데..
잡지 한권으로 행복했던 때가 떠올라 끄적이고 갑니다. ^^;;
권규혁님 글도 재밌게 봤었지요. 지금 그 잡지 책장 한구석에 있을텐데..
잡지 한권으로 행복했던 때가 떠올라 끄적이고 갑니다. ^^;;
2006.12.03 10:52:38 (*.188.124.165)

저도 한참 카비젼 좋아 했었지요..^^ 글도 잘 읽었습니다.
늘 방향성을 의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 스스로의 질문에도 '정답'을 내어놓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차량도 예외는 아닌 것 같구요..^^
늘 방향성을 의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 스스로의 질문에도 '정답'을 내어놓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차량도 예외는 아닌 것 같구요..^^
2006.12.03 11:26:00 (*.215.123.99)
기억나네요...저도 카비젼 정말 재미 있게 봤었는데...^^ BMW320 을 사셔서 m/t 스왑하시려다 이니셜D에 감명 받으셔서 포니 사셨단걸로 기억합니다...ㅎㅎ 맞죠??
2006.12.03 11:31:36 (*.136.151.219)

어제 함께 한 시승 즐거웠습니다.
저 역시 카비젼 연재를 정말 즐겁게 본 독자중 하나입니다. 책을 사면 가장 먼저 펼쳐서 읽던 기사가 이동희님의 기사였지요.
지금 수입차로 오셔서 그때의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은 잡지 기사는 안쓰시지만 테드에서 경험과 감각에 대한 표현 자주 봤으면 합니다.
복스터는 너무 훌륭한 차이고 이상하게 포르쉐를 타는 회수가 늘어날 수록 저 역시 NA수평대향에 좀 더 맘이 쏠립니다.
취향은 자꾸 바뀌는 것이지만 이미 포르쉐는 제게 더이상 빠른차, 스포츠카가 아니라 뭔가 교감할 수 있는 빠른차 이상의 존재입니다.
가지고 싶어 환장할 정도지만 미래를 위해 정말 아껴두고 싶은 명차입니다.
저역시 로드스터 한대를 가져야 한다면 복스터S 당근 수동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카비젼 연재를 정말 즐겁게 본 독자중 하나입니다. 책을 사면 가장 먼저 펼쳐서 읽던 기사가 이동희님의 기사였지요.
지금 수입차로 오셔서 그때의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은 잡지 기사는 안쓰시지만 테드에서 경험과 감각에 대한 표현 자주 봤으면 합니다.
복스터는 너무 훌륭한 차이고 이상하게 포르쉐를 타는 회수가 늘어날 수록 저 역시 NA수평대향에 좀 더 맘이 쏠립니다.
취향은 자꾸 바뀌는 것이지만 이미 포르쉐는 제게 더이상 빠른차, 스포츠카가 아니라 뭔가 교감할 수 있는 빠른차 이상의 존재입니다.
가지고 싶어 환장할 정도지만 미래를 위해 정말 아껴두고 싶은 명차입니다.
저역시 로드스터 한대를 가져야 한다면 복스터S 당근 수동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2006.12.03 12:35:52 (*.152.174.34)
저도 이동희님 칼럼 매우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포니2 복원하실때 카비젼에서 독자의날행사인가 그거해서 춘천에 오셨었을때 한번 뵈었었는데요.....ㅋ 그날 운좋게 993카레라에 동승했던 학생이 저였답니다...^^;
2006.12.03 12:38:33 (*.131.173.35)
이동희님이 그 이동희님이시군요..저도 파란색 티뷰론스페셜이었던가..부터 포니복원까지 기사들 재미있게 봐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