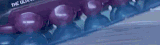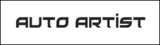글 수 6,042
아쉬움 가득했던 뉘르부르크에서의 2박 3일을 뒤로 하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야 했다. 사실 말이 2박 3일이지 월요일 저녁에 도착해 수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시간은 하루 정도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파리와 독일을 오가며 느꼈던 유럽의 자동차 매너, 그리고 파리에서 본 자동차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덕분에 올 때는 파리-벨기에-뉘르부르크, 갈 때는 뉘르부르크-룩셈부르크-파리가 됐다.
그러고 보니 2박 3일 동안 4개국 운전한 게 되네.
고속도로로 지나간 것도 가긴 간 거잖아.
참고로 룩셈부르크 쪽으로 가면 거리가 좀 더 짧아진다.
여기도 공사 무지하게 한다.
공사 구간에서는 속도를 더욱 준수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2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지지만 이것 때문에 차가 밀리지는 않는다.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
그리고 공사 구간이 끝나면 다들 힘껏 밟아준다.
그러니까 밟아줄 때는 기름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속도를 내준다.
팀 컬러 아주 맘에 든다.
프랑스로 접어들어야 차가 좀 늘어나는 정도다.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인상적인 경고판을 봤다.
어린 딸 또는 부인이 아버지 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다.
안전 운전을 하라는 뜻인데, 경고 문구 하나 없어도 마음에 확 와 닿는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일단 추월과 주행 차선을 확실히 지킨다는 것.
이전에도 말했지만 소위 ‘1차선 막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을 포함해 몇 번의 유럽 내 운전에서도 한 번도 못 봤다.
여기서 1차선으로 나온다는 것은 추월하겠다는 의미이고
추월이 끝나면 곧장 2차선으로 들어간다.
만약 자신의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곧 다른 차를 또 추월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추월한다.
평균 주행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지만
그렇다고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해 달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속도 제한(130km/h)을 꽉 채워 달리고
추월할 때는 좀 더 속력을 내는 정도다.
우합류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확실하게 지켜준다.
만약 고속도로를 2차선으로 달리다 우합류 도로에서 차가 보이면
미리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꾼다.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얼른 속도를 내서 지나가거나 속도를 줄인다.
즉, 합류하는 차가 자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쉽게 본선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오른쪽에서 차가 합류하면 줄줄이 1차선으로 비키는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이 결과 차가 엉키지 않고 기존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운전을 잘한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보다 훨씬 운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대부분이 합류하는 차가 보이면 오히려 속도를 내서 가로 막거나,
그게 아니라면 신경을 전혀 안 써서 합류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는 보다 운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막말로 국가나 메이커 차원에서 계몽 활동을 해도 조금 먹힐까 말까이다.
그런데 차 팔고 세금만 걷기 바쁘니 답이 없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운전 매너만큼은 누가 볼까 무섭다.
많은 나라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매너가 못한 곳은 중국 뿐이다.
결국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 운전자도 세대 교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밥 달라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파리에서 출발할 때는 혹시나 무급유로 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림없다.
주유를 위해 차만 갖다대도 그림이 나온다.
그림이 좋은 게 사실이긴 한데, 이국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전에 버스 타고 가다가 외국인 할머니가 반포대교랑 한강 보고 떡실신한 것도 봤다.
‘뷰리풀’하면서 사진 겁나 찍더라.
평소에 반포대교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시 보게 됐다.
차도 없고 넓어서 너무나 여유롭다.
미토도 잘 보이지 않는 차인데,
이렇게 한적한 곳에 동양인 남자 2명이 오니 많이들 쳐다본다.
검은 게 디젤이다.
엄청 생소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앞유리 닦을 수 있는 도구와 휴지도 있다.
불 들어온 상태에서 가득 넣으니 39.84리터가 들어가고 요금은 51유로.
그럼 연료 탱크 용량은 45리터 정도라는 건데, 나중에 확인하니 정말 45리터더라.
미토 트렁크이고 나름 쓸만한 공간이지만 철판이 훤히 보이는 게 좀 거슬리긴 한다.
차대 번호 같은데 동전 수납해도 괜찮을듯.
뒤에 세워진 거 보면 직원 차일 수도.
근데 현대 쿠페말고 투스카니라고 또 붙어 있다.
따로 붙인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소리가 달랐고 깊게 파인 디퓨저도 남다르다.
꽤나 보기 힘든 차를 도로에서 만났다.
주유소 찾느라 총 주행거리가 1천 km를 조금 넘어버렸다.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니 13.82리터에 요금은 17유로.
아까 그 한적한 주유소 보다 기름값이 오히려 싸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파리에서 본 자동차들.
이 라인에 세워진 자동차 중 자동은 랜드로버 뿐이었다.
체감상 A, B 세그먼트는 수동이 100%.
포르투갈에서도 ATOS였다.
그런데 영국에서 팔리는 차를 보니 ATOZ다.
영국은 또 다른건가.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차 관리 상태는 우리보다 못한 차가 많다.
이런 건 본받을 만하다. 근데 프랑스에서 애가 셋이면 엄청 애국자 아닌가.
이 시절의 로버는 정말 황이었을거다.
2004년의 파리 모터쇼에서 로버 차에 앉아 봤는데,
내장재 품질이 지금 중국차 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었다.
혹시 시승차는 아니겠지.
파리에서 테라칸이면 정말 빅 사이즈다.
이때만 해도 미토를 렌트할 줄은 몰랐다.
길은 좁고 일방통행이 대다수이며 주차 공간도 협소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범퍼와 범퍼가 딱 붙어 주차돼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본다.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간 바로 신고 들어온다.
그리고 앞뒤로 쿵쿵대며 빠져나갔다가는 뺑소니 된다.
이것도 누가 갖다 붙인걸까.
10대도 넘게 본 듯.
사진은 실제보다 짧게 나왔다.
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안팎이 반짝반짝하다.
그래도 911 중 최고 디자인은 993이다.
이렇게 EX1 같은 최신 컨셉트카도 전시돼 있고
파란불 받으면 곧장 뛰어나가고 휠스핀 소리도 심심찮게 듣는다.
우리처럼 미적거리는 차는 드물다.
파리 사람들 운전하는 거만 본다면 한국 사람은 성격 느긋하다.
시내에서는 디젤차의 배기가스 냄새를 자주 맡는다.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오래된 디젤차의 매연인데,
파리에서 흔하게 맡는 냄새와 비슷하다.
워낙 이 냄새에 민감해서인지 불쾌할 때가 많다.
경유의 질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얼핏 찻길 가까운데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낭만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난 이 냄새 맡으면서 못하겠더라.
체감상으로 승용 디젤의 점유율이 80%는 넘는 것 같다.
우리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 특히 보행자를 생각하는 마인드이다.
우선 급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보를 잘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철저하게 우선 순위를 지킨다.
파리 시내는 넓어야 편도 2차로에 일방통행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각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큰 정체 없이 다니지 않나 싶다.
물론 정체 구간에서는 이런 모습이 조금 희석되긴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니다.
적어도 길게 늘어선 구간에서 얌체처럼 앞에서 끼어드는 모습은 못 봤다.
그리고 보행자를 확실하게 배려하는 건 정말 배워야 한다.
지금껏 가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보행자가 신호를 안 지키는 것이다(중국은 예외).
빨간불이라도 차가 없다면 서슴없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간혹 보행자가 차의 통행을 방해할 때도 있지만
거기다 대고 빵빵 대거나 인상 쓰는 모습은 못 봤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조차도 신호를 잘 지킨다.
이렇게 알아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파리 시내의 신호등이 작은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호 대기 중 횡단보도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신호 대기 중 보행자들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게 다반사다.
혼잡한 시내에서 사람들이 범퍼 앞을 바로 지나가는데도 움직이는 게 우리다.
정지선 지키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보행자 신호 때는 꼼짝 않고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움직이면 보행자는 불안하다.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쁜 습관이니 반드시 고쳐야 한다.
신호 대기 때는 브레이크 꽉 밟고 있자.
그렇게 슬금슬금 움직이는 자동차치고 빨리 가는 거 못 봤다.
당신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로 변한다.

덕분에 올 때는 파리-벨기에-뉘르부르크, 갈 때는 뉘르부르크-룩셈부르크-파리가 됐다.
그러고 보니 2박 3일 동안 4개국 운전한 게 되네.
고속도로로 지나간 것도 가긴 간 거잖아.
참고로 룩셈부르크 쪽으로 가면 거리가 좀 더 짧아진다.

여기도 공사 무지하게 한다.
공사 구간에서는 속도를 더욱 준수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2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지지만 이것 때문에 차가 밀리지는 않는다.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
그리고 공사 구간이 끝나면 다들 힘껏 밟아준다.
그러니까 밟아줄 때는 기름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속도를 내준다.
팀 컬러 아주 맘에 든다.

프랑스로 접어들어야 차가 좀 늘어나는 정도다.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인상적인 경고판을 봤다.
어린 딸 또는 부인이 아버지 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다.
안전 운전을 하라는 뜻인데, 경고 문구 하나 없어도 마음에 확 와 닿는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일단 추월과 주행 차선을 확실히 지킨다는 것.
이전에도 말했지만 소위 ‘1차선 막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을 포함해 몇 번의 유럽 내 운전에서도 한 번도 못 봤다.
여기서 1차선으로 나온다는 것은 추월하겠다는 의미이고
추월이 끝나면 곧장 2차선으로 들어간다.
만약 자신의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곧 다른 차를 또 추월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추월한다.
평균 주행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지만
그렇다고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해 달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속도 제한(130km/h)을 꽉 채워 달리고
추월할 때는 좀 더 속력을 내는 정도다.

우합류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확실하게 지켜준다.
만약 고속도로를 2차선으로 달리다 우합류 도로에서 차가 보이면
미리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꾼다.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얼른 속도를 내서 지나가거나 속도를 줄인다.
즉, 합류하는 차가 자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쉽게 본선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오른쪽에서 차가 합류하면 줄줄이 1차선으로 비키는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이 결과 차가 엉키지 않고 기존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운전을 잘한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보다 훨씬 운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대부분이 합류하는 차가 보이면 오히려 속도를 내서 가로 막거나,
그게 아니라면 신경을 전혀 안 써서 합류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는 보다 운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막말로 국가나 메이커 차원에서 계몽 활동을 해도 조금 먹힐까 말까이다.
그런데 차 팔고 세금만 걷기 바쁘니 답이 없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운전 매너만큼은 누가 볼까 무섭다.
많은 나라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매너가 못한 곳은 중국 뿐이다.
결국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 운전자도 세대 교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밥 달라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파리에서 출발할 때는 혹시나 무급유로 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림없다.

주유를 위해 차만 갖다대도 그림이 나온다.
그림이 좋은 게 사실이긴 한데, 이국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전에 버스 타고 가다가 외국인 할머니가 반포대교랑 한강 보고 떡실신한 것도 봤다.
‘뷰리풀’하면서 사진 겁나 찍더라.
평소에 반포대교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시 보게 됐다.

차도 없고 넓어서 너무나 여유롭다.
미토도 잘 보이지 않는 차인데,
이렇게 한적한 곳에 동양인 남자 2명이 오니 많이들 쳐다본다.

검은 게 디젤이다.

엄청 생소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앞유리 닦을 수 있는 도구와 휴지도 있다.

불 들어온 상태에서 가득 넣으니 39.84리터가 들어가고 요금은 51유로.
그럼 연료 탱크 용량은 45리터 정도라는 건데, 나중에 확인하니 정말 45리터더라.


미토 트렁크이고 나름 쓸만한 공간이지만 철판이 훤히 보이는 게 좀 거슬리긴 한다.

차대 번호 같은데 동전 수납해도 괜찮을듯.

뒤에 세워진 거 보면 직원 차일 수도.
근데 현대 쿠페말고 투스카니라고 또 붙어 있다.
따로 붙인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소리가 달랐고 깊게 파인 디퓨저도 남다르다.


꽤나 보기 힘든 차를 도로에서 만났다.

주유소 찾느라 총 주행거리가 1천 km를 조금 넘어버렸다.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니 13.82리터에 요금은 17유로.
아까 그 한적한 주유소 보다 기름값이 오히려 싸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파리에서 본 자동차들.

이 라인에 세워진 자동차 중 자동은 랜드로버 뿐이었다.
체감상 A, B 세그먼트는 수동이 100%.


포르투갈에서도 ATOS였다.
그런데 영국에서 팔리는 차를 보니 ATOZ다.
영국은 또 다른건가.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차 관리 상태는 우리보다 못한 차가 많다.



이런 건 본받을 만하다. 근데 프랑스에서 애가 셋이면 엄청 애국자 아닌가.






이 시절의 로버는 정말 황이었을거다.
2004년의 파리 모터쇼에서 로버 차에 앉아 봤는데,
내장재 품질이 지금 중국차 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었다.

혹시 시승차는 아니겠지.

파리에서 테라칸이면 정말 빅 사이즈다.



이때만 해도 미토를 렌트할 줄은 몰랐다.


길은 좁고 일방통행이 대다수이며 주차 공간도 협소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범퍼와 범퍼가 딱 붙어 주차돼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본다.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간 바로 신고 들어온다.
그리고 앞뒤로 쿵쿵대며 빠져나갔다가는 뺑소니 된다.


이것도 누가 갖다 붙인걸까.

10대도 넘게 본 듯.


사진은 실제보다 짧게 나왔다.


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안팎이 반짝반짝하다.
그래도 911 중 최고 디자인은 993이다.


이렇게 EX1 같은 최신 컨셉트카도 전시돼 있고



파란불 받으면 곧장 뛰어나가고 휠스핀 소리도 심심찮게 듣는다.
우리처럼 미적거리는 차는 드물다.
파리 사람들 운전하는 거만 본다면 한국 사람은 성격 느긋하다.

시내에서는 디젤차의 배기가스 냄새를 자주 맡는다.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오래된 디젤차의 매연인데,
파리에서 흔하게 맡는 냄새와 비슷하다.
워낙 이 냄새에 민감해서인지 불쾌할 때가 많다.
경유의 질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얼핏 찻길 가까운데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낭만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난 이 냄새 맡으면서 못하겠더라.
체감상으로 승용 디젤의 점유율이 80%는 넘는 것 같다.

우리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 특히 보행자를 생각하는 마인드이다.
우선 급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보를 잘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철저하게 우선 순위를 지킨다.
파리 시내는 넓어야 편도 2차로에 일방통행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각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큰 정체 없이 다니지 않나 싶다.
물론 정체 구간에서는 이런 모습이 조금 희석되긴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니다.
적어도 길게 늘어선 구간에서 얌체처럼 앞에서 끼어드는 모습은 못 봤다.
그리고 보행자를 확실하게 배려하는 건 정말 배워야 한다.
지금껏 가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보행자가 신호를 안 지키는 것이다(중국은 예외).
빨간불이라도 차가 없다면 서슴없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간혹 보행자가 차의 통행을 방해할 때도 있지만
거기다 대고 빵빵 대거나 인상 쓰는 모습은 못 봤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조차도 신호를 잘 지킨다.
이렇게 알아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파리 시내의 신호등이 작은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호 대기 중 횡단보도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신호 대기 중 보행자들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게 다반사다.
혼잡한 시내에서 사람들이 범퍼 앞을 바로 지나가는데도 움직이는 게 우리다.
정지선 지키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보행자 신호 때는 꼼짝 않고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움직이면 보행자는 불안하다.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쁜 습관이니 반드시 고쳐야 한다.
신호 대기 때는 브레이크 꽉 밟고 있자.
그렇게 슬금슬금 움직이는 자동차치고 빨리 가는 거 못 봤다.
당신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로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