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글 수 27,332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셸 바렐리씨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자동차 저널리스트중에도 검증되지 못한 운전실력을 가진 분들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PG(Motor Press Guild)에서는 매년 11월 트랙데이를 여는데 제가
처음 참가했을때는 권영주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픈데 뷔페에 간 격이라 이차
저차 타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이듬해 참가했을 때에는 '다른 저널리스트들에게 운전을 배워보자' 라는 생각에 다른분들의
차에 동승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전의 어느 이벤트에서 만났던 저널리스트는 유럽에서 아마추어 랠리에 여러번 참가하고
미국에서도 SCCA 레이스에 자주 출전한다 하여 그 분 차에 타보았는데 사실 많이 실망하게
되었죠. 부드러움도 없고, 다각형 코너링이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확실한 실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리핑 포인트를 확실하게 빗나가는 통에 코너를 벗어날 무렵 차의 라인이
확실한 코너 바깥쪽이 아니라 어중간한 위치가 되자 스티어링을 바깥쪽으로 돌려 연석을
스치며 "이렇게 노폭을 넓게 활용하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몇 저널리스트들의 차를 타면서 저만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승 이벤트때에는 2인 1조로 분승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저도 남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벤츠 S클래스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에도 같이 탄 저널리스트때문에
벤츠의 안전도를 확실하게 실험해 볼뻔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MPG 멤버중 제가 확실히 믿고 같이 탈수 있는 분은 테드 회원이시기도 한 신원석님,
Edmunds.com의 Kevin Smith씨와 Chris Walton씨, 그리고 프리랜서인 Sandra Bartley씨등
몇분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다녀온 사브 이벤트에서 저와 한조가 된 Jeff Yip씨도 아주
부드러운 운전은 아니지만 동승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고 안전위주의 운전으로 다른
행사에서 한조가 되어도 기꺼이 같이 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절대 같은 차를 타지 않고 싶은 분들도 MPG 내에는 꽤 있습니다.
운전 테크닉 자체는 괜찮으나 공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Larry 아저씨를
비롯해 운전테크닉은 보통수준이지만 운전하면서 주의가 산만한 분도 계시고, 평소에는
조분조분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차에 오르면 호흡이 가빠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예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의 운전은 초고수급일거라는 환상은
몇년 전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게다가 사실 저 스스로의 운전도 어느 수준인지 검증되었다고
볼수는 없죠. 스스로는 중급자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중급자일수도, 아니면 하수일지도,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일수도 있습니다. 운전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멀티태스킹이 안되는 단순두뇌라 운전하면서 다른 기기를 조작할 때면 동승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라면 이제 일반도로에서 불필요하게 차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와인딩에서
다른 차들보다 적지않은 차이로 빠르게 달릴때도 있습니다.
사실 차의 주행캐릭터들도 비슷비슷해져서 웬만큼 몰아봐서는 이렇다 할만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예전보다 더 빠르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겁이 더 많아진 것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나 당위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교통위반 법칙금과 위반시 보험료 인상폭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보니 시승중이라도 예전보다 많이 조심스러워지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류청희님 말씀처럼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자주가는 산길에서 시승중에 블라인드 코너에서 유턴을
하던 미니밴과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리 빠르게 달리고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여유롭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충돌을 피할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저때 조금 더 차를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보면 답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속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일테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저도 큰 사고는 내지 않았고 제 주변에서도 큰 사고를 낸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류청희님 글을 읽으면서 늘 맘속에 맴돌던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청희입니다.
>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오펠 언론대상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디에고와 팜 스프링즈에 다녀왔습니다. 30일에는 오펠 아스트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31일에는 국내에 GM대우 G2X로 들어올 오펠 GT를 시승했습니다.
>
>여느 언론대상 이벤트들이 그렇듯, 전반적인 행사는 무척 활기차게 진행되었지만, 31일 아침 오펠 GT 브리핑의 말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사에 앞서 참석한 프랑스 기자 미셸 바렐리 씨가 그 전 주말 시승에 나섰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주최측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는 산악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길에서 벗어나 3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
>1년에도 여러 메이커가 세계 각국 자동차 전문기자들을 불러 수십 차례의 새차 이벤트를 펼칩니다. 물론 시승은 빼놓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도 시승은 자동차 전문기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전문기자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운전실력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승을 하고 시승기를 써야 하는 기자는 그래야 합니다.
>
>장기 시승을 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차의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수단을 써서 차를 테스트해 봅니다. 지면, 전파, 화면을 통해 나가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로 얻어낸 정보를 다 풀어놓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기사를 읽고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과정에서 종종 기자들은 한계선을 들락날락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시승환경이 똑같지 않고 시승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계선 역시 들쭉날쭉하기 마련입니다. 시승을 하는 곳이 테스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소든, 서킷이든, 공도이든 간에 한계선은 결코 한결같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험은 늘 기자들의 주변을 맴돕니다.
>
>2000년쯤인가, '카 앤 드라이버'지에서 돈 슈레더 씨의 부고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모델을 시승하다 일어난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자동차 전문기자의 사망사고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회복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는 'BBC 톱기어'의 리처드 해먼드 역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
>스스로 자초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건이 열악한(홍콩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솔직히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을 뿐, 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배나 동료, 후배기자들 중 심각한 사고를 내거나 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요. 꼭 기자로 시승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데, 한계선을 드나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국내 얘깁니다), 요즘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어쩌다 보니 이 길로 들어서서, 재미삼아 서만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의 본분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
>아직까지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시승을 하고 기사를 쓰는 일을 계속 해 왔던 입장에서, 이역이지만 지척에서 벌어졌던 '동료' 기자의 안타까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은 저 자신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기사를 쓰는 도중에 문득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
>뒤늦게나마 삼가 바렐리 씨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자동차 저널리스트중에도 검증되지 못한 운전실력을 가진 분들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PG(Motor Press Guild)에서는 매년 11월 트랙데이를 여는데 제가
처음 참가했을때는 권영주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픈데 뷔페에 간 격이라 이차
저차 타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이듬해 참가했을 때에는 '다른 저널리스트들에게 운전을 배워보자' 라는 생각에 다른분들의
차에 동승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전의 어느 이벤트에서 만났던 저널리스트는 유럽에서 아마추어 랠리에 여러번 참가하고
미국에서도 SCCA 레이스에 자주 출전한다 하여 그 분 차에 타보았는데 사실 많이 실망하게
되었죠. 부드러움도 없고, 다각형 코너링이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확실한 실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리핑 포인트를 확실하게 빗나가는 통에 코너를 벗어날 무렵 차의 라인이
확실한 코너 바깥쪽이 아니라 어중간한 위치가 되자 스티어링을 바깥쪽으로 돌려 연석을
스치며 "이렇게 노폭을 넓게 활용하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몇 저널리스트들의 차를 타면서 저만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승 이벤트때에는 2인 1조로 분승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저도 남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벤츠 S클래스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에도 같이 탄 저널리스트때문에
벤츠의 안전도를 확실하게 실험해 볼뻔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MPG 멤버중 제가 확실히 믿고 같이 탈수 있는 분은 테드 회원이시기도 한 신원석님,
Edmunds.com의 Kevin Smith씨와 Chris Walton씨, 그리고 프리랜서인 Sandra Bartley씨등
몇분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다녀온 사브 이벤트에서 저와 한조가 된 Jeff Yip씨도 아주
부드러운 운전은 아니지만 동승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고 안전위주의 운전으로 다른
행사에서 한조가 되어도 기꺼이 같이 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절대 같은 차를 타지 않고 싶은 분들도 MPG 내에는 꽤 있습니다.
운전 테크닉 자체는 괜찮으나 공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Larry 아저씨를
비롯해 운전테크닉은 보통수준이지만 운전하면서 주의가 산만한 분도 계시고, 평소에는
조분조분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차에 오르면 호흡이 가빠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예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의 운전은 초고수급일거라는 환상은
몇년 전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게다가 사실 저 스스로의 운전도 어느 수준인지 검증되었다고
볼수는 없죠. 스스로는 중급자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중급자일수도, 아니면 하수일지도,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일수도 있습니다. 운전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멀티태스킹이 안되는 단순두뇌라 운전하면서 다른 기기를 조작할 때면 동승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라면 이제 일반도로에서 불필요하게 차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와인딩에서
다른 차들보다 적지않은 차이로 빠르게 달릴때도 있습니다.
사실 차의 주행캐릭터들도 비슷비슷해져서 웬만큼 몰아봐서는 이렇다 할만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예전보다 더 빠르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겁이 더 많아진 것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나 당위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교통위반 법칙금과 위반시 보험료 인상폭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보니 시승중이라도 예전보다 많이 조심스러워지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류청희님 말씀처럼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자주가는 산길에서 시승중에 블라인드 코너에서 유턴을
하던 미니밴과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리 빠르게 달리고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여유롭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충돌을 피할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저때 조금 더 차를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보면 답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속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일테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저도 큰 사고는 내지 않았고 제 주변에서도 큰 사고를 낸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류청희님 글을 읽으면서 늘 맘속에 맴돌던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청희입니다.
>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오펠 언론대상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디에고와 팜 스프링즈에 다녀왔습니다. 30일에는 오펠 아스트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31일에는 국내에 GM대우 G2X로 들어올 오펠 GT를 시승했습니다.
>
>여느 언론대상 이벤트들이 그렇듯, 전반적인 행사는 무척 활기차게 진행되었지만, 31일 아침 오펠 GT 브리핑의 말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사에 앞서 참석한 프랑스 기자 미셸 바렐리 씨가 그 전 주말 시승에 나섰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주최측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는 산악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길에서 벗어나 3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
>1년에도 여러 메이커가 세계 각국 자동차 전문기자들을 불러 수십 차례의 새차 이벤트를 펼칩니다. 물론 시승은 빼놓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도 시승은 자동차 전문기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전문기자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운전실력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승을 하고 시승기를 써야 하는 기자는 그래야 합니다.
>
>장기 시승을 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차의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수단을 써서 차를 테스트해 봅니다. 지면, 전파, 화면을 통해 나가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로 얻어낸 정보를 다 풀어놓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기사를 읽고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과정에서 종종 기자들은 한계선을 들락날락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시승환경이 똑같지 않고 시승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계선 역시 들쭉날쭉하기 마련입니다. 시승을 하는 곳이 테스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소든, 서킷이든, 공도이든 간에 한계선은 결코 한결같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험은 늘 기자들의 주변을 맴돕니다.
>
>2000년쯤인가, '카 앤 드라이버'지에서 돈 슈레더 씨의 부고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모델을 시승하다 일어난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자동차 전문기자의 사망사고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회복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는 'BBC 톱기어'의 리처드 해먼드 역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
>스스로 자초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건이 열악한(홍콩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솔직히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을 뿐, 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배나 동료, 후배기자들 중 심각한 사고를 내거나 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요. 꼭 기자로 시승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데, 한계선을 드나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국내 얘깁니다), 요즘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어쩌다 보니 이 길로 들어서서, 재미삼아 서만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의 본분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
>아직까지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시승을 하고 기사를 쓰는 일을 계속 해 왔던 입장에서, 이역이지만 지척에서 벌어졌던 '동료' 기자의 안타까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은 저 자신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기사를 쓰는 도중에 문득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
>뒤늦게나마 삼가 바렐리 씨의 명복을 빕니다.
2007.02.23 22:34:20 (*.106.12.10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겁은 더 늘긴 하더군요..
꼭 전문시승가가 아니더라도 안전운전을 해야겠지요..
문제는 그 안전운전의 정도가 사람들 관념마다 다르다는..흠..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겁은 더 늘긴 하더군요..
꼭 전문시승가가 아니더라도 안전운전을 해야겠지요..
문제는 그 안전운전의 정도가 사람들 관념마다 다르다는..흠..
2007.02.24 02:38:17 (*.83.144.52)

차에 관심이 있다면, 직업이 아니라도 운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겁니다.
마스터님 말씀에 "운전에는 습관이 있어서는 안된다. 본인 실력에 만족하는 순간, 발전은 멈추게된다"라는 아주 정확한 정리가 기억에 남네요.
일러스트나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마스터님 말씀에 "운전에는 습관이 있어서는 안된다. 본인 실력에 만족하는 순간, 발전은 멈추게된다"라는 아주 정확한 정리가 기억에 남네요.
일러스트나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2007.02.24 08:27:19 (*.229.109.2)

공감가는 글입니다.
몇몇 드라이빙 이벤트의 전문 인스트럭터들도 정말 운전법이 다양해요. 일정구간 똑같은 랩을 뽑아내는 운전방식이 다양하긴 하지만, 운전에 대한 마인드 차이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예전에 테스트 드라이버였던 선배하나가, 시승시 비싼 외산차들로 사고내기 일쑤였는데.. 내가 보기엔, 성격이 덜렁거리고 급합디다. 동승자에게 뭔가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하고요.. 차를 아는 사람은, 운전자가 몰아붙히는 상황에 포스를 느끼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보여줄수있다는 여유로운 모습에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
몇몇 드라이빙 이벤트의 전문 인스트럭터들도 정말 운전법이 다양해요. 일정구간 똑같은 랩을 뽑아내는 운전방식이 다양하긴 하지만, 운전에 대한 마인드 차이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예전에 테스트 드라이버였던 선배하나가, 시승시 비싼 외산차들로 사고내기 일쑤였는데.. 내가 보기엔, 성격이 덜렁거리고 급합디다. 동승자에게 뭔가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하고요.. 차를 아는 사람은, 운전자가 몰아붙히는 상황에 포스를 느끼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보여줄수있다는 여유로운 모습에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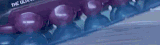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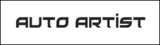

또 차의 주행 캐릭터가 비슷해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에도 역시..
예전 기자시절, 오프로드를 다니게 되면 브랜드별로 기능상/성능상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길 차체및 인체의 손상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 메이커 저 메이커에서 HDC나 Hill Assist 같은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던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런 장비들을 내놓고 '오프로드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모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테스트'라는 관점에서는 통과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시장', '고객', '브랜드'라는 것이 더해지면 아주 모호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방법이 어려워지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배워야 할 일, 알아야 할 일, 자제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긴장을 풀지 않고 열정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주변을 둘러보면 참 아직 많이 있구나는 생각이 들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