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글 수 27,332
안녕하세요, 류청희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오펠 언론대상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디에고와 팜 스프링즈에 다녀왔습니다. 30일에는 오펠 아스트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31일에는 국내에 GM대우 G2X로 들어올 오펠 GT를 시승했습니다.
여느 언론대상 이벤트들이 그렇듯, 전반적인 행사는 무척 활기차게 진행되었지만, 31일 아침 오펠 GT 브리핑의 말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사에 앞서 참석한 프랑스 기자 미셸 바렐리 씨가 그 전 주말 시승에 나섰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주최측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는 산악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길에서 벗어나 3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년에도 여러 메이커가 세계 각국 자동차 전문기자들을 불러 수십 차례의 새차 이벤트를 펼칩니다. 물론 시승은 빼놓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도 시승은 자동차 전문기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전문기자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운전실력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승을 하고 시승기를 써야 하는 기자는 그래야 합니다.
장기 시승을 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차의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수단을 써서 차를 테스트해 봅니다. 지면, 전파, 화면을 통해 나가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로 얻어낸 정보를 다 풀어놓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기사를 읽고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종종 기자들은 한계선을 들락날락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시승환경이 똑같지 않고 시승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계선 역시 들쭉날쭉하기 마련입니다. 시승을 하는 곳이 테스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소든, 서킷이든, 공도이든 간에 한계선은 결코 한결같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험은 늘 기자들의 주변을 맴돕니다.
2000년쯤인가, '카 앤 드라이버'지에서 돈 슈레더 씨의 부고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모델을 시승하다 일어난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자동차 전문기자의 사망사고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회복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는 'BBC 톱기어'의 리처드 해먼드 역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건이 열악한(홍콩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솔직히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을 뿐, 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배나 동료, 후배기자들 중 심각한 사고를 내거나 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요. 꼭 기자로 시승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데, 한계선을 드나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국내 얘깁니다), 요즘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어쩌다 보니 이 길로 들어서서, 재미삼아 서만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의 본분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시승을 하고 기사를 쓰는 일을 계속 해 왔던 입장에서, 이역이지만 지척에서 벌어졌던 '동료' 기자의 안타까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은 저 자신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기사를 쓰는 도중에 문득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뒤늦게나마 삼가 바렐리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오펠 언론대상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디에고와 팜 스프링즈에 다녀왔습니다. 30일에는 오펠 아스트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31일에는 국내에 GM대우 G2X로 들어올 오펠 GT를 시승했습니다.
여느 언론대상 이벤트들이 그렇듯, 전반적인 행사는 무척 활기차게 진행되었지만, 31일 아침 오펠 GT 브리핑의 말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사에 앞서 참석한 프랑스 기자 미셸 바렐리 씨가 그 전 주말 시승에 나섰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주최측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는 산악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길에서 벗어나 3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년에도 여러 메이커가 세계 각국 자동차 전문기자들을 불러 수십 차례의 새차 이벤트를 펼칩니다. 물론 시승은 빼놓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도 시승은 자동차 전문기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전문기자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운전실력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승을 하고 시승기를 써야 하는 기자는 그래야 합니다.
장기 시승을 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차의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수단을 써서 차를 테스트해 봅니다. 지면, 전파, 화면을 통해 나가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로 얻어낸 정보를 다 풀어놓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기사를 읽고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종종 기자들은 한계선을 들락날락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시승환경이 똑같지 않고 시승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계선 역시 들쭉날쭉하기 마련입니다. 시승을 하는 곳이 테스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소든, 서킷이든, 공도이든 간에 한계선은 결코 한결같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험은 늘 기자들의 주변을 맴돕니다.
2000년쯤인가, '카 앤 드라이버'지에서 돈 슈레더 씨의 부고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모델을 시승하다 일어난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자동차 전문기자의 사망사고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회복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는 'BBC 톱기어'의 리처드 해먼드 역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건이 열악한(홍콩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솔직히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을 뿐, 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배나 동료, 후배기자들 중 심각한 사고를 내거나 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요. 꼭 기자로 시승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데, 한계선을 드나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국내 얘깁니다), 요즘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어쩌다 보니 이 길로 들어서서, 재미삼아 서만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의 본분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시승을 하고 기사를 쓰는 일을 계속 해 왔던 입장에서, 이역이지만 지척에서 벌어졌던 '동료' 기자의 안타까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은 저 자신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기사를 쓰는 도중에 문득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뒤늦게나마 삼가 바렐리 씨의 명복을 빕니다.
2007.02.23 02:27:13 (*.141.137.107)
예전에 복스홀 VX220 시승회에서 4명의 기자분들이 부상을 당했단 소식을 들은게 떠오르네요. 멋진 사진과 날카로운 평가 뒤에 숨은 기자분들의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분들 사이에 낀 17살난 머리나쁘고 핸들 한번 못 잡아본 고등학생이 주제에 의견이란 걸 보냅니다. 좋은 글에 감사드리고, 저널리스트의 본분에 충실하다 운명을 달리하신 바렐리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분들 사이에 낀 17살난 머리나쁘고 핸들 한번 못 잡아본 고등학생이 주제에 의견이란 걸 보냅니다. 좋은 글에 감사드리고, 저널리스트의 본분에 충실하다 운명을 달리하신 바렐리씨의 명복을 빕니다.
2007.02.23 08:39:11 (*.243.36.21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바렐리씨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류청희님처럼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전문지 기자분들꼐도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시승기 잘 읽고 있어요~^
저도 바렐리씨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류청희님처럼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전문지 기자분들꼐도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시승기 잘 읽고 있어요~^
2007.02.23 12:40:45 (*.219.0.69)

위험을 무릅쓰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동차라는,
1.5톤의 포탄을 테스트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위험을 무릅쓰기 마련이지요. 열정으로 시작한 일은 열정이 시나브로 사그라질 때 제일 위험하지요.
마감 잘 하시고, 담달 초에 봅시당.
어느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동차라는,
1.5톤의 포탄을 테스트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위험을 무릅쓰기 마련이지요. 열정으로 시작한 일은 열정이 시나브로 사그라질 때 제일 위험하지요.
마감 잘 하시고, 담달 초에 봅시당.
2007.02.23 13:04:18 (*.35.74.87)

시승할때마다... 어디 넓고 장애물 없는 서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도로에서는 적당히(자세제어ON) 서킷(OFF)에서는 밟고... 근데 오펠 GT(터보 260마력짜리...) 어떴던가요?
2007.02.23 13:55:35 (*.78.178.216)

이 글을 보고 시승기를 위해서 위험을 무릎쓰고 멋진 기사를 써주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네요...
테드에도 기자님들이 활동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항상 안전에 주의 해주세요~
기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네요...
테드에도 기자님들이 활동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항상 안전에 주의 해주세요~
2007.02.23 14:26:15 (*.73.8.239)

류청희 님, 혹시 자동차 생활 1월호 부록으로 나온 자동차 용어 백과의 저자 아니신지요?
AWD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핵심을 잘 짚어 주셔서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내키지 않을 때에도 운전대를 잡아야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그러하면 빈도는 점점 높아질테고 위험성도 커지겠지요.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AWD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핵심을 잘 짚어 주셔서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내키지 않을 때에도 운전대를 잡아야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그러하면 빈도는 점점 높아질테고 위험성도 커지겠지요.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07.02.23 15:33:33 (*.145.162.179)

무얼 하던 (레이스를 하건 테스트드라이브를 하건 취재를 위한 시승을 하건... )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보기에는 재미있지만) 5th Gear 나 Top Gear 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체의 기자분들도 그렇고 일반소비자의 사용영역의 Feeling 을 더 중시하여 평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고나기 직전에 겪음직한 상황을 많이 연출하며 시승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스킬이 있고 또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소비자들은 매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알아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아내곤 합니다.) 매체를 소비하는 다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프레스 관련의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승차를 보면 탄내나는 클러치와 사이드월이 많이 마모된 타이어를 보며 한숨이 나올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정도 상황을 연출하면서 드라이버가 릴렉스하고 오감을 동원해 차를 느낄만한 여유가 있었을까..?' 싶은 거에요. '그정도로 경험이 많은 드라이버라면 이렇게 사이드월이 많이 손상되게 운전하지 않고도 높은 속도로 코너를 크리어할 수 있을텐데.. ' 싶은거죠. 공로에서 긴장을 바짝하고 한계를 넘나드는 운전을 할 때 충분히 차를 평가할만큼 릴렉스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그냥 '스릴 넘치는 한계운전'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물며 생명과 바꿀 정도의 의미라고는 ...
청희씨도 안전운전하시길..
그럴만한 스킬이 있고 또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소비자들은 매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알아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아내곤 합니다.) 매체를 소비하는 다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프레스 관련의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승차를 보면 탄내나는 클러치와 사이드월이 많이 마모된 타이어를 보며 한숨이 나올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정도 상황을 연출하면서 드라이버가 릴렉스하고 오감을 동원해 차를 느낄만한 여유가 있었을까..?' 싶은 거에요. '그정도로 경험이 많은 드라이버라면 이렇게 사이드월이 많이 손상되게 운전하지 않고도 높은 속도로 코너를 크리어할 수 있을텐데.. ' 싶은거죠. 공로에서 긴장을 바짝하고 한계를 넘나드는 운전을 할 때 충분히 차를 평가할만큼 릴렉스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그냥 '스릴 넘치는 한계운전'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물며 생명과 바꿀 정도의 의미라고는 ...
청희씨도 안전운전하시길..
2007.02.23 16:28:19 (*.155.230.238)

류청희 님의 소책자 제목은 '알기쉬운 자동차 용어풀이'로군요.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
좋은 책입니다.
이종권 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내용을 위에 썼다가 삭제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올리셨네요.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승용차는 일상 주행시의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능 이상으로).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핸들링이나 성능과 더불어 일상 주행에서 차량의 느낌과 편의성 등도 함께 다뤄야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잘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는 레이싱 카가 아니기 때문에 성능 이외에도 비중있게 다뤄야할 가치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읽고 나서 감탄해마지않는 글도 많지만 다 읽고 난 후에도 '그런데 이 차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 같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보는 탑기어나 fifth gear도 성능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며, 이런 프로그램들이 알게 모르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성능 위주로 편집된 짧은 클립을 보는 경우가 많고, 진행자들이 무슨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지 못하니 당연히 마음 속에 남는 것은 그 차량의 성능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적을 불문하고 잡지에서도 자극적인 정보로 독자를 유혹하는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추구해야할 가치는 성능만이 아닌데도 성능에서 뒤지면 당장 허접하고 부족한 차로 묘사됩니다.
어떤 차가 더 안락하고 편했느냐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능도 차량을 평가하는 기준이지만, 안전성과 주행감성, 편의성, 제작 목적과 특징, 메이커 철학 등 등을 함께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구입할 때 브로셔의 정보만을 참고하기 보다는 직접 시승해보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타기 전에 차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리뷰가 많이 나온다면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
좋은 책입니다.
이종권 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내용을 위에 썼다가 삭제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올리셨네요.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승용차는 일상 주행시의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능 이상으로).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핸들링이나 성능과 더불어 일상 주행에서 차량의 느낌과 편의성 등도 함께 다뤄야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잘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는 레이싱 카가 아니기 때문에 성능 이외에도 비중있게 다뤄야할 가치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읽고 나서 감탄해마지않는 글도 많지만 다 읽고 난 후에도 '그런데 이 차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 같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보는 탑기어나 fifth gear도 성능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며, 이런 프로그램들이 알게 모르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성능 위주로 편집된 짧은 클립을 보는 경우가 많고, 진행자들이 무슨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지 못하니 당연히 마음 속에 남는 것은 그 차량의 성능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적을 불문하고 잡지에서도 자극적인 정보로 독자를 유혹하는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추구해야할 가치는 성능만이 아닌데도 성능에서 뒤지면 당장 허접하고 부족한 차로 묘사됩니다.
어떤 차가 더 안락하고 편했느냐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능도 차량을 평가하는 기준이지만, 안전성과 주행감성, 편의성, 제작 목적과 특징, 메이커 철학 등 등을 함께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구입할 때 브로셔의 정보만을 참고하기 보다는 직접 시승해보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타기 전에 차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리뷰가 많이 나온다면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7.02.23 19:46:27 (*.114.62.68)

저널리스트의 사망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셨지만 열정을 가지고 한가지 일에 매진하는 심도있는 탐구정신만큼은 늘 높이사고 싶습니다.
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셨지만 열정을 가지고 한가지 일에 매진하는 심도있는 탐구정신만큼은 늘 높이사고 싶습니다.
2007.02.23 21:21:33 (*.35.74.68)

여러분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평소 받아보는 독자엽서보다 훨씬 뿌듯하네요. 이경석 님께는... 사실 AWD 부분은 저도 쓰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작여건의 한계도 있고,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2년 동안 연재한 글을 묶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손보아 종합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을 내 놓고도 '증보판'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지요. 부족한 점 많은데도 좋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종권 님께는... 대충은 아시겠지만 잡지는 글과 사진이 모두 비중이 크다보니 시승과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연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된 사진이 지면에 꼭 실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끔 시승차를 받고는 비슷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저널리즘의 현실이고, 과도기에 겪는 부작용이라고 너그러이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 댓글 달아주신 다른 분들의 격려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7.02.23 22:14:26 (*.219.0.69)

차를 타볼 짧은 시간이라는 변명이 유일하겠군요.
일주일 정도만 되면,
회사에서 집을 오고가는 홈코스(!!!)에서 일상적인 주행느낌과 극한 주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겠지요.
일주일 정도만 되면,
회사에서 집을 오고가는 홈코스(!!!)에서 일상적인 주행느낌과 극한 주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겠지요.
2007.02.24 00:06:58 (*.51.167.61)
짧은 시승시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희님 말씀처럼 넉넉하게 시승할수 있다면 훨신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기자분들의 위험도 줄어들텐데요.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희님 말씀처럼 넉넉하게 시승할수 있다면 훨신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기자분들의 위험도 줄어들텐데요.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7.02.24 08:37:07 (*.229.109.2)

신선한 글이네요..
'많이 아는것과 실행하는것'의 사이에 괴리가 많은경우가 있습니다. 톸쇼에서 정말 멋진 가치관과 철학을 풀어놓는 가수의 '노래'가 유치한 경우나.. 재치있고 끼가 넘치는 유머를 발휘하는 탤런트가 만년 조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처럼..차에 있어 이론적인 박식함도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짓게 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이종권님의 리플내용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운전을 카타르시스의 수단으로 생각하는게 제일 위험한거 같아요. 누구든 말이죠..
'많이 아는것과 실행하는것'의 사이에 괴리가 많은경우가 있습니다. 톸쇼에서 정말 멋진 가치관과 철학을 풀어놓는 가수의 '노래'가 유치한 경우나.. 재치있고 끼가 넘치는 유머를 발휘하는 탤런트가 만년 조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처럼..차에 있어 이론적인 박식함도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짓게 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이종권님의 리플내용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운전을 카타르시스의 수단으로 생각하는게 제일 위험한거 같아요. 누구든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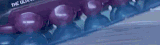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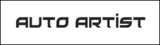

신형 크로스 오버 모델로서, 눈이 약 15센티 정도 쌓인 넓은 공터에서 눈길 주행 장면을 촬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일단 몸을 피하고 나니, 15분만에 전소가 되어버리더군요..
역시 다양한 차들에 타야하는 직업에 있다 보니 류청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승기간이 1주일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들락 날락 하는 경우가 있지만, 1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위험 없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튼.. 저역시 바렐리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