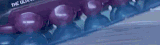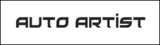글 수 147
2011상하이오토쇼4신-양극화 심해지는 중국 자동차산업
2011 상하이오토쇼가 4월 19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세계 최대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메이저 업체들의 야심이 그대로 드러난 행사였다. 오토차이나(상하이오토쇼와 베이징오토쇼를 통칭해서 그렇게 칭한다.)는 과거에는 쇼장의 규모에 비해 글로벌 차원에서 눈길을 끌만한 뉴 모델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월드 프리미어’들의 데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글 사진/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하루 차이로 겹치는 뉴욕모터쇼 때문에 상하이오토쇼까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였다. 메이저업체들의 톱 경영진들은 대부분 상하이를 찾았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 등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크리스 뱅들까지도 상하이를 찾았다. 세계적인 자동차 미디어들의 베테랑 기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전날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던 쇼장은 당일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가방을 레이저에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행사는 있었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쇼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동안 베이징과 상하이오토쇼에 올 때마다 힘들게 했던 것들이 해소되어 하루를 시작하기가 한결 수월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전시장은 E1부터 E7, W1부터 W5, 그리고 N5 등 모두 13개에 달한다. 그처럼 많은 전시장에 들어선 메이커들의 프레스컨퍼런스를 하루에 모두 소화하려는 점 때문에 정상적인 취재는 불가능했다. 특별한 규칙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 홀 저 홀에서 메이저업체들끼는 물론이고 중국 메이커들끼리도 중첩된 이벤트가 열렸다. 그것도 아침 9시에 시작해 오후 3시경에 모두 끝나도록 되어 있었다. 디트로이트 등 국제적인 모터쇼는 빠르게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다.
프레스데이 첫 날 두드러진 것은 양극화의 심화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는 그 많은 중국 메이커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메이저업체들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글로벌 메이저업체들도 그 경쟁 양상이 달랐다. 크게는 글로벌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가 다르다. 양산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 역시 뚜렷하다.
모터쇼장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은 GM과 폭스바겐, 현대가 각각 6개씩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메이커는 없다. 당장에는 판매대수 때문에 이들 양산 브랜드들의 힘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쇼장에서도 그런 특성은 그대로다. 물론 이것을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SAIC(상하이자동차)과 BAIC(베이징자동차) 등의 경쟁 양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수년 전에 비해 중국 자체 브랜드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이 주목을 끌었다. 현재 중국 내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동차회사수는 132개. 실제로는 2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들 중에서 모터쇼장에 얼굴을 내 밀 수 있는 메이커는 그나마 해외 업체들과 자본 제휴를 통해 합작회사를 운영해 온 메이커들이었다. 부스의 규모도 커졌지만 그들이 전시한 모델들의 수준도 높아졌다.
이미 앞서 설명을 했지만 중국의 자동차시장 점유율 순위로는 상하이자동차가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제일자동차, 둥펑자동차, 창안자동차, 베이징자동차, 광저우자동차 등이다. 토종 기업인 체리자동차와 BYD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위에따 그룹과 화천자동차도 이 순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영기업이다. 중국 내 기업 서열로는 상하이자동차가 24위, 제일자동차가 28위, 둥펑자동차가 30위 등이다. 해외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순위에서는 GM이 1위이고 폭스바겐, 현대기아, 토요타 순이다.
상하이/제일/둥펑/창안/베이징/광저우 등 국영기업과 토종기업 체리와 지리, 그리고 BYD 등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브랜드들은 별도의 전시장을 또 마련하고 있다. 그들은 합작을 통해 생산하는 모델은 물론이고 그들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들을 모두 동원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지리와 체리자동차는 여전히 ‘짝퉁 천국’이라는 별명을 과시라도 하듯이 어디에서 본 듯한 모델들로 부스를 채우고 있었다.
여기에 리판자동차, 海馬자동차, 東南자동차, 황하이자동차를 비롯한 중소 메이커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200개가 넘은 자동차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그들 자국 메이커들은 커가는 시장에 반비례해 존재감은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쇼장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최측의 기준강화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프레스데이날 입장한 현지 언론들은 자국 메이커들보다 해외 브랜드 부스에만 몰렸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GM과 포드, 토요타/닛산/혼다 등의 프레스컨퍼런스는 발 디딜틈이 없어 ‘인산 인해’라는 말을 실감케 했지만 중국 토종 브랜드들의 부스는 촬영하기에도 한결 용이했다.
자동차메이커들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인수합병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브랜드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발전하는 시장에서는 이합집산에 의해 메이커수가 줄어 들었다.
중국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다. 메이저업체들의 규모는 커지지만 군소업체들의 수는 끝없이 증가한다. 자동차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메이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나는 것은 중국만의 특징이다. 자동차산업을 진입이 쉬운 산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오토바이의 전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기법까지 동원해 저가의 제품들을 손쉽게 만들어 팔고 있다.
더불어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도 새내기 업체들의 투자를 자극한다. 알다시피 현 시점에서의 전기자동차산업은 진입장벽이 낮다.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를 개조하는 차원까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뛰어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바퀴를 달고 달릴 수만 있다면 팔리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해 해외 메이커들과 합작으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왔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기술과 시장 개방의 교환의 당초 목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2011 상하이오토쇼가 4월 19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세계 최대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메이저 업체들의 야심이 그대로 드러난 행사였다. 오토차이나(상하이오토쇼와 베이징오토쇼를 통칭해서 그렇게 칭한다.)는 과거에는 쇼장의 규모에 비해 글로벌 차원에서 눈길을 끌만한 뉴 모델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월드 프리미어’들의 데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글 사진/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하루 차이로 겹치는 뉴욕모터쇼 때문에 상하이오토쇼까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였다. 메이저업체들의 톱 경영진들은 대부분 상하이를 찾았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 등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크리스 뱅들까지도 상하이를 찾았다. 세계적인 자동차 미디어들의 베테랑 기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전날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던 쇼장은 당일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가방을 레이저에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행사는 있었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쇼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동안 베이징과 상하이오토쇼에 올 때마다 힘들게 했던 것들이 해소되어 하루를 시작하기가 한결 수월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전시장은 E1부터 E7, W1부터 W5, 그리고 N5 등 모두 13개에 달한다. 그처럼 많은 전시장에 들어선 메이커들의 프레스컨퍼런스를 하루에 모두 소화하려는 점 때문에 정상적인 취재는 불가능했다. 특별한 규칙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 홀 저 홀에서 메이저업체들끼는 물론이고 중국 메이커들끼리도 중첩된 이벤트가 열렸다. 그것도 아침 9시에 시작해 오후 3시경에 모두 끝나도록 되어 있었다. 디트로이트 등 국제적인 모터쇼는 빠르게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다.

프레스데이 첫 날 두드러진 것은 양극화의 심화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는 그 많은 중국 메이커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메이저업체들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글로벌 메이저업체들도 그 경쟁 양상이 달랐다. 크게는 글로벌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가 다르다. 양산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 역시 뚜렷하다.
모터쇼장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은 GM과 폭스바겐, 현대가 각각 6개씩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메이커는 없다. 당장에는 판매대수 때문에 이들 양산 브랜드들의 힘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쇼장에서도 그런 특성은 그대로다. 물론 이것을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SAIC(상하이자동차)과 BAIC(베이징자동차) 등의 경쟁 양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수년 전에 비해 중국 자체 브랜드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이 주목을 끌었다. 현재 중국 내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동차회사수는 132개. 실제로는 2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들 중에서 모터쇼장에 얼굴을 내 밀 수 있는 메이커는 그나마 해외 업체들과 자본 제휴를 통해 합작회사를 운영해 온 메이커들이었다. 부스의 규모도 커졌지만 그들이 전시한 모델들의 수준도 높아졌다.

이미 앞서 설명을 했지만 중국의 자동차시장 점유율 순위로는 상하이자동차가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제일자동차, 둥펑자동차, 창안자동차, 베이징자동차, 광저우자동차 등이다. 토종 기업인 체리자동차와 BYD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위에따 그룹과 화천자동차도 이 순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영기업이다. 중국 내 기업 서열로는 상하이자동차가 24위, 제일자동차가 28위, 둥펑자동차가 30위 등이다. 해외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순위에서는 GM이 1위이고 폭스바겐, 현대기아, 토요타 순이다.
상하이/제일/둥펑/창안/베이징/광저우 등 국영기업과 토종기업 체리와 지리, 그리고 BYD 등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브랜드들은 별도의 전시장을 또 마련하고 있다. 그들은 합작을 통해 생산하는 모델은 물론이고 그들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들을 모두 동원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지리와 체리자동차는 여전히 ‘짝퉁 천국’이라는 별명을 과시라도 하듯이 어디에서 본 듯한 모델들로 부스를 채우고 있었다.
여기에 리판자동차, 海馬자동차, 東南자동차, 황하이자동차를 비롯한 중소 메이커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200개가 넘은 자동차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그들 자국 메이커들은 커가는 시장에 반비례해 존재감은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쇼장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최측의 기준강화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프레스데이날 입장한 현지 언론들은 자국 메이커들보다 해외 브랜드 부스에만 몰렸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GM과 포드, 토요타/닛산/혼다 등의 프레스컨퍼런스는 발 디딜틈이 없어 ‘인산 인해’라는 말을 실감케 했지만 중국 토종 브랜드들의 부스는 촬영하기에도 한결 용이했다.
자동차메이커들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인수합병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브랜드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발전하는 시장에서는 이합집산에 의해 메이커수가 줄어 들었다.
중국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다. 메이저업체들의 규모는 커지지만 군소업체들의 수는 끝없이 증가한다. 자동차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메이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나는 것은 중국만의 특징이다. 자동차산업을 진입이 쉬운 산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오토바이의 전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기법까지 동원해 저가의 제품들을 손쉽게 만들어 팔고 있다.

더불어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도 새내기 업체들의 투자를 자극한다. 알다시피 현 시점에서의 전기자동차산업은 진입장벽이 낮다.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를 개조하는 차원까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뛰어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바퀴를 달고 달릴 수만 있다면 팔리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해 해외 메이커들과 합작으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왔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기술과 시장 개방의 교환의 당초 목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