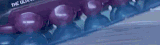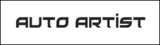글 수 147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브랜드의 힘 입증
다시 만나는 C클래스의 느낌이 새롭다. 4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D세그먼트 시장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스포츠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공격적인 라인을 사용한 C클래스의 변신은 당연하다고 여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딘지 당시의 E클래스의 ‘엘레강스’한 스타일링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과 달라 메르세데스의 방향성에 대해 아쉽기도 했었다. 일부 평론가와 자동차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혹평을 하는 이도 있었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그러나 지금 보는 신세데 메르세데스 시리즈들은 여전히 메르세데스만의 컬러를 풍기고 있다. 3포인티드 스타를 중심으로 한 가로 바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니더라도 사용된 선과 면의 조합은 다른 브랜드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선이 굵다는 표현이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125년 동안 쌓아 온 ‘명품 브랜드’의 힘인가 보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는 사람의 욕구를 일곱 가지로 정의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유와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지식의 욕구, 심미욕,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정신적 욕구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정신적인 소비라고 한다. 정신적인 소비는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자산이다. 이런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을 정신경제 혹은 명예경제라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기에 속한다. 프리미엄 브랜드 하나를 만드는 데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명품으로 분류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범접할 수 없는 혈통을 갖고 있다. 통상적인 가치를 넘어선 예술적 경지의 고급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프리미엄 브랜드, 명품 등으로 치부한다. 그 가치는 쌓기만 해서는 평가가 지속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브랜드 가치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는 패션 브랜드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
양산 브랜드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프리미엄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매출량이 아니라 가격을 말한다. 아니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이다. 토요타와 GM, 현대기아차가 규모면에서는 메르세데스나 BMW, 아우디 등보다 월등히 많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들 양산 브랜드에 대해 프리미엄 브랜드와 같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가격이 비싼 만큼 그에 상응하는 브랜드력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능을 끊임 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여전히 확고한 그들만의 입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한 끊임없는 발전의 결과다.
메르세데스는 선대 C클래스에서부터 성격을 스포츠 세단 지향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 현행 4세대 C클래스에서는 더욱 그것을 강조했다. 고성능 디비전인 AMG를 전면에 내 세우며 이미 본격적인 성격의 변화를 예고했었다. 컴팩트카이면서 브랜드의 성격이 지나치게 럭셔리 프리미엄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C클래스에 변화를 준 것이다. 포인트는 ‘주행성의 강조’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 D세그먼트의 모범으로서의 차만들기를 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카리스마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가고 있는데 그런 조류를 리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다.
C클래스가 메르세데스 라인업에 등장한 것은 1983년으로 ‘베이비 벤츠’를 표방하며 등장한 프로젝트명 W201의 190시리즈가 그 시작이다. 그로부터10년이 지난 1993년 풀 모델 체인지를 해W202의 C클래스로 진화했고 다시 2000년 4월에 W203 3세대 모델로 발전해왔다. C클래스라는 차명으로는 3세대에 해당하지만 그 뿌리부터 따지면 4세대이다.
(2011 메르세데스 벤츠 C200 CGi 블루이피션시 시승기 중에서)
다시 만나는 C클래스의 느낌이 새롭다. 4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D세그먼트 시장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스포츠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공격적인 라인을 사용한 C클래스의 변신은 당연하다고 여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딘지 당시의 E클래스의 ‘엘레강스’한 스타일링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과 달라 메르세데스의 방향성에 대해 아쉽기도 했었다. 일부 평론가와 자동차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혹평을 하는 이도 있었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그러나 지금 보는 신세데 메르세데스 시리즈들은 여전히 메르세데스만의 컬러를 풍기고 있다. 3포인티드 스타를 중심으로 한 가로 바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니더라도 사용된 선과 면의 조합은 다른 브랜드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선이 굵다는 표현이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125년 동안 쌓아 온 ‘명품 브랜드’의 힘인가 보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는 사람의 욕구를 일곱 가지로 정의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유와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지식의 욕구, 심미욕,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정신적 욕구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정신적인 소비라고 한다. 정신적인 소비는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자산이다. 이런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을 정신경제 혹은 명예경제라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기에 속한다. 프리미엄 브랜드 하나를 만드는 데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명품으로 분류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범접할 수 없는 혈통을 갖고 있다. 통상적인 가치를 넘어선 예술적 경지의 고급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프리미엄 브랜드, 명품 등으로 치부한다. 그 가치는 쌓기만 해서는 평가가 지속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브랜드 가치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는 패션 브랜드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
양산 브랜드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프리미엄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매출량이 아니라 가격을 말한다. 아니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이다. 토요타와 GM, 현대기아차가 규모면에서는 메르세데스나 BMW, 아우디 등보다 월등히 많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들 양산 브랜드에 대해 프리미엄 브랜드와 같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가격이 비싼 만큼 그에 상응하는 브랜드력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능을 끊임 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여전히 확고한 그들만의 입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한 끊임없는 발전의 결과다.
메르세데스는 선대 C클래스에서부터 성격을 스포츠 세단 지향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 현행 4세대 C클래스에서는 더욱 그것을 강조했다. 고성능 디비전인 AMG를 전면에 내 세우며 이미 본격적인 성격의 변화를 예고했었다. 컴팩트카이면서 브랜드의 성격이 지나치게 럭셔리 프리미엄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C클래스에 변화를 준 것이다. 포인트는 ‘주행성의 강조’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 D세그먼트의 모범으로서의 차만들기를 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카리스마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가고 있는데 그런 조류를 리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다.
C클래스가 메르세데스 라인업에 등장한 것은 1983년으로 ‘베이비 벤츠’를 표방하며 등장한 프로젝트명 W201의 190시리즈가 그 시작이다. 그로부터10년이 지난 1993년 풀 모델 체인지를 해W202의 C클래스로 진화했고 다시 2000년 4월에 W203 3세대 모델로 발전해왔다. C클래스라는 차명으로는 3세대에 해당하지만 그 뿌리부터 따지면 4세대이다.
(2011 메르세데스 벤츠 C200 CGi 블루이피션시 시승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