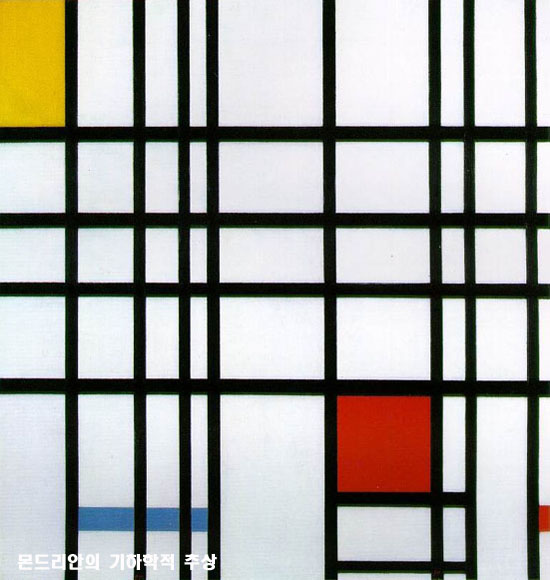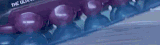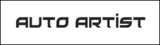글 수 125
아우디의 신형 A6가 국내에 들어왔다. 사실 아우디가 내놓는 신형 차량의 차체 디자인은 진화(進化)라는 말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것은 기능을 중시하는 독일의 디자인이 가진 특징이기도 하지만, 단지 기능만을 추구하는 무미건조한 디자인이 아니라, ‘차가움의 미학(cool elegance)’이라는 별칭을 가진 독일 근대 디자인의 이미지가 묻어나는 디자인이다. 그런데 아우디는 그 미학 속에 브랜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역동성을 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