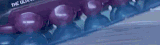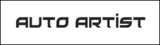글 수 125
디트로이트 출장에서는 에코부스트 엔진의 포드 모델 4대와 퓨전 하이브리드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야말로 간략한 시승이어서 맛만 보는 수준이었지만 안 타본 것보다는 낫다. 2.0 터보 사양의 익스플로러는 괜찮은 동력 성능을 발휘하고 퓨전 하이브리드는 꽤나 조용했다. 토러스 SHO는 움찔거리면서 발진하는 맛이 그만이다. 헨리 포드 박물관도 빠질 수 없는 코스다.
시승은 말 그대로 맛보기였다. 분식집에서 여고생들이 세트 메뉴 시켜서 조금씩 먹는 것처럼 한 차종에 한 바퀴씩만의 기회가 주어졌다. 간이 프루빙 그라운드의 길이도 4km 정도였고 그것도 선두차를 따라가는 방식이었다.
뉴 익스플로러는 엔트리 엔진이 구식의 4리터 V6 자연흡기에서 2리터 터보로 바뀐다. 배기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출력과 토크는 더 좋고 연비는 말할 것도 없다. 가속력을 비교한다면 초기 가속만 조금 비슷하고 그 이후에는 게임이 안 된다. 2리터 에코부스트 쪽이 훨씬 매끄럽고 부드럽게 가속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속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 4리터 V6와는 비교불가다. 뉴 익스플로러는 안팎 디자인이 좋고 세금 부담이 적은 2리터 배기량이어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다.

시승은 말 그대로 맛보기였다. 분식집에서 여고생들이 세트 메뉴 시켜서 조금씩 먹는 것처럼 한 차종에 한 바퀴씩만의 기회가 주어졌다. 간이 프루빙 그라운드의 길이도 4km 정도였고 그것도 선두차를 따라가는 방식이었다.



<iframe title="YouTube video player" height="390" src="http://www.youtube.com/embed/KICGzys8498" frameborder="0" width="550" allowfullscreen=""></iframe>
F-150에 타면 뵈는 게 없다. 시트 포지션이 높기도 하지만 거대한 보닛과 넓은 폭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시야가 탁 트인다. 운전도 편하다. 이날 타본 차 중 가장 편한 게 좀 아이러니하고 다른 기자들의 소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스트셀러의 저력이라고나 할까. 365마력의 V6 트윈 터보도 넉넉한 동력 성능을 제공한다. 커다란 덩치와 달리 저속에서는 제법 민첩하게 움직인다.

뉴 익스플로러는 엔트리 엔진이 구식의 4리터 V6 자연흡기에서 2리터 터보로 바뀐다. 배기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출력과 토크는 더 좋고 연비는 말할 것도 없다. 가속력을 비교한다면 초기 가속만 조금 비슷하고 그 이후에는 게임이 안 된다. 2리터 에코부스트 쪽이 훨씬 매끄럽고 부드럽게 가속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속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 4리터 V6와는 비교불가다. 뉴 익스플로러는 안팎 디자인이 좋고 세금 부담이 적은 2리터 배기량이어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