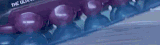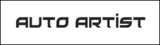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 공지 |
공지
글로벌 오토뉴스 신설과 관련하여...
|
122411 | 2010-06-11 |
| 1512 |
완성차뉴스
BBC 조사, 전기차 총 소유 비용 가솔린 보다 높아
|
1466 | 2010-08-31 |
|
BBC 조사, 전기차 총 소유 비용 가솔린 보다 높아 BBC에 따르면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이 가솔린 모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쓰비시의 아이미브와 1.2리터 가솔린 엔진...
|
| 1511 |  |
완성차뉴스
10 파리 모터쇼-마쓰다 시나리 컨셉트
|
679 | 2010-08-31 |
|
10 파리 모터쇼-마쓰다 시나리 컨셉트 마쓰다는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 시나리 컨셉트를 최초 공개한다. 시나리 컨셉트는 마쓰다의 새 디자인 랭귀지가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다. 새 디자인 랭귀지는 코도로 불린다. 로렌스 반 덴...
|
| 1510 |  |
완성차뉴스
10 파리 모터쇼-시트로엥 뉴 DS4
|
1079 | 2010-08-31 |
|
10 파리 모터쇼-시트로엥 뉴 DS4 시트로엥은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 뉴 DS4를 최초 공개한다. DS4는 DS3에 이은 시트로엥 DS 라인업의 두 번째 모델. 스타일링과 소재, 편의 장비의 고급화로 C4와 차별화 된다. 판매는 내...
|
| 1509 |  |
완성차뉴스
볼보코리아, 뉴 C70 출시
|
933 | 2010-08-31 |
|
볼보코리아, 뉴 C70 출시 8월 30일, 기존 C70보다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 230 마력의 직렬 5기통 터보 엔진으로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선보여 스타일리쉬한 쿠페와 감각적인 컨버터블이 공존, 2in1 스...
|
| 1508 |
완성차뉴스
렉서스, 일본 시장 위해 스페인 디자이너 영입
|
1027 | 2010-08-31 |
|
렉서스, 일본 시장 위해 스페인 디자이너 영입 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브랜드의 일본 내 판매가 당초 목표치의 60%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뿌리지 내리지 못한 초기 단계에 볼 수 있는 ...
|
| 1507 |  |
완성차뉴스
알페온’ 신차발표회,인터넷생중계!
|
893 | 2010-08-31 |
|
‘알페온’ 신차발표회,인터넷생중계! - 8월31일(화) 12시(정오)부터40분동안웹사이트및트위터통해생중계 - 별도실시간채팅창마련,네티즌과즉석질의/응답실시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GM DAEWOO)가 31일제주도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에서열...
|
| 1506 |
완성차뉴스
르노삼성자동차, 어린이 교통안전 온라인 퀴즈대회 개최
|
836 | 2010-08-31 |
|
르노삼성자동차, 어린이 교통안전 온라인 퀴즈대회 개최 - 신학기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의 중요성 전파 - 우수한 성적 거둔 참가 어린이들 300명에게 푸짐한 선물 증정할 예정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
|
| 1505 |  |
완성차뉴스
스바루 서머 익스피리언스’ 시승행사 참가자 모집
|
989 | 2010-08-31 |
|
스바루 서머 익스피리언스’ 시승행사 참가자 모집 -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고객 시승행사 개최 - 온로드와 오프로드 2가지 코스로 구성된 테스트 드라이브와 테크니컬 트레이닝 세션 - 오...
|
 |
브랜드와 마케팅
SUV 전문 메이커 쌍용, 마힌드라와는 상생 가능할까.
|
720 | 2010-08-30 |
|
SUV 전문 메이커 쌍용, 마힌드라와는 상생 가능할까. 코란도 패밀리(Korando Family)라는 모델이 있었다. 당시 이 차를 시승하다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곤욕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코란도 패밀리는 흔히 말하는 ‘성냥갑’...
|
| 1503 |  |
칼럼
애프터 서비스 - 닮은 듯 다른 디자인, 패밀리룩 편
|
1279 | 2010-08-30 |
|
한 사람을 식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얼굴이라면 자동차 또한 전면부 디자인을 통해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쉽세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대표적인 프리미엄브랜드들은 패밀리룩이라는 자사 고유의 특징을 전모델 라인업에...
|
| 1502 |  |
Review & Preview
짚 4세대 그랜드 체로키
|
2620 | 2010-08-30 |
|
SUV의 선구자 짚 브랜드의 모델들은 치열한 경쟁을 어떤 식으로 해쳐 나갈까. 체로키(리버티)와 랭글러 등 같은 브랜드 내 뚜렷이 구분되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짚은 생각보다 많은 모델들이 포진해 있다. 커맨더, 컴패스...
|
| 1501 |  |
Hybrid & Clean diesel
영국 모간, 디젤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개발
 |
1580 | 2010-08-30 |
|
|
| 1500 |  |
Electric Cars
10 파리 모터쇼-메르세데스 A 클래스 E-셀
 |
1120 | 2010-08-30 |
|
|
| 1499 |  |
Electric Cars
베터 플레이스, 배터리 교환소 시범 운영 확대
 |
2026 | 2010-08-30 |
|
|
| 1498 |
Electric Cars
체리와 벤큐, 배터리 분리막 합작 생산
|
1274 | 2010-08-30 |
|
체리와 벤큐, 배터리 분리막 합작 생산 중국 체리자동차와 벤큐가 배터리 분리막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했다. 이 분리막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한 것으로 체리와 벤큐는 합작사의 지분 50%씩을 확보하게 된다. 두 회사의 ...
|
| 1497 |  |
모터스포츠
루벤스 바리첼로, F1 출전 300회
 |
1142 | 2010-08-30 |
|
|
| 1496 |  |
모터스포츠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 개최 기원 “M슈퍼콘서트”
 |
1050 | 2010-08-30 |
|
|
| 1495 |  |
BRICs News
베이징, 5년 내 자동차 보유 대수 2배 증가
 |
1240 | 2010-08-30 |
|
|
| 1494 |  |
부품&용품 뉴스
델파이, 아우디에 내비게이션 라디오 공급
 |
928 | 2010-08-30 |
|
|
| 1493 |  |
부품&용품 뉴스
현대모비스, 캠핑카로 떠나는 가족여행’ 이벤트 실시
 |
1830 | 2010-08-30 |
|
|
| 1492 |  |
완성차뉴스
10 파리 모터쇼-로터스 에보라 S
 |
773 | 2010-08-30 |
|
|
| 1491 |
완성차뉴스
7월 글로벌 신차 판매 6.5% 상승
|
693 | 2010-08-30 |
|
7월 글로벌 신차 판매 6.5% 상승 글로벌 신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 워즈 오토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신차 판매는 6.5% 증가에 그쳤다. 올해 들어 10% 이하로 떨어진 것은 7월이 처음이다. 7월 판매 610만대, 올해의 누적...
|
| 1490 |  |
완성차뉴스
브라부스, S 클래스 아이비즈니스 패키지 공개
 |
1292 | 2010-08-30 |
|
|
| 1489 |
완성차뉴스
토요타와 GM, 150만대 리콜
|
668 | 2010-08-30 |
|
토요타와 GM, 150만대 리콜 토요타와 GM이 150만대를 리콜한다. 이중 130만대는 2005~2008년 사이 제작된 카롤라와 매트릭스, 그리고 GM과 합작한 폰티악 바이브이다. 20만대는 캐나다에서 팔린 차량이다. 지난 3월, 토요타는 안전...
|
| 1488 |  |
완성차뉴스
포드, 5년 내 인도에 8개 신차종 투입
 |
3376 | 2010-08-30 |
|
|
| 1487 |
완성차뉴스
토요타 그룹, 7월 실적 사상 최고 기록
|
1941 | 2010-08-30 |
|
토요타 그룹, 7월 실적 사상 최고 기록 토요타자동차 그룹의 2010년 7월 생산 및 일본 내수 판매, 수출 실적 등이 발표됐다. 다이하츠와 히노중공업 등을 포함한 토요타 그룹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은 45.2%로 7월 기준으로는...
|
| 1486 |  |
완성차뉴스
GM 대우, 1사 1산 가꾸기 캠페인 개최
 |
2356 | 2010-08-30 |
|
|
| 1485 |  |
완성차뉴스
현대차,전국 12개 현대 백화점에서 신형 아반떼 전시
 |
3005 | 2010-08-30 |
|
|
| 1484 |
완성차뉴스
일본 자동차 8사 생산 증가세 지속
|
2690 | 2010-08-30 |
|
일본 자동차 8사 생산 증가세 지속 일본 자동차회사들의 자동차 생산 증가세가 그칠줄 모르고 있다. 일본 자동차 8사의 7월 생산 실적이 일본 내와 해외 생산 합계로 모두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동남 아시아 등 개발 도상국...
|
| 1483 |  |
완성차뉴스
아우디 A1, 생산용량 부족으로 미국과 중국 판매 못해
 |
3350 | 2010-08-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