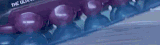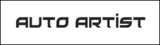Road Impression
글 수 330












부산에서 5시간을 기다린 끝에 RS6의 키를 손에 쥐었다.
이번이 엄밀히 네번째 만남이었다.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 논스톱 타임 트라이얼을 위해 서부산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시간이 새벽 1시 50분이었다.
부산에서 고급휘발류를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 칠곡으로 빠져나와 중간 주유를 한 후 원주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중부고속도로를 갈아탄 후 서울로 상경하는 코스였다.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자마다 풀쓰로틀을 가했다.
부산 대구간 경부고속도로는 구간 중 가장 위험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구간이다.
동대구까지 편도 2차선의 열악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160km/h이하로 트럭들 사이를 큰 기복없이 달리다가도 시야에 차량이 잠시 사라진 틈에 순간속도 270km/h를 가볍게 마크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2단 115km/h 3단 175km/h, 4단 245km/h, 5단 278km/h(5600rpm limit)를 마크한다.
3단과 4단의 거리가 먼 편이고, 5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A6 모델들보다 더 높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다.
6단이 아닌 5단 자동이지만 워낙 토크가 크기 때문에 단수와 단수사이의 거리가 먼 것이 고속주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중유리이기 때문에 초고속에서의 바람새는 듯한 소음이 전혀 없고 윈드실드에 부딪치는 풍량으로 속도를 가늠한다.
칠곡에서 주유를 마친 후 한맺힌 경부고속도로와 이별을 고하고, 나와 RS6의 사투가 펼쳐진다.
175km/h에서 4단으로 변속된 후 갑자기 낮아진 기어비에도 불구하고, 펀치가 대단하다. 1950rpm부터 플랫으로 터지는 57kg의 토크가 오르막과 내리막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 버린다.
속도 제한기가 작동하는 계기상 278km/h는 중앙 고속도로의 오르막에서도 쉽게 마크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에 한맺힌 450마력의 저승사자는 좀처럼 마주치기 힘든 적수를 찾아 초고속으로 밤공기를 가른다.
초고속에서 속도계를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계기판을 잠시 응시한 찰라에 계기판을 볼 당시 보이지 않았던 전방의 차량들이 RS6 앞으로 달려든다.
130km/h정도의 속도에서 급가속으로 차량들을 추월할 땐 마치 달리기할 때 앞서가는 사람의 어깨를 잡아 채면서 그 반동으로 튀어나갈 때의 느낌을 전해준다.
마치 앞서가는 차량의 뒷덜미를 잡아 낚아채 듯 재껴버린다.
8피스톤의 초강력 브레이크와 255/35.19 피렐리 P-Zero Rosso 타이어와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강하고 다루기 쉬운 제동력은 다른 아우디 모델의 그것과는 차원이 틀리다.
일단 조금 끈적끈적한 노멀 A6의 그것과 비교해 훨씬 명확하고, Fade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브레이크이다.
마치 자유낙하하는 속도계의 바늘이 실제의 차량 감속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고속에서의 급제동은 미친 황소처럼 날뛰는 V8 4.2트윈터보 엔진에겐 천적인지도 모른다.
중앙 고속도로를 다양한 차종으로 수차례 도전했었지만 이 도로 역시 RS6에겐 너무 작은 놀이터라 답답하게 느껴진다.
220마력 정도의 차로 풀쓰로틀로 거의 전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코스였는데, RS6로 차가 없는 중앙고속도로를 풀쓰로틀로 계속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코너가 완만해도 220km/h와 270km/h는 하늘과 땅차이이다.
즉 출력이 낮은 차로는 모르지만 RS6로 전속력으로 중앙고속도로의 코너를 클리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할 수 있다.
240km/h정도로도 돌 수 있을 것 같은 코너에서도 220km/h를 선택한 이유는 중앙분리대에 가려 시야확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달리고 싶고, 달릴 수 있지만 앞이 가려 쓰로틀에 발만대고 220km/h로 만족해야하는 코너가 의외로 많았다.
반면 우측 코너는 그보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260km/h로 완만한 코너를 달릴 땐 횡가속을 이기는 RS6의 강성과 콰트로의 호흡에 맘속으로 기립박수를 친다.
중앙고속도로의 짧지 않은 직선도 280km/h에 육박한 속도로 불과 몇 초면 끝나기 때문에 너무도 싱겁고, 가장 짜릿한 느낌은 터널을 278km/h로 리미트를 치며 달리다가 빠져나오면서 연결되는 약한 내리막 좌측 코너에 맞춰 속도를 230km/h로 맞추어 코너를 빠져나와 또다시 리미트를 치며, 달릴 때의 희열이란…
엔진오일 온도계의 눈금은 단한번도 90도 부근에서 움직이질 않을 정도로 엔진이 느끼는 피로도나 부담감은 리미트를 치면서 달리는 상황에서도 여유롭기만 했다.
조여진 서스펜션의 스트록이 극도로 짧고, 바운스에 민첩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고속코너에서 노면의 이음새에 튈 때도 안정감에 더 이상의 바람이 없다.
V8 4.2엔진의 밸런스는 완벽하다. 단지 고속으로 달리면서 느끼는 진동은 그 근원이 틀리다.
이 진동은 엔진에서 오는 것이 아닌 배기쪽에서 오는 진동이다.
양쪽 배기통에서 뿜어내는 야성적인 음색은 실내에 충분할 정도로 채워지고, 규칙적인 배기진동이 미세하게 운전자의 등줄기를 타고 어깨에까지 전달된다.
RS6의 Bi Zenon 헤드라이트는 A6 3.0콰트로의 것과 차이가 없고, 항상 느끼지만 광량이 풍부하여 초고속주행에 아주 만족하지만 가로등이 전혀 없는 고속도로를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직선을 달리다가도 전방에 나타나는 코너가 좌코너인지 우코너인지 착각할 때가 가끔 있다.
초반 1시간 30분을 전속력으로 밤을 새며 달리는 나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함께 집중력도 떨어져 240km/h이상을 유지하면서 달린다는 것이 힘들어졌다.
제천을 지나면서 속도를 줄여 190km/h로 크루징을 하며, RS6는 고요하게 C세그먼트 중형세단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편안하게 긴장을 풀며 RS6를 음미할 수 있었다.
일주일동안 5000km를 그것도 초고속으로 하루에도 리미트를 10수차례씩 치는 강행군에도 엔진은 미친듯이 레드존의 리미트를 부셔버릴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상승한다.
엔진의 토크분포가 1950rpm에서 최대 토크를 마크해 5500rpm까지 거의 플랫으로 그려지는 토크는 6500rpm에서도 토크의 곤두박질 없이 일관되게 밀어붙인다.
2500rpm에서 일차적으로 큰 폭발력을 보여주고, 4800rpm에서 좀 더 강하게 잡아당겨주는 느낌을 선사하는 RS6의 심장에 더 이상의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엔진 자체에 스포츠 아이덴티티와 운전성이 최고 정점에서 타협된 엔진이라는 것이다.
600마력을 디튠해서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블록과 헤드를 포함한 하드웨어의 강성은 코스워스에서 보장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RS6는 닭장같이 좁아터진 서킷에서 느끼는 차는 아니라는 것이 나의 주관이다.
포장이 좋고 길게 뻗은 차가 없는 고속주행로가 이차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내의 막히는 도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수퍼세단의 양면성이 RS6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test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