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 Impression
글 수 330























알파로메오는 그들의 특별한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는 대단한 노력, 혹은 알파로메오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 아이덴티티에 매려된 사람만이 오너가 될 수 있다.
독일인들은 특별히 알파로메오에 크게 매료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동안 만난 많은 독일인들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파로메오가 멋지다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능미와 실용미를 높게 평가하는 독일인들에게 골프 바리안트는 이뻐보이지만 알파로메오가 멋지게 다가오지 않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6년전 경험한 164S가 알파로메오와의 첫번째 만남이었고, 알파로메오의 V6 3.0리터 엔진은 겉으로 보기에도 스테인레스 인테이크로 멋지게 마무리되었을 뿐 아니라 엔진이 만드는 선율이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감성을 선사했었다.
지금도 그 독특한 사운드를 잊을 수가 없다.
메인트넌스는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할 정도로 알파로메오의 내구성은 악명이 높았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뚜렷하게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특이할만한 데이터를 접하진 못했다.
우연찮은 기회에 만난 159 스포츠 웨건은 1.9리터 터보 디젤 엔진으로 150마력이라는 제법 그럴듯한 출력을 만드는 차종이다.
스포티하고 잘빠진 외모이지만 뒤좌석 공간이 경쟁차종에 비해 그리 넓지 못한 단점도 있다.
시동을 걸 때 느껴지는 디젤 특유의 진동이 다소 크긴 하지만 엔진이 완전히 웜업이 끝난 상태에서의 질감은 제법 부드러운 편이다.
엔진이 완전히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회전수가 4000rpm을 넘기지 못하게 제한되는 기능은 처음에는 이 회전수 제한장치가 아예 4000rpm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장치로 착각했을 정도로 제법 운행을 해야 해제된다.
상당히 무거운 클러치와 절도가 있다기 보다는 좀 뻑뻑한 체인지레버에 묵직한 스티어링 휠은 알파로메오에 이미 매료되어 있는 매니어가 아닌 다음에는 분명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너무 얽메이다 보면 알파로메오를 깊이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1.9리터 디젤 엔진은 충분히 파워풀하고, 엔진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진다.
출력에 비해 그리 순간적인 토크 분출이 없고, 엔진의 회전 특성만 본다면 외모와 걸맞지 않게 젠틀한 상승을 보여준다.
6단 210km/h까지는 쉽게 올라가는 편이고, 회전한도 부근인 4000rpm을 넘기는 영역에서도 제법 부드러운 편이다.
패달의 위치가 독일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어색한 위치이기는 하지만 무거운 클러치에만 익숙할 수 있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제동력도 충분하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맘에 드는 것은 섀시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 코너를 도는 감각이 묵직한 스티어링 휠을 통해 상당히 정직하게 다가온다.
적당한 전장과 마치 운전석이 무게중심과 상당히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몸놀림이 경쾌하다.
고속으로 달릴 때의 감각 역시 상당히 세련되었고, 풍절음도 이 정도면 차의 기본 조립 완성도는 높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본차의 극진한 친절함은 이제 독일차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알파로메오에게는 여전히 이런 배려가 부족하다.
트렁크를 여는 법을 알기 위해 독일어 매뉴얼을 뒤져야할 정도로 빌어먹을 트렁크 스위치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나중에 우연히 찾은 위치가 지붕에 독서등 스위치에 섞여있는 트렁크 스위치를 발견했을 때는 내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운전중 독서등 스위치를 켜다가 자칫 트렁크 스위치를 건들어 열리기라도 하면 중간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다가 닫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트렁크 스위치는 연료탱크 스위치와 보통 비슷한 위치에 두고 운전석 도어나 운전자의 왼손이 닿기 편한 곳에 두는 것이 정석이다.
트렁크 스위치를 통해서 혹은 리모컨을 통해서 개폐를 한 후 테일게이트를 열 때 마땅히 견고하게 지지할 곳이 없어 범퍼와 테일 게이트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손가락을 구겨넣고 힘들게 열어야하며 손가락이 항상 아플 정도다.
기분이 드러울 수 밖에 없다.
손가락이 두꺼운 사람은 아예 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이태리 사람들은 희안한 위치에 설정해 놓은 트렁크 스위치나 개폐시의 불편함에 신경을 쓸만큼 쪼잔하지 않거나 아니면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이다.
내가 운전했던 차량이 가죽시트에 네비게이션까지 장착된 고사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트 히팅 장치가 없었던 것 역시 좀 이해하기 힘든 컴비네이션이었다.
시승차가 렌터카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이너스 옵션으로 이런 컴비네이션이 탄생했을 것 같지는 않다.
159와의 데이트는 솔직히 아주 즐거웠고, 분명 맘에 안드는 구석도 많았지만 약간만 넓은 아량으로 접근하면 아주 운전하기 좋고, 특별히 스포티한 주행감각이 일품인 차였다.
다만 알파로메오에 대한 선입견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입장에서 차의 가치를 섣불리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알파는 분명 멋진차이며, 그 존재감이 유독 강한 브랜드이지만 알파의 디자인과 철학에 매료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은 차다.
여전히 좀 더 검증이 되어야하는 브랜드이고, 알파로메오가 북미에 재상륙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되고, JD파워 리포트들이 흘러나올 때쯤이면 나 자신도 뭔가 제품의 내구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바디와 감성을 가진차가 캠리나 어코드를 판단하던 잣대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볼륨 브랜드로 성장하고자하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수입이 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좀 건조한 도로 분위기에 붉은 색 알파로메오가 굴러다니면 미관상 아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다.
-testkwon-

- IMG_6260.jpg (92.7KB)(8)
- IMG_6261.jpg (115.3KB)(7)
- IMG_6262.jpg (105.5KB)(7)
- IMG_6263.jpg (113.9KB)(7)
- IMG_6264.jpg (92.5KB)(7)
- IMG_6265.jpg (115.7KB)(7)
- IMG_6266.jpg (115.9KB)(7)
- IMG_6267.jpg (116.8KB)(7)
- IMG_6268.jpg (91.0KB)(8)
- IMG_6269.jpg (150.2KB)(7)
- IMG_6271.jpg (134.4KB)(7)
- IMG_6273.jpg (132.0KB)(7)
- IMG_6246.jpg (103.4KB)(7)
- IMG_6247.jpg (120.6KB)(7)
- IMG_6248.jpg (101.8KB)(7)
- IMG_6249.jpg (100.2KB)(7)
- IMG_6251.jpg (119.5KB)(7)
- IMG_6252.jpg (113.0KB)(7)
- IMG_6253.jpg (79.8KB)(7)
- IMG_6255.jpg (139.5KB)(7)
- IMG_6256.jpg (106.8KB)(7)
- IMG_6257.jpg (119.9KB)(7)
- IMG_6258.jpg (79.2KB)(7)
2007.12.21 10:49:03 (*.255.4.55)

저에게는 항상 아름다운 디자인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선망의 브렌드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때문에 메인터넌스등의 악재(?)가 선뜻 맘에 와닿지 않는 까닭도 있는듯하구요. 메인계기판에서 뛰처나와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이지들도 멋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온게기판에 표시되는 'water'가 아닌 'acqua'라는 표기도 무척 독특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즐겁네요^^ 시승기 잘 보았습니다.
2007.12.21 11:31:17 (*.36.230.139)

저 역시 전통의 알파 디자인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브레라 컨셉으로부터 파생된 모델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역대 알파 중 가장 뛰어난 디자인일 뿐더러 제 기준으로 과락(60점 미만)에서 갑자기 90점 정도의 점수로 껑충 도약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탑기어에선 인테리어의 칭찬을 많이 하던데 제가 저렇게 밋밋한 센터페시아를 싫어하는 지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재질이 좋은가...
사족이지만 계기판의 부스트 게이지가 0.8 바가 아니고 0,8 바로 표기되어 있군요. 설마 최초의 누군가의 착오가 교정되지 않고 프로덕션에까지 적용되어 버렸다던가 하는 일은 아니겠죠.
사족이지만 계기판의 부스트 게이지가 0.8 바가 아니고 0,8 바로 표기되어 있군요. 설마 최초의 누군가의 착오가 교정되지 않고 프로덕션에까지 적용되어 버렸다던가 하는 일은 아니겠죠.
2007.12.21 13:55:30 (*.121.181.92)

마스터님이 시승기 올려주신 차에 관한건 아닙니다만 부스트 게이지 얘기가 있길래 거들어 봅니다. ^^
제가 각 나라별 숫자 표기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를들어 '1234.56'을 표기할 때 프랑스의 경우 '1 234,56'과 같이 표기합니다. 천단위는 공백으로, 소수점 구분은 점(dot)이 아닌 쉼표(comma)를 구분자로 사용합니다. 이태리도 화폐를 '? 1.234,56'과 같이 표기하는 걸로 봐서 이것때문에 '0,8'과 같이 표기된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각 나라별 숫자 표기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를들어 '1234.56'을 표기할 때 프랑스의 경우 '1 234,56'과 같이 표기합니다. 천단위는 공백으로, 소수점 구분은 점(dot)이 아닌 쉼표(comma)를 구분자로 사용합니다. 이태리도 화폐를 '? 1.234,56'과 같이 표기하는 걸로 봐서 이것때문에 '0,8'과 같이 표기된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2007.12.21 18:19:00 (*.147.51.1)

Wagon 이 저렇게 늘씬하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걸로 보아 전 이태리 계열인가요?
2007.12.21 19:09:22 (*.140.119.144)

요즘의 알파 스타일은 정말 멋지군요. 얼핏보고 웨건이 아니라 그냥 해치백인줄 알았네요. 그만큼 웨건 고유의 실용성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요..
2007.12.21 19:25:09 (*.137.78.100)

부스트 게이지에 적힌 , 와 . 의 관계는 성종호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처음 독일 컴퓨터로 액셀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이 부분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대 부스트는 오버부스트 상황에 1.4바였고, 맥스 홀딩 1.2바로 오버부스트 상황은 수초간만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처음 독일 컴퓨터로 액셀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이 부분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대 부스트는 오버부스트 상황에 1.4바였고, 맥스 홀딩 1.2바로 오버부스트 상황은 수초간만 지속되었습니다.
2007.12.21 22:14:04 (*.92.20.200)

이태리/스페인쪽은 Water 보다는 Acqua 쪽 단어가 일상적인 언어라서 위와 같이 표현 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아구아"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
2007.12.23 04:55:06 (*.77.16.83)

최근 쥬지아로 알파로메오를 사진으로만 봤을때는 앞 오버행이 너무 길고 디자인 또한 익숙한 형태는 아니라 크게 좋아 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에서 159 경찰차를 보고 그 강력한 포스에 매료되었습니다.
얼마전 같이 일하는 영국 동료가 산지 얼마 안되는 Z4를 팔고 브레라를 살려고 알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 보니 디자인때문이가도 하지만 그 친구 말로는 BMW는 그냥 "돈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자가 강한데 알파는 "차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라고 합니다.
얼마전 같이 일하는 영국 동료가 산지 얼마 안되는 Z4를 팔고 브레라를 살려고 알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 보니 디자인때문이가도 하지만 그 친구 말로는 BMW는 그냥 "돈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자가 강한데 알파는 "차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라고 합니다.
2008.01.21 20:59:56 (*.140.6.112)

저도 얼마 전에 159 JTD Sportwagon 오토 차량을 렌트해서 탔었는데 스타트에서는 주춤하는거 빼곤 재미있더군요. 저 역시도 트렁크 버튼 찾으면서 같은 대사를 읊었었는데 버튼 찾고는 허탈하기까지 했지요(처음에는 키 빼서 리모콘으로 열었었지요_. 센테페시아 공조기 버튼도 그다지 눈에 쉽게 들어 오진 않더군요. 그래도 스타일리쉬하기때문에 그 정도는 용서가 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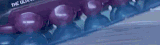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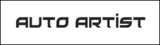

저희 집 주변 그레이 업체에 알파로메오가 세 대 정도 전시돼 있던데 최근에 없어졌더군요... 누군가 다 구매 하신건지...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