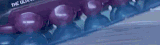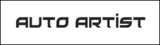Testdrive
글 수 1,573

http://blog.naver.com/tein55/130009947771서울. 흐릿한 스카이라인. 미완의 스포츠 세단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피니티의 쇼룸을 나서면서, 나는 어쩌면 "2006년 10월 17일, 세계 최초 런칭"을 기다리는 차를 미리 경험한 인간이 가질법한 우월감 내지는 행복감을 느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열린 자동문 밖으로 붉게 지는 해를 바라보는 기분이란 마치 딱딱한 다크초컬릿을 입안에서 굴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초컬릿의 본질은 달콤쌉싸름인가, 달콤씁쓸함인가.
4천 만원대에서 315ps을 누릴 수 있어
2006년 10월 13일 오후 3시. 정해진 일과는 끝났다. 따사로운 볕이 축복처럼 쏟아지는 어느 순간. 초침마저 정지된 듯한 그 시간. 인간은 저마다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풍경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동. 일상적인 진동을 왜 갑작스럽다고 느꼈는지, 그건 모른다. 누구보다도 차를 좋아하는, 그래서 나와 이따금씩 설왕설래하곤 하는 선배로부터의 전화였다.
차량 교체의 시기가 다가왔고, 인피니티 뉴 G35 세단의 시승을 예약했으며, 같이 타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솔깃한 메시지가 있나. 나는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딱 포르쉐 터보의 제로백 수치만큼의 시간을 갈등했던 것 같다. "좋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잘 생긴 녀석이 어떨지 무진장 궁금하네요." 기대는 부풀었다.
인피니티 브랜드, 그리고 뉴 G35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이다. 북미 시장을 위한 고급 브랜드로 출발했다는 것.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유지해왔다는 것. 한국에서는 미국만 못해왔다는 것. G가 인피니티 가문의 가장 젊은 피라는 것. FR이라는 것. 프런트 미드십 레이아웃을 자랑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격대마력비'가 출중한 315ps의 신형 VQ35HR 엔진을 탑재하지만 4천 만원대를 끊는 세단이라는 점이다.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래서 사진보다 실물이 나은 차
멋진 프로포션이었다. 예리한 눈매, 짧은 프런트 오버행, 거대한 휠 아치, 18인치 전후 이폭의 BS RE050A 스포츠 래디얼(*스포츠 패키지 사양), 뒤로 갈수록 상승하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 짧고 높게 보이는 트렁크. 트렁크 리드까지 유연하게 가라앉는 곡선. 생김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스포츠 세단이자 잘 성형된 현대판 스카이라인이다. 이 차는 지난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본 구형 G35에 비해 패널과 패널의 조립 상태가 한층 정밀하고, 공력 면에서도 제로리프트의 컨셉트를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실내도 좋다. 스위치의 배치가 조금 멀고 조작계통별로 누르는 감각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있다는 감각을 배제한 조건에서의 고급스러운 맛은 (가격면에서 동급인) 아우디보다 처지고 BMW보다 낫다는 느낌이다. 끝마무리는 과제인 것 같다. 짧게 둘러본 것이 전부이지만, 크롬의 도어 캐치로 안이 들여다보이고, 조수석 앞 금속질감의 띠와 에어백이 위치하는 패널 사이의 틈이 균일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럭셔리는 수제 스티치의 가죽 스티어링 휠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 계기와 스티어링 칼럼이 함께 움직이는 전동식의 스티어링 포지션 조절 기구는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기능면에서 훌륭했다.
타코미터의 숫자 8000을 치는 VQ35HR 엔진
칭송받거나 비판받거나. 기존의 VQ35DE형 엔진에 대한 미디어의 평가는 엇갈렸으며, 평자에 따른 호불호가 분명했다. 나쁘게 말하는 쪽은, 스포츠하는 느낌의 엔진이라고 할 때 회전 범위가 제한적이며, 범용으로 여러 차종에 쓰이는 엔진이라고 하기엔 진동이 승차감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VQ35DE형의 느낌을 알지 못한다.
VQ35HR로 불리우는 신형 V6 3.5리터 엔진이 가진 색깔은 분명했다. 선배가 패들 시프트를 쓰는 매뉴얼 모드의 롤링 스타트를 해보았다. 일순간 7000회전을 뛰어넘어, 8000회전 부근에서 '땡땡땡~ 이제 그만' 서징하는 듯한 느낌이 왔다. 제원상 레브리미트는 약 7500rpm. 그 순간까지 노면을 박차고 나가는 가속의 극치감에 대해 "바카야로! 315마력이 거짓말인 줄 알았니?" 라며 엔진이 거칠게 나를 설득하려 하는 느낌이다. 덧붙여 VDC OFF의 정지 가속에서 휠스핀을 기대했지만, 스로틀 개입이 존재하는지 기대는 꺾여버렸다.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 상태에서 회전을 높여서 출발하는 상황에서는 휠스핀이 난다.
숫자에서 다소 구식의 느낌을 주는 5단 AT의 깔끔하지 못한 변속감이 날렵한 엔진과 때때로 불협화음을 일으켰지만, 솔직히 대단한 가속감이었다. 4천 만원대의 세단으로 이정도 가속감을 선사하는 녀석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물음표가 남는 스포츠 세단적 요소들
반환점이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하시는 동안 선배는 여간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배의 지적들로 하나둘 가지치기를 해나가자 남은 것의 정체는 이른바 "직발용 세단"이었다. 그의 현란한 변론으로 뒷받침되는 임프레션에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이 차는 잔가지 없이 남루한 늦가을의 스포츠 세단인가. 그점에 주목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인간이 차를 타면서 '스포츠'냐 '컴포트'냐 하는 느낌을 인식하는 요소는 차와 인간의 접점, 그러니까 스티어링, ABC 페달, 쉬프팅 등 기본적인 조작계통을 통해 느껴지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 요소는 차를 세차게 몰지 않아도 차의 컨셉트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충실하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차의 컨셉트와 기본적인 조작계통의 감각이 얼마나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인간에게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좋은 차와 나쁜 차의 차이인 것이다.
뉴 G35 세단의 돋보이는 강점은 그 파워풀함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헤벌죽 웃으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뉴 G35가 가진 딜레마이다. 녀석은 스스로 '가격대마력비'에서 최고임을 입증해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세단"이란 컨셉트에서 스포츠에 악센트를 두어서 발음하려고 한다. 그 발음이 외래어의 가타가나식 표현만큼 어설프지만, 설상가상으로 세단적인 요소, 즉 '컴포트'까지 이상야릇한데서 희생해 버렸다.
오르간식의 액셀레이터를 지긋이 밟아보았다. 리니어하지가 않다. 가다 서다를 몇 번 반복해보아도 이 차는 항상 '진돗개 발령' 즉, 튀어나갈 태세이다. "나는 315마력입니다. 항상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런 메시지로 읽혀진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조금만 더 밟으면 - 대략 20% 밟은 듯한 순간부터 - 와라락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론 숨가쁘게 도로를 집어삼킨다. 그런 식이다.
이것은 스포츠인가. 이것이 스포츠 세단? 그렇지 않다. 예상하기 힘든 액셀레이션 로직을 가지고서는 스포츠의 생명선과도 같은 컨트롤의 수월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것이 특히 빠른 차라면 단지 달리기 겁나는 차일 뿐이다. 그렇다면 컴포트에서 훌륭한 면은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먼저 시승한 선배가 불만을 토로한 부분은 강남의 정체 구간, 즉 가다 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것이었다. 차도 움찔움찔거리고, 사람도 목이 젖혀지고 똑같이 움찔거린다. 잠깐 운전했지만 그렇게 피곤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입을 모았다.
브레이크 컨트롤의 수월성도 액셀레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엔진 파워에 걸맞는 절대적인 제동력 수준이나 노면에 대한 타이어의 그립을 다 뽑아쓰는 ABS 작동 감각은 엄지를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페달 스트로크도 그렇거니와 초반부터 너무 억세게 잡는다. 컨트롤의 깊이가 부족하다. 가속 페달의 감각와 마찬가지로 차 자체의 자질은 충분한데, 그점을 너무 과시하려는 데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스포츠라는 것은 확 잘 나가고 확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의 수월성, 그리고 다음, 그 다음의 움직임에 대한 견고한 신뢰감에서 비롯된다. 경쟁 브랜드인지 아닌지는 의문스럽긴 하지만, 스포츠를 내세우며 FR 레이아웃인 BMW의 모델들은 그점에서 한결 같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심심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E90 320i는 훨씬 정직하며 사람에 따라서는 더 스포티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달콤쌉싸름과 달콤씁쓸함, 차를 만드는 언어의 차이
“현재의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의 특징적인 취향은 ‘강조’와 ‘에스칼레이션’이다. 자신에게 혹시라도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심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새삼스럽게 크고 강하게, 혹은 더욱 더 데폼(폼의 극단화)하여 디자인하여 거두어들인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하여 동공이곡(同工異曲)의 라이벌에게 자신의 브랜드성을 보여주어, 구매자의 브랜드 소유욕을 부추기고자 한다. 이것이 ‘강조’이다. 스타일링에 유행 트렌드를 포함시켜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후발의 상품은 선발의 특징을 더욱 강하게 크게 하여 주장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단순히 흉내내어 얼버무리는 것이 아닌, 그것을 보다 한층 더 강조하는 것에 의해 선발주자를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 형태는 단기간 내에 극단화되어져 간다. 이것이 ‘에스칼레이션’이다.”*
인피니티의 뉴 G35 세단은 값어치를 하는 만족스러운 차이다. 이 차의 진가는 고속의 외곽도로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일상 속에서 먼지처럼 쌓인 스트레스와 소박한 투쟁심과 뉴 G35 세단이 트라이앵글 콤비를 이루면, 왠만한 차는 백미러 안에 가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자동차는 스포츠 세단이다. 세단인데 스포티. 이런 역설적 문법을 구사하는 어려운 차인 셈이다. 그러나 후쿠노 레이이치로가 지적한 ‘강조’와 ‘에스칼레이션’에 따르면, 말하자면 너무 집착한 결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한 세대 전의 렉서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차를 이루는 언어들은 스스로의 철학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뒷맛이 씁쓸하다.
* 후쿠노 레이이치로,『최후의 자동차론』, <http://blog.naver.com/mockory/29509766>
글/ 김성환
2006.10.17 20:04:36 (*.54.45.80)
결국 코너링이나 고갯길을 즐기는 사람... 혹은 차량의 컨트롤성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이 차량은 오히려 불쾌감과 피곤함을 주는 차인 듯하구료... ^^
고속도로나 탁트인 직선 구간이 많은 미주지역에 맞게 세팅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나... 내수용 버전은 좀 다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듯... ^^
고속도로나 탁트인 직선 구간이 많은 미주지역에 맞게 세팅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나... 내수용 버전은 좀 다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듯... ^^
2006.10.17 23:27:28 (*.97.208.63)

이제는 구형이 된 5개월된 G35 오넙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와 깊이있는 사색을 하시는 분임이 느껴집니다. 대부분 동감하는 내용이네요.
단순화 혹은 (입발린 말로) minimalism에 익숙해져가는 atrophy 되어가는 제 뇌가 만든 뼈만 발린 요지는 파워넘치는 저력을 스포틱하게 완성시킬 컨트롤러들의 미숙함을 지적하심이 큰 듯 하네요. 맞는지요. 파워가 업되고 기어비셋팅이 변한 만큼 구형보다 야생마적으로 와일드해진 감은 있습니다. VDC 개입포인트도 늦추고... 저속에서 악셀(스로틀)양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요소는 오토미션이 1~2단을 오가며 약간은 히스테리적 요소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것도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더 문제죠... 수동기능을 쓰면서 고정시키면 많이 덜하더군요. 구형의 경우 1단 고정으로 4천 rpm근처까지 주행하는게 나을 정도로... 오너된 후 첨 2개월간은 과속방지턱 이후 튀어나갈듯 반응하는 악셀과 답력대비 강하게 물리는 초기 브레이킹 때문에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악셀은 적응기간이 좀 필요한 듯 합니다. 적응의 동물인 인간이니만큼, 지금 처와 제 운전에서는 그런 와일드함이 많이 사라져, 스포츠는 rpm 3천이상을 뛸 때나 생각날 정도이고, 평상시는 그저그런 부드러운 세단이란 생각뿐입니다. (신형 스포츠형에선 브레이크는 유격이 길어지고 서스셋팅과 차체 높이에서 많이 낮은 자세를 유지해주기에 좀 특징이 달려진면이 있습니다.) 6단 AT가 적용되는 본토에서의 셋팅이 무시되고 가격맞추기에 급급하여 손쉬운 기존의 5단 AT를 쓴 점이나, 이미 약속된 좋은 옵션들이 빠진 것에서 국내 임포터들의 후진성을 개탄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매 뽀인트는 국내 현실상(가격상 경쟁차들 대비) 비교적 파워손실 적은 직답형 고출력 스포츠세단(경쟁차종보다 넉넉한 공간까지 갖춘)을 저렴한 값에 패밀리카로 타고다니는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타도 BMW 3" 과 "스포츠"를 외쳐보지만, 현실적으로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대중적 취향에서 벗어나면 판매에 불리해질까 두려워하는 소심하고 상인정신에 투철한 일본인이 만든 차이지 않습니까... "패밀리 스포틱 세단"이란 언어가 있다면 G35가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여담 하나 더 늘어놓구 가면, 모든 부분에서 신형 G의 evolution 을 놀라와하고 부러워하지만, 구형 G 오너로서 위안을 삼을 부분들은 약간은 강한 답력의 악셀과 브레이크 훨씬 묵직한 록투록 2.9의 스티어링휠(신형은 3.1)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215-225(R;개인적변형) 타이어 사이즈, 시내주행에서 유리한 기어비 셋팅과 비교적 부드러운 변속감, 0.7km정도 차이나는 연비, 그 외에 아래 제 글에 써있는 자질구레한 불만들 이네요.
그래도, 가장 탐나는 건 차대강성과 하체(서스)와 높이의 변화 입니다.
단순화 혹은 (입발린 말로) minimalism에 익숙해져가는 atrophy 되어가는 제 뇌가 만든 뼈만 발린 요지는 파워넘치는 저력을 스포틱하게 완성시킬 컨트롤러들의 미숙함을 지적하심이 큰 듯 하네요. 맞는지요. 파워가 업되고 기어비셋팅이 변한 만큼 구형보다 야생마적으로 와일드해진 감은 있습니다. VDC 개입포인트도 늦추고... 저속에서 악셀(스로틀)양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요소는 오토미션이 1~2단을 오가며 약간은 히스테리적 요소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것도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더 문제죠... 수동기능을 쓰면서 고정시키면 많이 덜하더군요. 구형의 경우 1단 고정으로 4천 rpm근처까지 주행하는게 나을 정도로... 오너된 후 첨 2개월간은 과속방지턱 이후 튀어나갈듯 반응하는 악셀과 답력대비 강하게 물리는 초기 브레이킹 때문에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악셀은 적응기간이 좀 필요한 듯 합니다. 적응의 동물인 인간이니만큼, 지금 처와 제 운전에서는 그런 와일드함이 많이 사라져, 스포츠는 rpm 3천이상을 뛸 때나 생각날 정도이고, 평상시는 그저그런 부드러운 세단이란 생각뿐입니다. (신형 스포츠형에선 브레이크는 유격이 길어지고 서스셋팅과 차체 높이에서 많이 낮은 자세를 유지해주기에 좀 특징이 달려진면이 있습니다.) 6단 AT가 적용되는 본토에서의 셋팅이 무시되고 가격맞추기에 급급하여 손쉬운 기존의 5단 AT를 쓴 점이나, 이미 약속된 좋은 옵션들이 빠진 것에서 국내 임포터들의 후진성을 개탄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매 뽀인트는 국내 현실상(가격상 경쟁차들 대비) 비교적 파워손실 적은 직답형 고출력 스포츠세단(경쟁차종보다 넉넉한 공간까지 갖춘)을 저렴한 값에 패밀리카로 타고다니는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타도 BMW 3" 과 "스포츠"를 외쳐보지만, 현실적으로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대중적 취향에서 벗어나면 판매에 불리해질까 두려워하는 소심하고 상인정신에 투철한 일본인이 만든 차이지 않습니까... "패밀리 스포틱 세단"이란 언어가 있다면 G35가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여담 하나 더 늘어놓구 가면, 모든 부분에서 신형 G의 evolution 을 놀라와하고 부러워하지만, 구형 G 오너로서 위안을 삼을 부분들은 약간은 강한 답력의 악셀과 브레이크 훨씬 묵직한 록투록 2.9의 스티어링휠(신형은 3.1)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215-225(R;개인적변형) 타이어 사이즈, 시내주행에서 유리한 기어비 셋팅과 비교적 부드러운 변속감, 0.7km정도 차이나는 연비, 그 외에 아래 제 글에 써있는 자질구레한 불만들 이네요.
그래도, 가장 탐나는 건 차대강성과 하체(서스)와 높이의 변화 입니다.
2006.10.18 01:37:05 (*.57.159.18)
시훈님 댓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맞아. 맞아." 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조향감이나 섀시 성능, 서스펜션 등의 내용을 수정 중에 거의 잘라냈습니다만, 스티어링 센터 부근, 그러니까 조향 초기의 감각이 조금 어색하고 노면 정보를 좀 많이 걸러 전달한다는 느낌 외에는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승차감에 관계하는 성능은 최상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