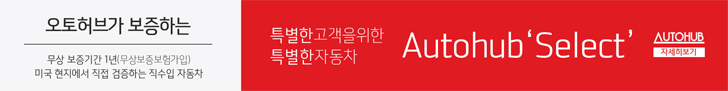글 수 6,042
실질적인 5세대 모델
신형 프라이드가 나왔다. 프라이드는 2세대에서 아벨라(Avella), 3세대 모델에서 리오(Rio)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4세대 모델에서부터 다시 쓰이고 있고, 이번에 나온 모델은 5세대 모델이다. 물론 4세대 프라이드도 수출 국가에 따라 리오라는 이름도 쓰였었다. 1세대 프라이드는 1987년에 나왔었는데, 일본의 마쓰다(Mazda)가 개발하고 기아자동차가 생산해서 포드(Ford)가 페스티바(Festiva)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3개국 3개 메이커의 협력체제, 이른바 메이플 프로젝트(Maple project)라고 불리던 개발 계획의 결과로 나온 모델이었다.
아무튼 이제 5세대가 된 프라이드는 1987년 이후 오늘날까지 24년여가 흐르는 동안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인’과도 같다. 1세대 프라이드는 외국 메이커가 개발한 차량을 생산하던 것이었지만, 오늘 살펴보는 5세대 모델은 엔진이나 변속기 등의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과 같은 플랫폼, 그리고 내/외장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독자 모델이자 고유 모델이다.
사실 요즈음의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개발하는 차종에 대해 고유, 또는 독자모델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글로벌 5위 수준의 규모와 기술을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메이커에게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최근에는 메이커들 간의 제휴와 하드웨어 공유로, 기술의 독자성 여부 보다는 개발 철학이나 차량의 성격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하드웨어가 같더라도 브랜드의 성격이나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요즘의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조형 요소
신형 프라이드의 차체 디자인은 최근에 기아자동차가 추구하고 있는 조형 언어 ‘직선의 단순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탄력이 들어간 선과 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신형 프리이드의 전반적인 인상은 직선과 아울러 곡선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곡선이 없다면 자동차를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차체의 선들은 기본적으로 곡선이기 때문이다.
차체의 이미지와 비례
차체 측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앞 도어 패널의 캐락터 라인이 특징적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견 이것은 A-필러와 옆 유리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차체의 볼륨이 음각으로 변화되면서 다차원적인 입체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신형 프라이드는 흰색 같은 솔리드 컬러보다는 음영을 강조하는 메탈릭 컬러가 개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차체 형태에 투톤 컬러를 적용한 경우도 미국 차량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미국 등에서는 코브(cove)라고 부르기도 했다.
디자인 리뷰는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 글로 적는 디자인 리뷰는 필자의 자동차 디자인 실무경험과 디자이너로써의 감성을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공감하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누가 계산해도 동일한 답이 나오는 산술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좋아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필자 역시 실무 디자이너로 짧지 않은 시간을 메이커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차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쏟아 붓는 열정과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했기에, 새로운 차를 대하게 되면 그 과정이 짐작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디자이너 개개인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수천억이 투입되는 신형차의 개발은 기업의 종합적인 집중력과 올바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국산차들의 디자인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수준에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메이커 별로 집중력이나 의사결정에서 ‘수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괄목하게 좋아진 차는 좋다고, 또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분명한 디자인을 가진 차를 솔직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필자에게, 출신 메이커에 관련된 차만을 좋게 평가한다는 편견을 가지지는 마시기를 이 지면을 통해 부탁드리는 바이다. 객관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완성도가 부족한 디자인의 차를 좋다고, 또 좋은 디자인의 차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신형 프라이드가 나왔다. 프라이드는 2세대에서 아벨라(Avella), 3세대 모델에서 리오(Rio)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4세대 모델에서부터 다시 쓰이고 있고, 이번에 나온 모델은 5세대 모델이다. 물론 4세대 프라이드도 수출 국가에 따라 리오라는 이름도 쓰였었다. 1세대 프라이드는 1987년에 나왔었는데, 일본의 마쓰다(Mazda)가 개발하고 기아자동차가 생산해서 포드(Ford)가 페스티바(Festiva)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3개국 3개 메이커의 협력체제, 이른바 메이플 프로젝트(Maple project)라고 불리던 개발 계획의 결과로 나온 모델이었다.

아무튼 이제 5세대가 된 프라이드는 1987년 이후 오늘날까지 24년여가 흐르는 동안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인’과도 같다. 1세대 프라이드는 외국 메이커가 개발한 차량을 생산하던 것이었지만, 오늘 살펴보는 5세대 모델은 엔진이나 변속기 등의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과 같은 플랫폼, 그리고 내/외장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독자 모델이자 고유 모델이다.
사실 요즈음의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개발하는 차종에 대해 고유, 또는 독자모델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글로벌 5위 수준의 규모와 기술을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메이커에게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최근에는 메이커들 간의 제휴와 하드웨어 공유로, 기술의 독자성 여부 보다는 개발 철학이나 차량의 성격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하드웨어가 같더라도 브랜드의 성격이나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요즘의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조형 요소
신형 프라이드의 차체 디자인은 최근에 기아자동차가 추구하고 있는 조형 언어 ‘직선의 단순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탄력이 들어간 선과 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신형 프리이드의 전반적인 인상은 직선과 아울러 곡선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곡선이 없다면 자동차를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차체의 선들은 기본적으로 곡선이기 때문이다.


차체의 이미지와 비례
차체 측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앞 도어 패널의 캐락터 라인이 특징적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견 이것은 A-필러와 옆 유리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차체의 볼륨이 음각으로 변화되면서 다차원적인 입체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신형 프라이드는 흰색 같은 솔리드 컬러보다는 음영을 강조하는 메탈릭 컬러가 개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차체 형태에 투톤 컬러를 적용한 경우도 미국 차량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미국 등에서는 코브(cove)라고 부르기도 했다.





디자인 리뷰는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 글로 적는 디자인 리뷰는 필자의 자동차 디자인 실무경험과 디자이너로써의 감성을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공감하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누가 계산해도 동일한 답이 나오는 산술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좋아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필자 역시 실무 디자이너로 짧지 않은 시간을 메이커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차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쏟아 붓는 열정과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했기에, 새로운 차를 대하게 되면 그 과정이 짐작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디자이너 개개인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수천억이 투입되는 신형차의 개발은 기업의 종합적인 집중력과 올바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국산차들의 디자인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수준에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메이커 별로 집중력이나 의사결정에서 ‘수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괄목하게 좋아진 차는 좋다고, 또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분명한 디자인을 가진 차를 솔직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필자에게, 출신 메이커에 관련된 차만을 좋게 평가한다는 편견을 가지지는 마시기를 이 지면을 통해 부탁드리는 바이다. 객관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완성도가 부족한 디자인의 차를 좋다고, 또 좋은 디자인의 차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